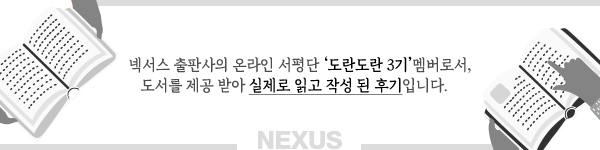-

-
엄마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김미향 지음 / 넥서스BOOKS / 2019년 5월
평점 :




"당신의 가족은 평안하신가요?"
가족 내에 문제가 많은데 별 탈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필시 누군가의 희생이 존재한다. 대개 그 희생은 부모님인 경우가 많고, 엄마인 경우는 더더욱 많다. '엄마~'하고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적이 까마득해진 나는 이 책을 읽고 다시 엄마란 여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의 엄마도 저자의 엄마처럼 희생만 하였기에, 좋은 시절 못 누리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따뜻한 손길보다는 차가운 생계로 내몰렸던 사람이기 때문일까.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을 참느라 혼났다. 책장을 쉬이 넘기기 어려웠고 몇 번이고 읽기를 포기했다. 그만큼 저자의 엄마, 그리고 이 시대의 엄마 그리고 가족이란 공동체가 가진 상처의 흔적을 되짚는 건 타인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와 경험하는 것과 같다.
저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추억하며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을 글로 풀어낸다. 엄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야 깨닫는 잔혹한 진실들, 살아계실 때 살뜰히 대하지 못한 지난날의 냉소와 차가움, 단 한 번이라도 엄마의 말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지 못한 회한은 파도처럼 밀려와 살을 에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를 환영해준 손길이었다."라는 말에 울컥한 건, 새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그녀의 처음은 또 다른 처음을 포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로는 늘 엄마 편이었다. 그러나 막상 엄마 편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오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엄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중립적인 척하는 나 자신의 위선 때문이기도 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엄마가 원하던 바로 그 순간에 엄마 편을 들지 못한 거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작정하고 엄마 편이 되기로 했다. (p. 6)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1부는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그녀를 찾아오는 이야기, 2부는 죽음 이후에 가족이 겪는 상실과 이를 이겨내는 이야기, 3부는 엄마라는 칭호가 아닌 여자 정숙 씨의 이야기를 한다. 그중, 꿈에 나타난 엄마 이야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읽어야 할 정도로 슬펐다. 꿈을 꾸면 엄마를 볼 수 있어서 좋지만 꿈을 깨면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저자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내가 고통에서 헤어났으리라 짐작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깊은 터널 속에 있다. 그 터널의 어두움은 터널에 있어 본 이들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실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무섭다.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구의 고통도 섣불리 재단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p. 71)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동안은 삶을 동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죽음을 옆에 끼고 살아간다. 죽음은 삶과 함께 불시착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나도 외할아버지 부고가 그랬다. 내가 슬픈 건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공기는 이전에 느꼈던 것과 매우 달랐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엄마를 바라보는 딸인 나, 남편을 보낸 외할머니으 눈물, 그가 남기고 간 삼촌, 이모들 그리고 화장터에서의 마지막 인사. 검은 상복을 입은 어색한 내가 아직은 해맑은 동생들을 케어하고, 상실과 무력감으로 뒤덮은 나의 엄마와 가족을 바라보는 일은 지금 떠올려도 숨이 턱 막힌다. 그래서 섣불리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죽음은 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생의 우울과 폭력, 나이듦과 병듦, 장애와 학대, 냉대와 모멸, 지척에 있는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남겨진 이들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자 누이이자 아내이자 엄마이자 여성이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존재 그 자체인, 우리 곁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그래서 나를 비롯해 엄마 곁의 사람들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퇴근 후 조용한 내 방에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쓰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그 글을 쓸 때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는 듯했다. (p. 195~196)
그녀의 어머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차별이란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딸이란 이유로 각종 권리를 박탈당했고 삶을 옥죄는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 어린 생명을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내고자 했지만 세월이 가져다준 우울과 늙고 병들어 가는 육체 앞에서 결국 해방되지 못했다.
독자인 나도 감히 행복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이야기를 딸인 저자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했을까. 자신처럼 딸은 살지 않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을 보이지 않는 노력은 누가 알아주어야 할까.
누군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하지만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도저히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며 삶의 덧없음을 마주함과 동시에 또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지옥이다. 어렵사리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내 생명을 빚진 엄마에게 거창한 효도가 아닌 사소한 효도를 자주 해야겠다고 느꼈다.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가고, 때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웃고 있다면 같이 웃고, 힘들어 보이면 돌림노래 같은 사연이라도 처음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일. 미래에 하는 후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드렸다는 것일테니까.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어"라는 말보단 "엄마는 네가 있어서 그나마 행복했어"라고 말해주었으면 하니까. 그게 나에게도 행복일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