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진했던
박정언 지음 / 달 / 2018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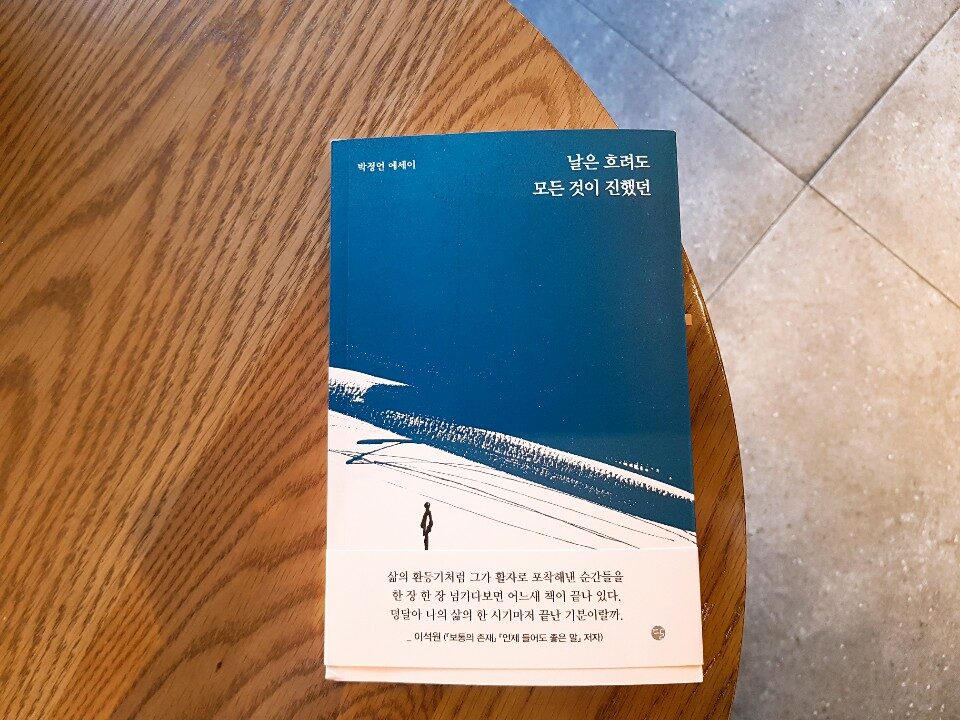
사회 초년생,
취준생이라면 '나에게 잘 맞는 자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막상 꿈꾸던 자리에 있어도 생각했던 곳이 맞는지 자주 헷갈린다. 그녀는 기자
생활이 맞지 않아 10개월 만에 이직을 한다. 그런데 이직한 방송사는 얼마 가지 않아 파업을 한다. 마음을 좀 풀어도 될 것 같은 라디오국에서도
아날로그 매체인 라디오가 설자리를 고민한다.
행위는
지속될 때 빛을 발한다. 이 명제에는 '보통의 존재'들뿐 아니라, 보통을 넘어선 특별한 존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오로지 지속될
때만이, 행위는 그 자신도 모르게 모습을 바꾸어가며 진화한다. 그러니 작은 가능성이라도 기대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한다. 계속한다. (p. 29)
즐거운 일이
가득했을 때 우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반면, 슬프고 힘들 때는 토로하고 싶은 곳이 없어 기록한다. 그녀에겐 스무 살부터 써온 일기가
있다. 이 책은 수년간 써온 그녀의 일기이고, 생의 기록이고 쓸모를 고민했던 사람의 고백이다. 그 안에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길거리로 출근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과 휑해진 방송국을 늘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앞이 깜깜한 사람들을 취재해야 하는 기자가
있다. 나에게 좀 더 맞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한 곳에서 삶의 균형이 흔들려버린 연출자가 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나라는 자아와의 저울질이기도 했다. 때론 나를 내놓아야 하고, 몸을 사려야 했던 사람이
있다.
이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 경계선이 있다 해도 아마 몹시 흐릿해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든 자칫하면 밟을 수
있는, 흐리고 또 흔한 선, 삶이 우리를 살짝이라도 떠밀면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는. (p.
166)
삶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이상한 이분법이 존재한다. 마치 외줄 타기 장인처럼 한발 한발 맨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곧두세워야 하는 순간이
끼어든다. 어색한 정장을 입고 출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生)과
자아실현이 고민이란 전쟁을 선포한다. 다들 잘만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란 요란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어 내뱉는 한숨 속엔 매듭이 꽈악
묶여있다.
선택은
미래를 바꾸기도 하지만 과거를 새로 기억하게 합니다. 미래를 바꾼 대신 과거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선택의 대가 중 하나인 걸까요.
(p.
114)
다시 돌아가서 그녀가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고민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대신 삶의 목소리를 포착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익숙함으로 덮여졌다. 쓸모를 찾아 떠난 자잘한 기록들이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는 많은 파도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 자리를 찾는 길라잡이가
되었다.
소리의
세계에 귀를 열고나니, 그건 세상을 얼마나 시각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됐다. 소음이라고만 여겼던 소리 안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눈을 감고 소리만 들었을 때 더 잘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것들이 그랬다. 대부분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쓰다보니 어떻게 '들리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야말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양상, 그리고 또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p.
17)
여러 자리에 있었기에 볼 수 있던
풍경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평온하기만 하면 아무도 뒤돌아 보지 않을까 봐 이리도 소란스러운가 보다. 나는 여전히 내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언젠가 알아서 알아봐 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