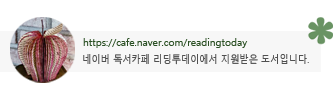-

-
프랑켄슈타인 (양장) ㅣ 앤의서재 여성작가 클래식 3
메리 셸리 지음, 김나연 옮김 / 앤의서재 / 2022년 3월
평점 :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 김나연 옮김 | 앤의서재| 앤의서재여성작가클래식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켄슈타인을 읽을 때에 순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 그것은 오로지 그 이름을 명명한 자에게 하나의 의미가 된다.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스스로의 이름을 붙여줬을때 그 창조물은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지만 그에게는 의미였다. 이 세상과 연결 시켜주는 하나의 끈이었다. 하지만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그 명명을 거부했고, 그것을 치욕스러워했으며, 다시 되돌리고 싶어했다. 설상가상 그는 되돌릴 용기조차 없었다. 물론 그것을 없앨 용기는 더더욱 없는 가여운 존재였다.
태어난 존재인 버림받은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해든 살아야했다. 그 자신을 만든 이가 자신을 거부했을때 이미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에게 남은 것은 악의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서 느끼는 것은 희열보다는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복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그 복수는 그 스스로를 향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드는 주문을 걸면서 말이다.
눈 먼 노인과의 대화에서 비로서 그 자신을 온전히 내보일 용기를 얻은 듯도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에게는 그것도 잠시였다.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던 곳에서, 모르게 자신의 애정을 표했던 곳에서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괴물이었다. 어쩌겠는가? 그 자신의 창조자는 그를 썩어가는 죽은 자를 통해 드러냈음에...... .
모두에게 고통이다. 두명의 프랑켄슈타인 둘 다에게 말이다. 한 사람은 창조한 고통을 한 사람은 태어난 고통을 겪는다. 창조와 탄생은 언뜻보면 다르나 자세히 보면 닮아있다. 그 둘 모두 고통스럽다는 점이 닮았으며 막상 결과물을 손에 쥐어봐야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이 다른 이를 만들기 전에 그가 얼마나 결의에 차있었던가? 그가 얼마나 환희에 차 있었던가? 하지만 결과가 드러나자 그는 그 결과물을 똑바로 마주보기도 거부했다. 탄생도 마찬가지다.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결과 더 큰 위험,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이것이 끝이라고 이것보다 극한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더 큰 낭떠러지가 발 밑에 존재하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전에 읽은 프랑켄슈타인은 창조된 괴물의 비극으로 읽혔지만 다시 읽은 프랑켄슈타인은 존재의 비극으로 보인다. 존재 자체의 비극, 탄생의 비극, 그리고 그것은 창조자의 비극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인간 전체의 비극으로도 보인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공간을 파괴하고, 서로가 총을 겨누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지금 누가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이고, 누가 괴물 프랑켄슈타인인가? 그 둘의 모습은 어쩌면 서로 닮아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