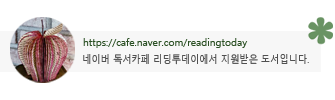하늘의 수많은 별의 흔적들... 이제는 안다. 그 빛이 과거의 빛이라는 것을... 하지만 믿고 싶지는 않다. 그 별의 흔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눈 앞에 빛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소설가 이수안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소설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흔치않는 빛의 순간, 마법과도 같은 순간을 말이다. 거기에 드러나는 운명과 의지에 대한 순간들...
예전에 타로점을 보러 지하상가 구석을 찾은 적이 있다. 별다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묻고 싶은 질문 하나 마음 속에 품은 채 카드를 고르면 그만 이었다. 그때 당시 생각에도 나름 오락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진지하게 카드를 뽑고 그 해석을 들었던 것같다. 카드를 뽑을 때는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말이다.
책에 나오는 시커라는 말은 무언가 갈망을 하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시커와 그 점괘를 읽어주는 사람의 영역... 점괘의 선택은 온전히 시커의 영역이다. 카드를 읽는 사람은 시커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그저 시커가 선택한 카드를 읽어주는 것뿐... 어쩌면 믿을 지 말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커로의 몫의 출발인 것이다.
이 책은 타로 점집을 운영하는 마녀의 이야기다. 엄마 이연의 이야기인 동시에 양어머니 키르케의 이야기다. 거기에 모두 닿아있는 이단의 이야기... 이단은 자신을 둘러싼 운명과 마녀의 일생과 그 지혜를 '그림자의 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엄마 이연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마녀가 되기로 선택할지 말지는 이제 이단의 영역이 되었다.
할머니, 어머니, 이단에게로 이어지는 길고 긴 성장의 이야기... 생물학적 아버지 에이단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은 운명이었던 것일까? 에이단은 불운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의 선택이었다면....
흔히들 말한다. 운명이 주어졌어도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용히 우리를 비켜갈 것이라고... 사실상 죽음과 탄생은 운명이다.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주어진 것이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벤자민은 자신을 어릴 적 버리고 간 생물학적 아버지를 욕하지 않는다. 죽음 속에서 자란 벤자민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인다.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가 남긴 유산 역시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왜 나를 버렸느냐? 왜 지금 다 죽을때 나타났느냐? 하는 신파적인 스토리는 없다. 그저 아...그렇구나... 시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죽음과 함께 한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거부한다해도 그것은 오기 마련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선택일 따름이다. 악다구니를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안좋은 카드가 인생에서 뽑혔어도 좋은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 선택은 최소한 나의 몫이니까 말이다. 10개의 사과가 모두 썩었어도 그 중 멀쩡해 보이는 것 부터 먹는 지혜를 키우자. 다 썩었다고 불평하기 전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살면서 안되는 것 중 하나가 받아들임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가지 지혜는 생기는 것같다. 바로 받아들임의 지혜이다.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