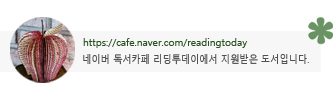-

-
폭격기의 달이 뜨면 - 1940 런던 공습, 전격하는 히틀러와 처칠의 도전
에릭 라슨 지음, 이경남 옮김 / 생각의힘 / 2021년 12월
평점 :




폭격기의 달이 뜨면
에릭 라슨 지음 | 이경남 옮김
한바탕의 무언가가 휙하고 지나간 것같다.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쟁의 실상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일,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전쟁에 관한 논픽션을 읽는 일일 것이다.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항상 전쟁 중에 사는 것처럼 경계해야한다. 끔찍한 비극이었던 세계대전을 잊지 말아야한다.
생각해본다. 까만 하늘에 달이 떴을때, 그 달이 보름달이나 상현달, 하현달 같은 볼록한 모양일때 공포에 떨었을 런던 시민들을 말이다. 그 달을 그들은 폭격의 달이라고 불렀다. 그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도 떴을 터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처참해졌다. 그 당시 영국 아이들의 꿈은 죽지않는 것이다. 전쟁 중이었지만 누군가는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했다.
폭격의 기간동안 밤마다 방독면을 쓰고 지하대피소로 향했던 아이들.. 전쟁 후 죽은 아이들의 숫자는 상상 이상이었다. 약한 자들이 먼저 죽는다. 전쟁은 누가 더 민간인을 더 많이 살상하느냐에 달렸다는 스탠리 볼드윈의 말은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
이 책은 1940년 런던공습을 다룬 책이다. 1940년 5월 부터 1년동안의 일들, 처칠이 신임총리로 영국의 수장을 맡게 된 그때부터 히틀러의 공습은 시작됐다. 2차대전, 영국에 대한 독일 항공군의 공습은 그야말로 전략 폭격, 공포 폭격이었다. 무지막지한 항공 포탄과 항공기를 영국 상공에 보내고 밤마다 들리는 사이렌과 폭격기의 소리에 사람들은 공포 이상의 절망을 겪는다.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처참하게 고통을 맞이하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매몰공포증에 빠진 사람들,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했던 사람들...
영국왕립공군 RAF와 독일 루프트바페의 교전은 사실 끝난 게임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독일이 마음만 먹으면 영국은 바로 끝장날 것이라는 것말이다. 독일의 교전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처칠은 자신들이 살아남기위해서는 미국을 끌여들여야 함을 알았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의 건투를 빈다는 메세지는 빈정거림을 넘어선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처칠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그였지만 말이다.
야간 공습에 런던에 있다면 죽을 확률은 백퍼센트였다. 백퍼센트의 확률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런던의 복구능력은 놀라왔다. 히틀러는 다시 한번 계획한다. 제 2의 코번트리 공습을, 코번트레이션을 말이다. 그 절망을 다시 겪고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1942년 말이 되어서야 전쟁은 비로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롬멜이 패배하고, 히틀러는 러시아와의 교전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하지만 1940년의 그 일년은 아마 백년의 세월처럼 영국 국민에게 느껴졌을 것이다.
미국 논픽션 작가 에릭 라슨의 이야기의 힘은 놀라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 뿐임을 아님을 이번 작품을 통해 느끼게되었다. 전쟁의 생생함, 현장감은 책을 빨리 덮고 싶게 만들었다. 그에게 2004년 에드가상을 안겨준 작품 <화이트 시티>를 꼭 읽어보리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