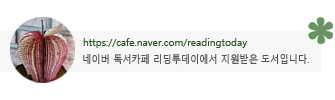-

-
빛의 공화국
안드레스 바르바 지음, 엄지영 옮김 / 현대문학 / 2021년 12월
평점 :

절판


바비큐용 그릴은 이미 사라졌지만, 벽돌로 만든 식탁은 초창기 문명의 폐허처럼 잔해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가 천년도 더 넘게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순수하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나무들은 선과 악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가끔 새 물건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과연 누가 최후에 남을까? 허튼 공상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늙어가도 물건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두려워지기도 한다.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무언가를 사는 것이 누가 남느냐하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불안해서 물건을 버린다는 어느 에세이의 제목처럼 나는 그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않았지만... 간혹 물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세계가 참을 수 없이 불안해지는 건...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