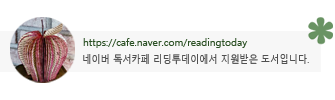의사 생리학
루이 후아르트 글 | 트리올레 그림 | 홍서연 옮김 | 페이퍼로드
200년 전 프랑스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
의사는 자신들의 배부른 파업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처럼 여겼다.
흥미진진한 의사 생리학,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풍자할 수 있는 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만일 우리 사회에 이런 저자가 나왔다면 아마 고소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요즘은 스스로 지나친 자기검열로 인해 누군가를 비판, 비평한다는 것은 고도의 정신무장이 수반되어야하는 일이다.
책은 200년전 프랑스로 우리를 안내한다. 때는 19세기 초, 1848년 공화국이 되기 전 혼란된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의사들의 생리를 다루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묘사와 그 시대상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그 시절 프랑스는 정치적 변혁기 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과학의 발달로 산업혁명을 준비중에 있었으며, 또한 홍수, 폭동, 열병 등으로 사람들은 미신과 의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시기였다.
그때에 리옹의 의사의 수는 무려 400명에 육박했지만 그 중 308명의 의사에게는 환자가 없었다고 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의사보다는 경력있는 유모나 아이를 많이 키워본 가정부에게 실제 의료적 치료를 의탁했으니 말이다. 순간 중세에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한 여성들이 생각난다. 그 중 대다수는 산파나 간호행위를 한 여성들이었다고 하니 의료적 행위는 시대를 통틀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프랑스는 격변기였다. 그만큼 사회상도 혼란하여 돌팔이, 치료사, 동종요법의사, 수치료사, 약사 등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의료행위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입각해서라기 보다는 동그란 황금을 보고 빈번히 이루어진 의사들이 많았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의술을 행했던 것같다. 사혈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피를 4리터나 뽑아댔으니 말이다. 1리터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피를 뽑힌 환자는 아파서라기 보다는 피가 부족해서 더 일찍 죽었을 것같은 느낌이 든다.
의사 생리학을 읽으면서 한국의 의료현실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들의 헌신,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피부과 의사가 넘쳐나며 지방 및 시골같은 곳의 의료공백은 실로 심각해서 넘치고 넘치는 곳과 부족한 곳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이 또한 문제라 하겠다.
루이 후아르트의 이 책은 무려 세기가 두번이나 돌아서 지금 내게 읽히고 있다. 하지만 왜 지금의 현실과 흡사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그것은 씁쓸한 일일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인 고로 받아들여할 어쩔수없음 인가? 아마 둘 다 인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