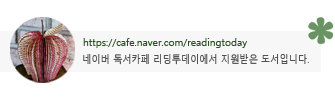-

-
일광유년
옌롄커 지음, 김태성 옮김 / 자음과모음 / 2021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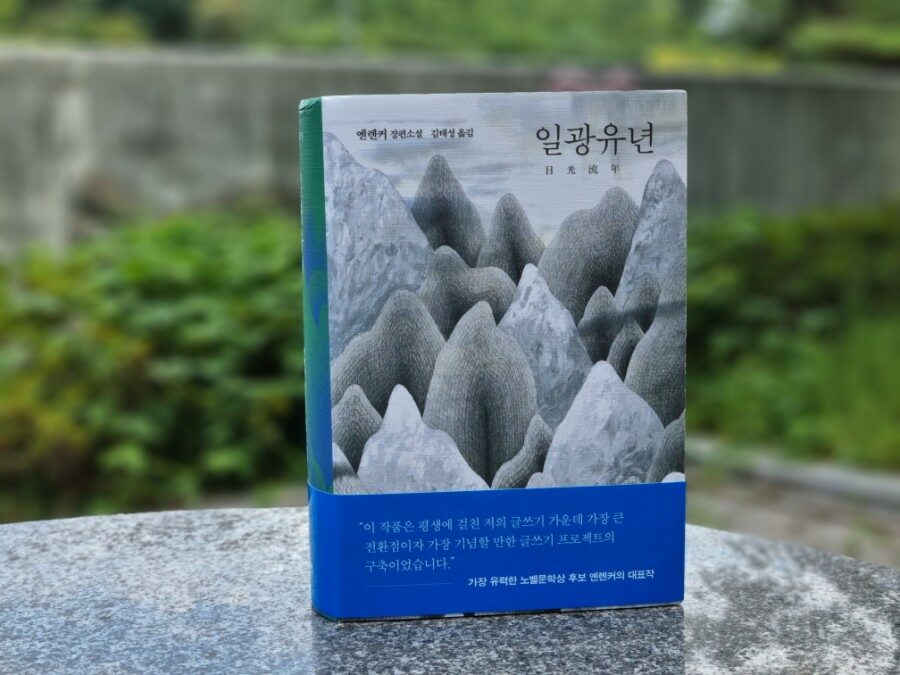
일광유년
옌롄커 장편소설 | 김태성 옮김 | 자음과모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태어남과 죽음이 어찌보면 하나인데... 그 만남이 너무 절묘하고 슬퍼서 이그러진 구슬도 같고 꽃과도 같다.
소설 일광유년은 흡사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거꾸로 흘러간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링인수의 물... 하지만 절망의 다른 말도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서 말이다.
촌장이 되고자 했던 쓰마란... 그는 결국 란쓰스의 도움으로 촌장이 되었다. 그에게는 산싱촌의 사람들을 살리고자는 마음이 있었다. 물론 오로지 전적으로 그 마음이 컸던 것은 아니리라... 하지만 그는 어찌되었든 산싱촌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크나큰 사명을 품은 촌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 또 한명의 여인이 나온다. 바로 주추이다. 주추이 그녀는 마른 몸이지만 강단 있는 여성으로 어릴 적부터 쓰마란을 찍었다. 옥수수밭에서 나오는 쓰마란과 란쓰스를 본 다음부터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남편감은 쓰마란 이었다. 이 또한 비극이다. 만일 쓰마란이 본래 본인의 의도대로 란쓰스와 결혼을 했다면 란쓰스...그녀는 굳이 인육장사를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 그렇게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맞지않아도 됐으리라....
주추이 역시 마찬가지다. 멀리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더라면...그녀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더라면... 짧은 생에 전전긍긍하며 그리고 영원히 오지 않을 쓰마란의 애정을 갈구하면서 악다구니를 부리며 살지 않아도 됐으리라... 모든 것은 아마 숙명이겠지. 비극의 숙명... 그리고 산싱촌의 숙명 말이다.
피부를 파는 일, 그리고 몸을 판다는 뜻을 지닌 인육 장사... 소설 곳곳에는 불편한 장면들이 나온다. 상상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없었던 것은 왜 산싱촌 사람들은 그곳을 고집하는가이다. 터전... 그 터전을 버리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기 땅, 자기 것을 지키고자하면 아무리 짧은 생이라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나 보다.
무엇보다 산싱촌 사람들이 걸리는 이상한 병... 마흔이 되기 전에 목구멍이 막혀서 죽는다니... 목이 부어서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병... 땅 곳곳에 스민 치명적인 불소의 양... 병든 땅...그래도 그들은 버릴 수 없다. 그들은 하나에 목숨을 건다. 바로 링인수를 끌어오는 것이다. 그 링인수... 그것은 바로 희망일까...절망일까...
이 책 첫머리에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 책이 저자의 평생에 걸친 글쓰기 중 가장 큰 전환점이자 가장 기념할 만한 글쓰기 프로젝트의 구축이라도 말이다. 아픈 중에서도 침상에서 써내려간 책... 이 책에 바로 삶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다. 란쓰스와 쓰마란... 그 두명의 아픈 과거는 바로 산싱촌의 상징과도 같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