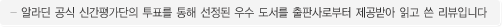[안녕, 다정한 사람]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안녕, 다정한 사람]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안녕 다정한 사람
은희경 외 지음 / 달 / 2012년 11월
평점 :

품절

나에게 책을 읽다는 것은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으로부터 공감하고 위로받고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한 치유의 행동이다. 여행 또한 독서와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신선한 익숙함과 상쾌한 낯설음으로 언제나 기운을 복돋아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여행과 독서는 나의 유일한 취미이자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까? 나는 여행과 관련된 에세이를 좋아한다. 여행을 준비할 때 느끼게 되는 기분좋은 작은 떨림들이 여행 에세이를 읽은 동안 내 마음을 간지럽히며 피식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도 모르게 달력을 보며 여행을 계획한다. 나도 어디로 떠나볼까 하고 마음에 살랑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타고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의 돛이 힘차게 나부낀다.
그래서 <안녕, 다정한 사람>이란 하얗고 따뜻한 느낌의 책을 받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기뻤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공짜로 여행할 터였다. 어떤 나라에서 어느 누구와 여행을 할 것인가? 기대되고 설레인다.
<안녕, 다정한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열 명의 작가로 이루어진 릴레이식 여행 에세이이다. 낯익은 작가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고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열 명의 각기 다른 인격체로 이루어진 이들이 쓴 여행기인 만큼 관심사도 제각각이며 여행을 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 책은 마치 화려한 뷔페식 레스토랑같다. 소박한 가정식부터 고급 요리까지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대중적인 요리들로 가득한 뷔페식 레스토랑. 처음 첫 접시는 이것저것 골고루 맛보다가 결국 두번째 접시부턴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개인 취향의 문제일 뿐. 나머지 음식들이 결코 맛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나의 여행 방식과 닮았다고 여긴 작가는 '박칼린'이다. 그녀의 여행방식은 나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있어 거부감없이 편안하게 그녀의 여행기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맞아.' 하며 속으로 얼마나 맞장구를 치며 읽었던가. 덕분에 박칼린 여행기 첫 페이지부터 나는 거의 그녀와 일심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뉴칼레도리아의 푸른 바다와 검게 그을린 탄탄한 근육을 가진 노인의 등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녀에게 빠져 버리고 말았다.
그녀가 여행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 '무한히 상상하는 것' 또한 잊을 수 없다. 그것이 때론 유치해 보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이야말로 여행을 즐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반면, 여행이란 낯선 것과의 만남을 통한 희열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여행의 다른 면을 보여준 작가는 '신경숙'이다. 그리고 그런 내 생각을 꾸짖기라고 하듯 그녀의 여행기는 '여행은 낯선 세계로의 진입만은 아니다.'라고 시작한다. 일 년간 뉴욕 맨하튼에서 보냈다는 그녀가 팔 개월이 흘려 다시 뉴욕 맨하튼을 찾았다. 자신이 머물었던 빌딩과 자주 가던 식당, 자주 걷던 산책로와 그 산책로에 위치한 공원과 오페라 공영장까지...
여행기를 읽는 동안 나는 한 공간 안에 작가와 마주앉아서 작가의 일 년간 뉴욕에서의 추억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 큰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아가 아직 그대로인 구멍가게와 매일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던 공터의 전봇대를 보는 듯한 야릿한 느낌으로 가슴이 찌릿했다. 그리고 여행이란 어쩌면 과거의 나(혹은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제 4차원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내가 아는 뉴욕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새침한 뉴요커들이 있는 경쟁이 치열한 삭막한 도시쯤으로 생각했었는데, 신경숙 작가의 뉴욕은 예술을 향유하려는 문화인들로 가득하고 예술을 공유하기 위해 기부문화가 발달된 매우 매혹적인 도시였다. 나도 금요일 링턴센터의 오페라극장 앞 길게 늘어선 줄 가운데 앉아, 느긋하게 책 한 권을 읽으며 순서를 기다리다가, 러시 티켓으로 오페라를 관람하고 싶다. 물론 더 먼훗날 '아그네스 바리스'라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슷한 추억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박찬일' 작가의 여행기가 마음에 와닿는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설 연휴, 홀로 북큐슈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작가의 규슈 에키벤 여행기를 읽으니 그 날의 추억이 탄산음료의 기포가 솟아오르듯 머리 속에서 그 날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다. 보통 내가 가지 못한 곳에 대한 여행기를 읽으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키웠는데, 내가 갔다왔던 곳의 여행기를 읽으니 마음 한 구석이 짠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그리움에서 비롯된 마음의 파동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
그 밖에도 여행기를 읽고 '나의 가고싶은 여행지' 목록에 기꺼이 추가를 시키게 만든 이병률 작가의 핀란드 여행기도 잊을 수 없다. 추운 겨울이 싫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반부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작가의 여행기를 읽고 마음이 바꿨다. 언젠가는 산타가 산다는 그 핀란드 마을로 날아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그만한 선물가게에서 장식용 초 하나를 갖고 싶다. 또 하나 문득 든 생각, 언어공부를 해야겠다.
끝으로 '이병률' 작가의 여행기에 나오는 쉰 살의 화가, '알렉산드르' 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이 글귀를 통해 여행길에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바라는 이에게 영감을 주죠. 영감이란 무의식적으로 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지는 않아요. 메마른 땅에 아무나 데려다놓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수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곳으로 달려가고 싶어 가슴이 먼저 뛰는 그런 책. 유난히도 추운 겨울,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듯 읽기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