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집 안을 들여다보면 평범치 않은 그런 가정들 이야기다. 집이란 자신의 고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집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지기도 한다. 또한 서로에게 소홀해 지면서 다른 곳에서 자신을 찾기도 한다.
이 책에는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겠다는 아내의 집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진해야 하는 아비가 있고, 바람을 피운 남편을 이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고독과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아내가 있으며, 엄마의 강요된 교육 프로젝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엄마의 아바타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누구 할 것 없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살아가는 가족, 그래서 언제든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이 허약한 가족은, 그야말로 언제든 파열 가능한 제로 공동체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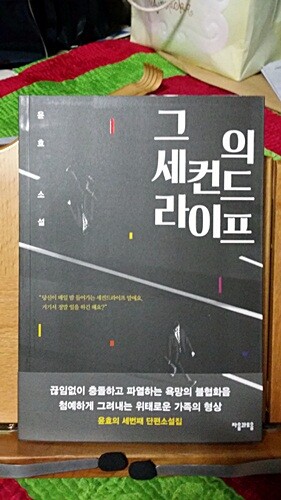
집은 인간존재의 최초의 세계이자 하나의 우주이다. 특히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있어서 집은 대략 남편과 아이들의 삶을 살찌우게 하고 자기만의 꿈의 부피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굳건한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행위에 불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역설적으로 집을 축조함으로써 그 부재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력한다는 것, 따라서 집이라는 것은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는 인간의 불가능한 욕망을 응축한 축조물에 불과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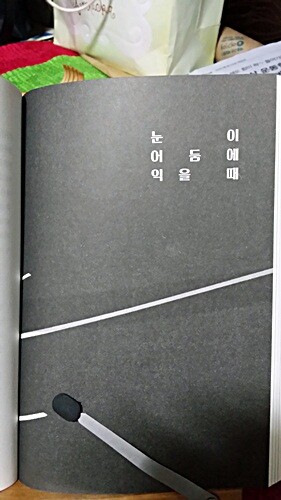
윤효의 소설에서 가족은 하나의 안정된 기표가 아니라, 구성원 간의 경합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진앙지로 그려진다. 또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족은 개인과 개인이 접속하는 친밀성의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독과 권태의 정념들이 결코 해소되지 않은 채 곧 폭발할 것만 같은 뇌관을 품고 있다. 윤효는 뒤틀린 욕망이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끝내 그 뇌관을 터트리고야 마는 가족의 형상을 발명해내는 데에 주력한다.
윤효에게는 소설 속 비극을 보편의 비극으로, 소설 속 증상을 사회적 증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미묘한 힘이 그녀의 소설 속에 깊숙하게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우리의 삶과 슬픔과 고통을 만지는 것이다. 언제든 자신을 휘몰아칠 수 있는 외상적 기억 때문에 가족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서사라든지 집/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거나 왜곡된 욕망을 한껏 분출하는 서사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결코 자신의 자리를 점유하지 못하는 잉여물과 같은 여성의 실존적 조건을 다룬 서사들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가진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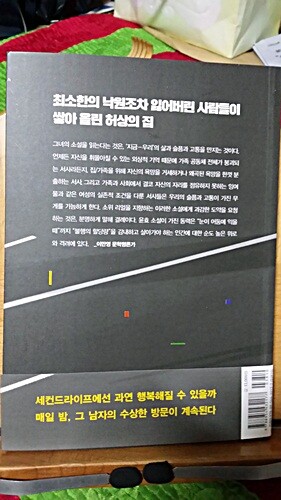
소설은 기실 광대한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어느 특정한 현실을 도려내고, 그 현실을 세계 전체의 문체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세계 속의 자아가 고투하는 것들이 마치 인간 일반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상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확보되었을 때 소설 속 현실과 세계와 고민들은 비로소 우리의 것으로 화할 수 있고, 소설의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논의해볼 만한 문제로 올라설 수 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예스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