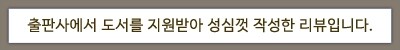-

-
내 기분이 초록이 될 때까지 - 매일이 기다려지는 명랑한 식물생활
신시아 지음 / 오후의서재 / 2022년 1월
평점 :




“한 식물원 강의에서 나는 강사, 저자는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다. 그때는 저자가 그저 식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좋아하는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해온 저자의 노력과 시간을 말이다. ‘관계’란 어느 한쪽이 주기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들어 준 식물, 그리고 그런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무던히 애쓰는 저자의 모습은 ‘식물과 현대인의 올바른 공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어준다.” 「 이소영 (식물 세밀화가, 『식물의 책』, 『식물과 나』 저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지켜본 제자를 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단 하나의 단어로 최고의 극찬이 되었다. 바로 ‘공생’이다. 식물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것이다.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니 말이다.
「신시아」 자신을 ‘식덕후’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식물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반응에 바로 피드백을 하는 반려동물과 지내는 사람은 많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식물을 반려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어려워한다. 이력이 굉장히 좋은데 13년간 출판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했다고 한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에서 식집사의 일상과 가드닝의 기술을 전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300개가 아닌 300종의 식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150개 내가 키우는 화분의 개수이다. 3년 전 아파트 생활의 삭막함과 환기를 못 하는 대기의 상태로 인해 ‘공기정화 식물’에 관심으로 공부도 없이 ‘NASA 공기정화 순위’에 들어있는 식물들을 집에 들이기 시작했다. 식집사 초보 시절에는 하나가 죽으면 둘을 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키우는 것에 집중했다. 그때는 ‘공생’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고, 오로지 집안의 쾌적한 공기정화라는 나만의 ‘욕심’만 가득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씩 죽어 나가는 화분을 보면서 ‘미안함’과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러 식물 서적과 미디어를 통해 식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식집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고향」 ‘내가 살던 고향’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하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을 의미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직접 태어난 고향이 있고, 유전자에 각인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이 있다. ‘향수병’이라고 한다. 오랜 항해나 오랜 외지생활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말한다. 실제 제국시대의 선원들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몇 년씩이나 고향을 떠나 있었기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동네 화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다. 이 식물들이 한국에서 판다 해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 식물에도 모두 유전자에 각인된 조상대대로의 고향이 있고, 열대식물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수입되어 팔리는 예도 많다.
온도·습도·통풍·물주기 이런 기술에만 얽매여 정작 중요한 식물의 대화를 거부했다. 화원에서의 잘못도 있다. 식물을 판매하기 전 이 아이들은 이런 나라에서 와서 이런 환경을 좋아해요 한마디는 해줘야 한다. 생각해보라, 40도가 넘는 열대지방에서 살던 사람을 영하 40도의 알래스카에서 살게 한다면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이 유독 한국의 겨울에도 힘겨워한다고 한다. 그렇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태어난 고향의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식집사이다.
『내 기분이 초록이 될 때까지』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서는 반려의 느낌이 들고 소통을 시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단순히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식물도 듣기 싫은 음악에는 몸을 돌리고, 해가 드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그리고, 예쁘다 예쁘다고 말을 해주면 정말 예쁜 꽃을 피운다. 솔직히 나는 ‘가드닝’이라는 말보다, ‘동거’라는 말이 더욱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각종 건강 프로그램이나 의학저널에서 검증된 사실은, 사람은 숲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 숲이 주는 공기정화와 음이온 같은 물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휴식과 치유를 한다.
책의 삽화에 나오는 화분의 식물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다. 이 사진만 보고 ‘몬스테라’, ‘베고니아’, ‘칼라디움’ 같은 식물들은 희귀종도 많고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다. 이쁘다고 그냥 아파트에 들였다가는 죽이기에 십상이다. 또한, 꽃이 나는 식물이나, 지중해 식물인 허브나 올리브나무, 율마 같은 식물도 통풍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나간다. 식물을 들이는 것에도 순서가 있고 난이도가 있다. 아이보다 성인이 면역력이 강하듯이, 식물도 어린 식물보단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한 큰 식물이 버티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마당이 있는 주택과 아파트의 생육환경은 전혀 다르다. 아파트와 같이 해와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력이 강하고 음지에서도 잘 버티는 식물 위주로 반려해야 한다. 책의 원래 제목은 ‘식물의 기분’이었다고 한다. 식물을 알아간다는 것은 저자처럼 오랜 기간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아주 느리게 소통을 해야 식물의 기분을 알 수 있다.
오랜만에 아주 예쁜 책을 만났다. 솔직히 식물들 가지고 책을 쓰면 반칙에 가까운 아이콘이긴 하다. 저자의 에세이를 보면서 이 식물을 들여야겠다가 아니라, 먼저 저자가 식물을 대하는 자세와 소통의 방식을 먼저 살펴보길 권한다. ‘식물도 나고 자란 고향이 있고, 식물도 살아있고 소통할 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