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쿄 기담집 ㅣ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 55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윤옥 옮김 / 비채 / 2014년 8월
평점 :




"네, 그렇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계기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나는 그때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 어쩌면 매우 흔한 현상이
아닐까라고요. 즉 그런 류의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 눈에 띄는 일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버리죠. 마치 한낮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희미하게 소리는 나지만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월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 시야에 일종의 메시지로서 스르륵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도형을, 그 담겨진 뜻을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목도하고는, 아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참 신기하네, 라고 화들짝 놀라죠. 사실은 전혀 신기한 일도 아닌데. 나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지나치게 억지스러운가요?"
- P.41, 우연 여행자中-
1.
하루키의 간결하면서 담담한, 동시에
상실의 아픔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좋아라 합니다.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에 주저없이 <상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텐데요.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단 저뿐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그의 여러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오는 족족
베스트 셀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 말이죠.
사실 <도쿄 기담집>이라는 제목에 끌렸던
것은 '기담'의 용어에서 '괴담'의 오싹함을 기대했기 때문이였습니다.
'기담'과 '괴담'의 차이를 지금에야 분명히 알지만 책을
읽었던 당시에는 구분하지 못했기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소름돋는 이야기가 아닌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찝찝한 뒷맛만 남겼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이를 먹고 다시 펼쳐본 책에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있었다는걸. 그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었다는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치는 매일 밤, 상아색과 검은색의 건반
여든여덟 개 앞에 앉아서 대부분 자동적으로 손가락을 놀린다. 그동안에 다른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소리의 울림만 의식을 타고
흘러간다. 이쪽 문으로 들어와 반대편 문으로 나간다.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는 가을이 끝나갈 무렵의 삼 주일 동안 하나레이에서 지낼일을
생각한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이언트리의 술렁임을 생각한다. 무역풍에 휘날려가는 구름, 크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앨버트로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에게 현재 그것 말고는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레이
해변.
-P.81, 하나레이
해변中-
2.
'기담'의 사전상
의미는 '이상야릇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도쿄 기담집>이라는 제목을 풀어보자면 '도쿄의 이상야릇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우연 여행자>,
<하나레이
해변>, <어디가 됐든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에>, <날마다 이동하는 콩팥 모양의 돌>,
<시나가와
원숭이> 제목만 들어도 뭔가 기이한 느낌을
주는 다섯개의
단편들은 일상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우연과, 섬뜩함등 비현실적 감정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대가로
누이와 멀어지게 된
한 사내의 이야기,
상어에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 고층 맨션의 24층과 26승 사이에서 실종된 남편의 이야기 등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이한 기담으로 가득차있다는 하루키의 상상력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때로 의도치 않게 내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번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자신이 겪은 우연이 사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눈에 띄지 않은 우연들이 나의 간절함과 만나 눈에
띄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신기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단편속 주인공들은 이런 우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이하지만 어쩌면
본인이 원했을지 모르는 우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레이 해변>이라는
단편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바다에서 잃고 매년 그곳을 찾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딱히 별다른 내용이 있는건 아니지만
짧은 단편속에
이처럼 짜임새있는 구성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게 신기했습니다. 주인공 사치는 서핑중 상어에게 물려 죽은 아들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하와이의
하나레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들의 주검을 확인하는 사치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이라기엔 지나치게 담담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사랑하지만 혈육이 아닌 이유로는 상종하기 싫다는 사치의 모습은 조금은 어긋난 어머니상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아들 또래의 두 사내를
만나고 덜떨어져 보이는 그들이 서핑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죽은 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들역시 그들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서핑을 탔을 것이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멋져 보였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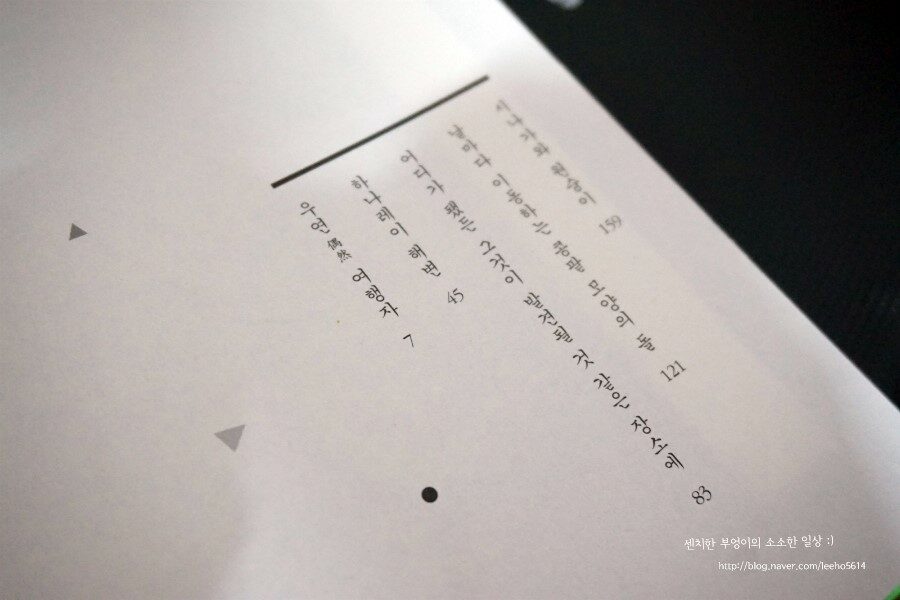
"무엇보다 멋진 것은 그곳에 있으면
나라는 인간이 변화한다는거예요." 그녀는 인터뷰어에게 말했다. "아니, 그보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서면 그곳에
있는 것은 단지 나와 바람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나를 감싸고, 나를 뒤흔들어요. 그렇게 바람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합니다. 동시에 나는 바람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바람뿐, 그밖에 다른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순간이죠. 아뇨, 공포감은 없어요. 일단 높은 곳에 발을 내딛고 그 집중 속에 빠져버리면
공포감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친밀한 공백 속에 함께 존재해요. 나는 그런 순간이 세상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P.154, 날마다 이동하는 콩팥 모양의
돌中-
3.
하루키의 책을 20대가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대에 읽었던 책은 사실 난해하고 어려워 단순히 그 쿨함과 가벼움을 뽐내기 위해 읽었던 반면. 지금에 읽는 하루키의 이야기는
그 쿨함과 가벼움 속에 묵직한 무게감을 찾아가며 읽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많은 감정들을 나이가 들어가며 배우게 됐기 때문일수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빛을 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루키의 책들이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었다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어 다시 읽을 하루키의 이야기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의 감성이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