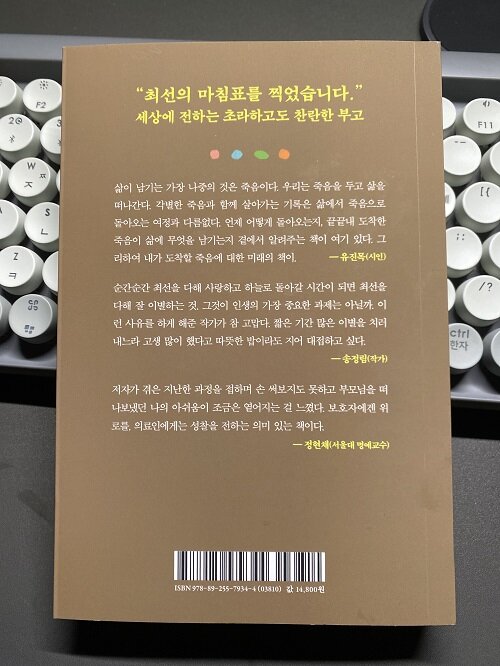-

-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죽는 게 좋잖아 - 참 다른 우리의 남다른 죽음 이야기
정재희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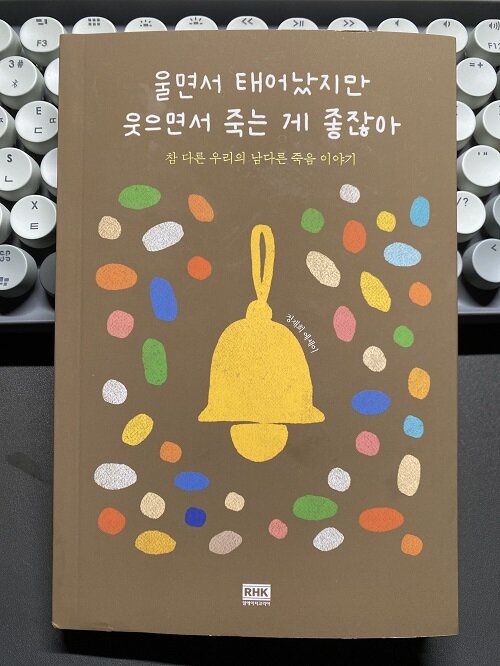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란 의미가 사뭇 진하게 다가온다.
주변인들의 부모님을 보내는 과정을 지켜봤고 남겨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다른 조건, 환경으로 고인을 보내지만 힘든 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등 힘들게 겪다가 가시면 가족들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었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앞으로 내가 겪을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다. 과연 어떤 것이 고인에게 이로운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정신적 치유, 자식으로의 도리로 해야할 입장, 우리사회의 죽음과 관련된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등 작가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음미해 본다.
86년 며느리와 39년생의 시아버지.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간극이 크다. 임신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 차이나는 남편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오롯이 육아에만 신경쓰다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어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한다. 아이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할만큼 컷고 체력도 어느정도 회복되어 다시금 경력을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알게된 시아버지의 6개월 시한부선고.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요양원도 거부하여 하루 이틀 아들에 집에 머무르게 한다던 남편은 아버지께 말을 하지 않는다. 식사를 잘 하시고 약도 먹어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니 충수염과 장이 터져 복막염이 왔다고 한다. 급하게 수술을 하려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수술동의서도 못 쓰고 아버지 자신이 사인, 연세가 있어 반신마취를 하고 수술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고통의 시작이었으니 약간의 마취로 섬망(의식장애와 내적인 흠분의 표현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이 온다. 착란증세에 신경은 민감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한다. 며느리에게 소리치고 눈을 흘기며 수술로 씻지않아 방에는 냄새가 가득차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 한끼 먹을 시간 조차 없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에 손을 대서 도둑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고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른다. 시아버지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으며 다급할 때 손을 내민 의사들은 형식적이고 병원시스템 또한 복잡하다. 자신의 일만하는 남편과 싸움이 잦고 보호자로서의 생활은 많은 트라우마를 만든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나 시아버지는 영면을 하시고 많은 시행착오속에 잘 사는것과 잘 죽는것에 의미를 드리어 본다. 과연 죽음이란 종착역에 어떤 과정을 드리우고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말이다.
하루하루를 건실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신과 남겨진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허무하게 오는 죽음이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