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K를 보다 - 한류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문명이 되었는가
정호재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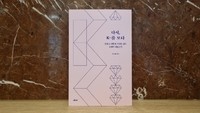
한류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문명이 되었는가
메디치미디어에서 출판한 정호재 선생님의 <다시, K-를 보다>는 한류에 관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한다.
정호재 작가님은 한국의 제도권 안쪽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언론사 기자 생활을 짧지 않게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내국인과 이방인, 주류와 경계인, 그리고 예술인과 야심가 들을 통해 한국(K-)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경험했다.
[ 다시, K-를 보다 책날개 중 ]
BTS 진이 생일날 발표한 ‘슈퍼참치’가 며칠 안에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찍이 문화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2021년 오징어 게임은 마치 신드롬처럼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주 넷플릭스 세계 순위는 이것이 세계 순위인지 한국 순위인지 헷갈릴 정도다. 10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류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BTS가 각국의 음원 순위를 1위를 차지하는 소식이 매번 있었던 일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고, 영화계에서 전하는 기생충, 미나리의 수상 소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저자가 전하는 통찰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오가며 과거에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곳곳에서 미디어에 드러난 한류와 그 영향력을 관찰하고 문명론을 연구하는 언론인 출신이라 그가 전하는 통찰력은 날카롭다. 단순히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한류가 오늘날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계기와 사건, 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알 수 있다.
한류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지만, 어느덧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와 일본의 대중문화였다. 일본은 1980년대 초,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때 일본 문화 역시 세계로 수출되었다. 저자는 1980년대 일본 문화를 이끌었던 애니메이션이 아시아 지역에 값싸게 대거 보급되며 ‘아시아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의 부재와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1985년의 ‘플라자 합의’는 부동산 가격 폭락을 가져왔고, 일본의 고민은 ‘일본인은 누구인지?’라는 고유의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고 대중문화가 세계를 지향하기보다 국내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케이팝의 역할은 지대했다. SM과 JYP 같은 기획사는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 인재 영입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남아 출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YG의 산다라박 영입이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보아’로 불리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로 떠오른 그녀는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한국에 인지도를 넓혔다. YG의 2NE1 그룹 활동은 케이팝이 아시아를 벗어나 미국에서 흥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태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었던 소녀시대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카라의 선전과 2NE1은 미국 대륙에 케이팝을 알렸다. 산다라박은 타갈로그어를 구사했고 필리핀인은 2NE1은 친근하게 여겼으며, 미국 내 4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커뮤니티에 이들의 음악을 전파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대형기획사 SM, JYP, YG, 하이브의 철학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아시아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도 의미 있었다. 만주의 헤로인 이향란에서 아시아 전역을 ‘야래향’이란 아름다운 노래로 수놓았던 등려군과 일본 가요 시장에 진출한 조용필,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아이유의 이야기는 가요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아시아 문화를 주도했던 ‘전공투 문화’와 도시 속 개인의 소외, 우울함을 알린 무라카미 하루키와 하루키 소설에서 드러나는 정서를 화면으로 구현한 듯한 왕가위 감독의 전하는 홍콩에 관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다.
아무래도 아시아 문화를 논하는데 중국을 빼놓을 순 없다. 중국의 한한령이 케이팝의 경쟁력을 키웠다는 설명은 귀에 쏙 들어왔다.
2016년 쯔위의 대만 국기를 가지고 방송에 잠깐 가지고 나온 사건은 대만의 민진당 정권을 만들었다. 중국 현대사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을 섬멸하기 바로 직전 터져 중국과 대만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던 1936년 시안사태의 장개석과 장학량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만은 우리에게 최우방 국가였다. 장개석 총통은 김구 선생의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선언한 카이로 선언의 연합국 대표를 설득해 이를 관철한 이도 장개석 총통이다. 타이베이 중정기념관 박물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빌리기 위해 대만을 방문할 당시 사진이 걸려있는데, 대만 처지에서 보면 독립과 나라가 일어설 때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쯔위의 대만 국기는 대만인에게 독립에 관한 정체성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고, 민진당의 대만 독립 정책은 중국에선 결코 묵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저자가 오랜 시간을 미얀마에서 보내서인지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미얀마의 미옌링에 관한 이야기가 <금병매>, <옥보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미얀마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놀라웠다.
미얀마는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의 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굶주릴 동안, 쌀을 지원한 나라이다. 우리와는 비슷한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듯하다. 얼마 전 나홍진 감독의 영화 <랑종>이 태국에서 촬영되었는데, 미얀마도 불교국가지만 민중은 낫 신앙을 믿으며 이는 무속신앙을 믿는다.
아시아 곳곳에서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영향력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다. <다시, K-를 보다>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와 이문세의 별밤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공감대와 지난 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K를보다 #정호재 #메디치미디어 #인문 #교양 #한류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