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 - 선택과 모험이 가득한 인류 진화의 비밀 속으로
이상희 지음 / 우리학교 / 202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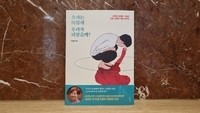
선택과 모험이 가득한 인류 진화의 비밀 속으로!
한국인 최초 고인류학자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500만 년 인류 진화의 특별한 여정!!
우리학교에서 출판한 이상희 교수님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는 인간다움의 과정을 지나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가 출현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본다.
저자인 이상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마쳤다. 일본 소고켄큐다이가쿠인 대학교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인류학과 교수로 있다. 한국인 최초 고인류학 박사로, 세계의 발굴 현장을 누비며 고인류 화석을 연구한다.
[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 책날개 중 ]
일전에 읽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지만, 그중 압도적인 내러티브 중 하나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학살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상희 교수의 저술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는 사피엔스에 비해 잘 알려졌다. 호모 사피엔스는 현존하는 인류라는 점을 제외하면 학자들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한다.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생각만큼 많지 않았고, 화석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다. 이 사실로 그들의 작은 규모의 집단이었고 근친교배 비율이 높았다는 방증이다.
그들은 수가 많지 않았고, 영양실조와 영양 부실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에게 몰살당해 사라졌다는 가설을 흥미롭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힘겹게 살 만큼 살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유라시아의 다양한 인류 집단과 유전자를 섞었다.
역사 블로거 히스토리님은 네안데르탈인은 대표적으로 비만 유전자를 물려줬다고 하니 추위와 빈곤에 시달렸던 그들은 기후에 저항하며 생존하기 위해 비만 유전자를 통해 지방을 축적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Photo by satya deep on Unsplash
이 책은 우리 인류가 700만 년 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다움을 가지며 진화했는지 보여준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당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라는 만평을 통해 그를 조롱했다. 학자들은 침팬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600~700만 년 전에는 공통 조상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그 후 인류와 침팬지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고인류학은 지금은 사라진 옛 인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옛 인류란 수백만에서 수십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는 호모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계통은 인간과 매우 다르게 생긴 침팬지뿐이다.
생물 시간에 배웠던 칼 폰 린네의 생물 분류의 체계를 외웠던 기억이 있다면 ‘종-속-과-목-강-문-계’가 떠오를 것이다. 린네가 활동할 당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한꺼번에 발견되었다. 그는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생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 생물 분류 체계를 만든 린네는 인간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간이 동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당대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100년 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통해 생명체가 모두 기원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하고 변화하면 다른 종으로 갈라지고 멸종한다는 사실에 세계는 경악했다.
저자는 인간다움의 첫 번째 조건인 ‘두 발 걷기’ 부터 ‘슬로 라이프’, ‘큰 두뇌’, ‘도구 사용’, 그리고 ‘긴 다리’까지 진화의 과정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 흥미롭게 소개한다.
가장 유명한 고인류 화석인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종명이 붙었다. 330만 년 전에 살았던 루시는 많은 부분 침팬지와 비슷했다. 단 ‘두 발 걷기’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뼈는 침팬지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엉덩이와 골반뼈는 판이하게 다르다. 엉덩이 근육을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두 발로 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출산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특별하다. 좁은 산도를 거쳐 아기와 산모에게 모두 힘들게 출산한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면서 감각 기관이 작동하고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 조숙하지만, 팔다리가 짧고 몸을 가눌 힘이 없다는 점에서 미숙하다. 심지어 두뇌도 덜 커서 두개골의 봉합선이 열려있다. 아기의 숨골에서는 팔딱팔딱 뛰는 두뇌가 느껴지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 누르면 숨 쉬는 게 느껴진다고 눌러대는 인간을 보며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아기의 머리를 눌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아기는 미숙하게 태어나지만, 몸집은 크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혜와 슬기는 인간의 특징이고, 이를 관장하는 부위는 ‘두뇌’다.
인간의 두뇌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큰 두뇌는 인간의 주요한 특징이다.
구석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인간은 채식에서 육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니와 송곳니가 작고 어금니는 큰 편이다.
이제 긴 다리를 가진 ‘나리오코토메 소년’이라는 화석의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다. 왕조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다른 호모 종들과 공존하는 시기였다.
호모 에렉투스는 긴 다리와 털 대신 땀으로 체온조절을 했다는 점은 이들이 실제로 달렸다는 점과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호모 에렉투스는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우리는 조상의 조상이 누구였을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는 고인류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학문적 내용을 바탕으로 인류 진화의 과정을 소개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리뷰어스클럽 #서평단모집 #네이버독서카페 #리뷰어스클럽서평단 #우리학교 #우리는어떻게우리가되었을까 #이상희 #생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