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들끓는 꿈의 바다
리처드 플래너건 지음, 김승욱 옮김 / 창비 / 2023년 11월
평점 :




표지에서 예측할 수 있듯 이 책은 2019년 호주의 산불 사태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이라고 했을 때 워낙 큰 사건이라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면서도 어딘가 흐릿해졌다. 그 이유는 시간이 꽤 지나서도 있고, 그 후에 코로나라는 큰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이후에도 발생한 수많은 산불 때문 아닐까. 호주 산불 외에도 하와이, 그리고 우리나라 울진과 삼척 부근에서도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큰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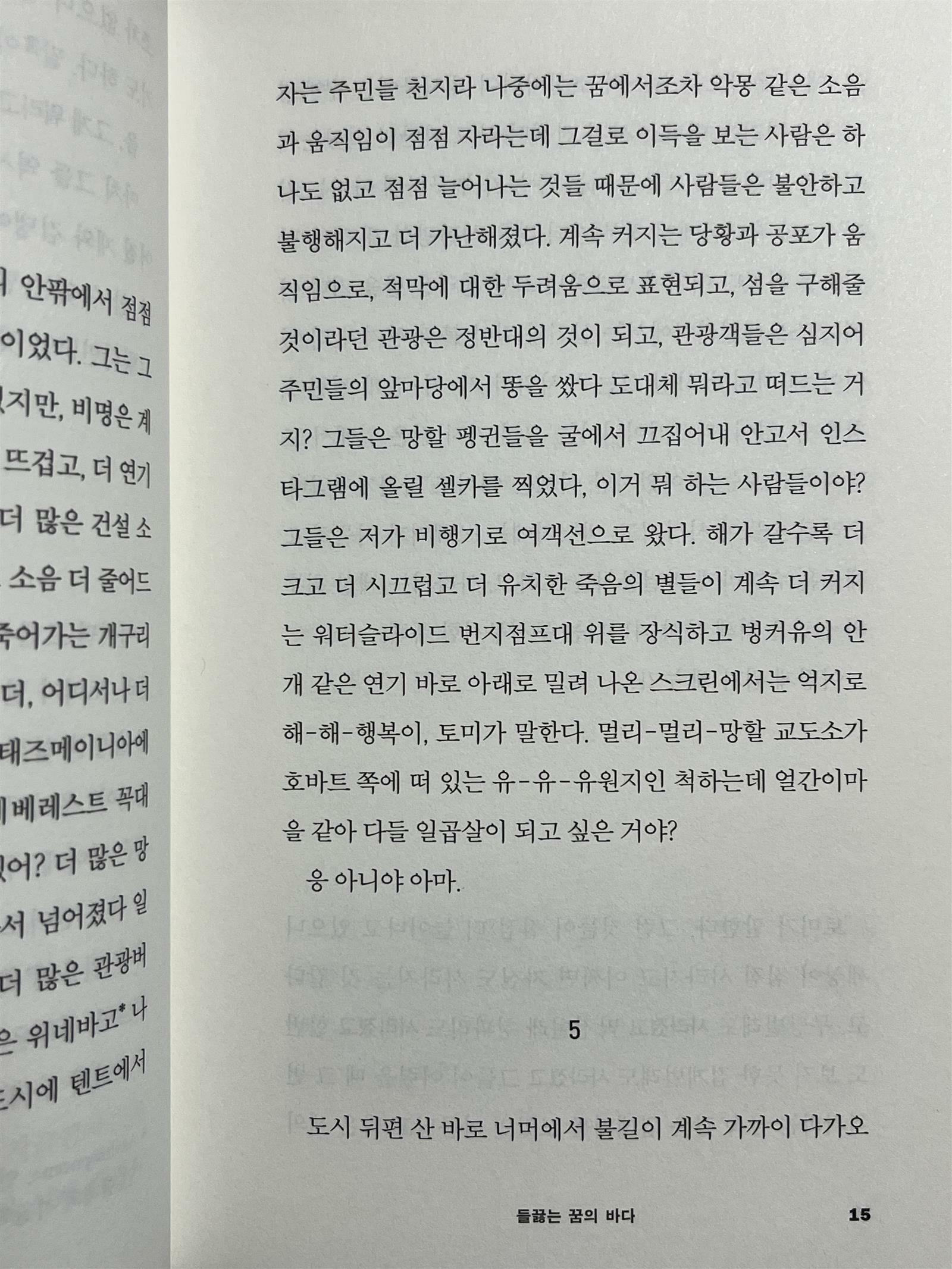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입은 호주. 건축가 애나는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녀의 고향은 태즈메이니아 섬의 호바트.
불길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숲도, 푸른빛의 바다도 모두 찬란하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고작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카메라 너머의 풍경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애나의 동생 토미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며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붕괴라는 말에 걸맞은 지금 현 상황이 소설 속에서도 펼쳐진다. 어쩌면 큰 산불을 겪은 곳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피부로 느낀 이야기일 것이다. 황폐한 그곳에서도 결국 사람은 살아간다. 이 소설은 그들의 이야기다.

많은 것이 살아있지만 멸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기후 붕괴를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간다. 소설 속 인물들도 그렇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살며 정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식들은 어머니 프랜시의 연명치료를 밀어붙였고, 프랜시는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외눈박이 cia요원이라던가 마녀같은 것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이다.
변화는 프랜시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애나 또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시작했지만 무릎, 가슴 한쪽 등 점점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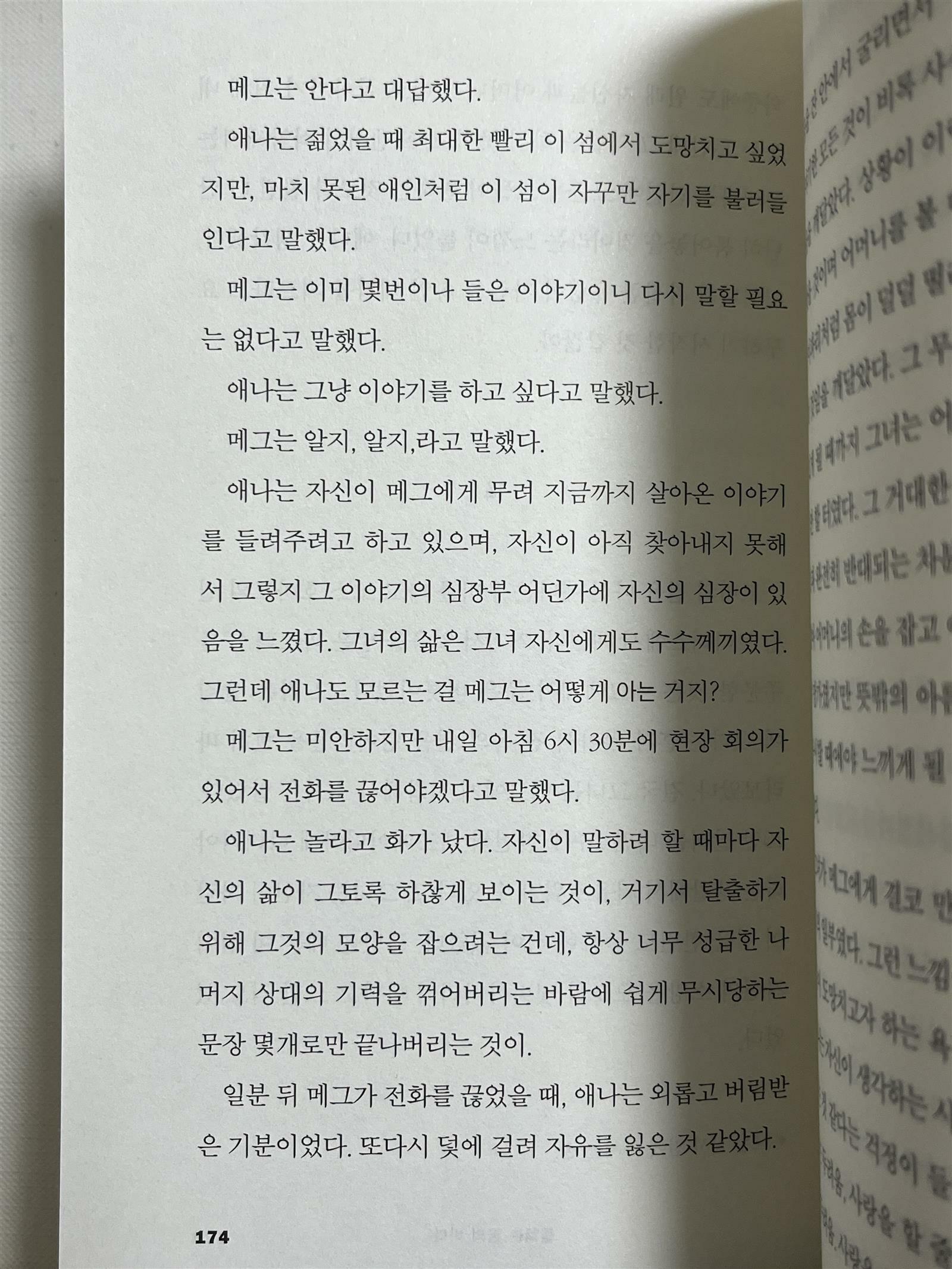
소설은 산불의 위험, 산불로 피해 입은 가족,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의 속마음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
애나는 메그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속마음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결국 하려던 말을 못 한 애나는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었을 때 메그에게 만족스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이 사실은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두려움. 사랑을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냐는 애나의 독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개처럼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사는 것 아닌가?
어차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등장인물이 내뱉은 한 마디는 책을 덮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인간다움이라는 것. 점점 거대해지는 기후 위기라는 큰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의 내린 인간다움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