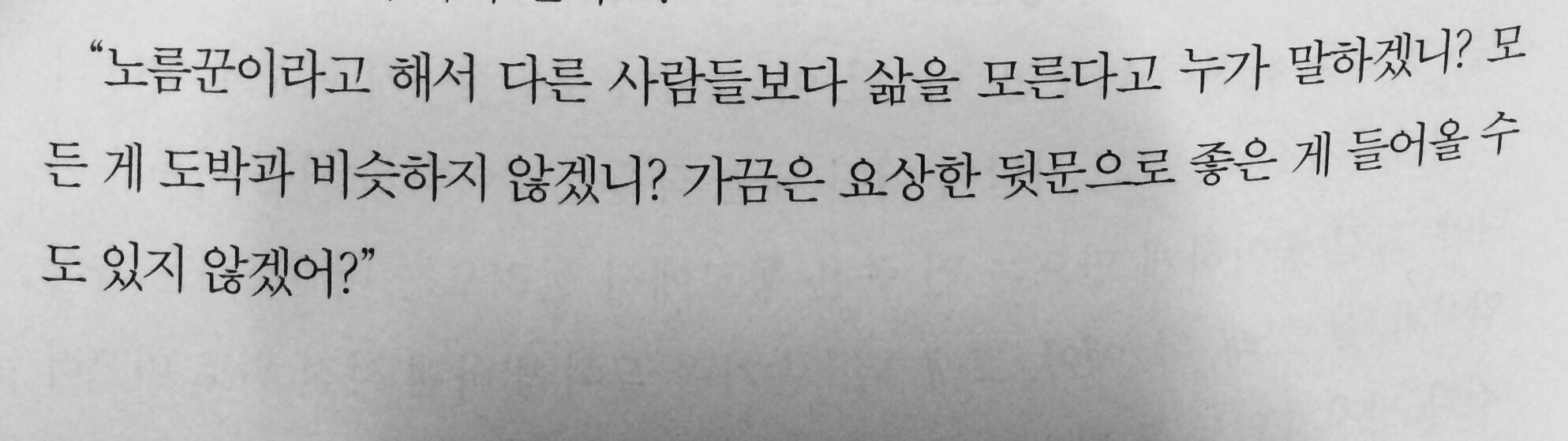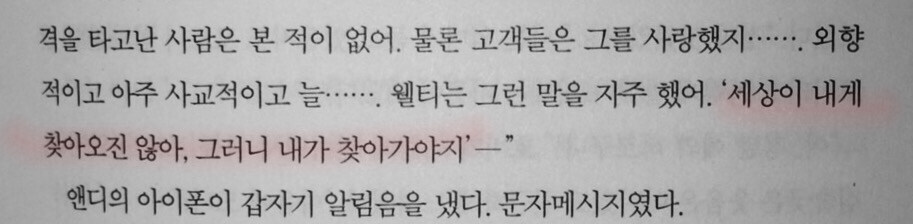-

-
황금방울새 1
도나 타트 지음, 허진 옮김 / 은행나무 / 2015년 6월
평점 :



-이 책을 읽으며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가 생각났다.
큰 사건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되 무게를 잡는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과, 유려한 묘사가 닮아있다.
-시오는 자신이 들고 나온 그림인 황금방울새와 비슷하다.
폭발사고의 기억과 반복되는 상실감이 그의 삶 곳곳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상기되는 기억은 새의 발목에 묶인 사슬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조금씩 성장하며 강해지지만,
그 시간만큼 외로움은 덧입혀진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꼭 그만큼의 사람들이 그를 떠난다.
담담하게 이어가는 문장이 왜 조금 더 아픔을 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인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시오에게 연민이 느껴졌다.
사고가 있은 후 시오에겐 보이지 않는 막이 둘러쳐진 것 같았다.
시점은 1인칭 이었는데도, 문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랬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잠잠한 시오는 약이 좀 들어가면 그제야 강렬해졌다.
시오는 약을 꽤 많이 들이마셨다. 약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읽는 내내 나까지 머리가 띵했다.
마약을 할 때의 묘사는 또 어찌나 사실적이던지, 작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든 어째서든 약을 하긴 했을 거라 생각한다.
-잘 읽고 있다가 뒷부분 급전개에 살짝 실망했다.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전은 마음에 들었다.
‘그 일’을 해치운 게 보리스이고, 그가 살짝 설명해준 걸로 사건이 해결되며 시오는 마음을 놓는다! 라는 전개가 싫었다는 거다.
‘나’ 를 주어로 삼는 소설의 가장 큰 강점은 몰입력과 공감력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잘 이어왔던 소설이 후반부에서 둘을 모두 잃은 것 같았다.
솔직히 급하게 흥미가 식어 완독을 하지 못할 뻔 위기를 맞은 부분이 저기다.
끝이 좀 더 좋았다면 여운도 길게 이어졌을 터인데, 아쉽기만 하다.
단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반복이다.
독자는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일만큼 잘 기억한다.
굳이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웰티가 죽기 직전. 느낌상으로 몇 번은 나온 듯하다.
강조를 위한 장치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진행이 더뎌지는 것이. 내 취향은 아니었다.
-책을 다 읽고 황금방울새를 검색해서 살펴봤다.
소설이 아닌 그림을. 표지에 있는 새는 부리와 가슴 털을 간신히 내보인 상태라, 읽는 내내 그림의 본모습이 궁금했다.
어떤 작품이기에 시오는 저렇게 경탄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온 나라가 찾아 헤매는가.
황금빛 횃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새는 책을 읽으며 상상한 것과 흡사했다.
비록 묶여있지만 언제라도 날아오를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하며.
그림을 보고 나니 새는 시오의 모습이 아닌 시오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공허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닐지.
사슬을 발목에 감고도 주눅 들지 않는 황금 새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