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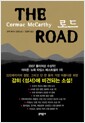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더 로드'라는 소설을 알게 된 것은 영화를 보고 난 부터다.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한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종말의 세계'에 꽂혔던 적 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라진 디스토피아에서 느껴지는 적막감과 적당한 긴장감. '생존'과 '삶'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묘한 쾌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한다. 이 영화는 어떤 이유에서 종말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종말한 세계에 살아남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다. 유일한 혈육이된 부자지간은 서로를 의지하고 생존해 간다. 그 적막감이 '아내'가 죽기 전까지 꽤 버틸만한 적막이었다. 다만 아내가 죽고 난 뒤의 적막감은 정말 세계가 무너져 버린 종말과 같다. 영화를 본지 꽤 지나서 소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설은 세 번은 본 것 같다.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적막감이 더 극하게 다가왔다. 영화에서 '아들'로 나오는 아이는 '창백'하고 '연약하다. 목소리와 피부, 그 눈빛까지 얼음장 같다. 금방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그 모습은 중성적이다. 목소리와 외형만 보고서,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 차갑고 연약한 아들과 점점 까맣게 초췌해지고 지저분해져가는 아버지는 완전 극적이면서 닮았다. 영화 속에서 뇌리에 강하게 때려와 박힌 장면이 있다. 우연히 아버지와 아들은 '캔 콜라'를 발견한다. 종말한 지구만 기억하는 아들에게 '콜라'의 맛을 알려주고 싶던 아버지는 '콜라캔'을 따다가 아들에게 건낸다. 아들은 그 톡쏘는 이상한 맛에 재미를 느낀다.
'그 장면'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나는 콜라를 몹시도 좋아하게 됐다. 모든것이 끝이 난 '회색빛 색깔'에 빨간색 콜라캔은 너무 매력적이고 독보적이었다. 그 장면은 마치 '희망'을 닮았다. 모든 것이 망해버린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 그것은 달콤하고 톡쏘고, 새빨갛다. 그 장면은 영화의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였다. 나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 그 영화를 사랑하게 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음식이 가득 있는 벙커를 발견한다. 그때 느껴지는 대리 만족감은 그것이 영화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다. 그곳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아주 짧게 보내다가, 다시 그들은 그 벙커를 버리고 고행을 한다. 그 아쉬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그것이 인생을 닮았다. 이 영화는 손꼽는 명작 중 하나다. 그런 탓에 이 책도 그렇다.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볼 때가 있다. 대체로 그것은 짜임새가 있고 훌륭한 편이 많았다. 되려 원작을 읽을 때, 그 감성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물론, 빨간색 콜라 캔을 따며 들리는 소리, 그것을 삼키는 소리 등 영화가 나에게 남겨 주었던 강한 임팩트는 없다. 그러나 잔잔하게 흘러가는 서사가 그에 합하는 매력을 준다. '더 로드'라는 소설은 가끔 한 번씩 떠오른다. 가끔 복에 겨워, '삶' 이외의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될 때가 그렇다. 무언가를 더 원할 때, 이미 모든 것이 종말한 세계와 그 결핍이 가져다주는 감사의 마음은 삶을 다시 살게 한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세계를 겪고 난 뒤, 시간을 돌려 과거로 온 것 처럼, 이런 디스토피아적 소설과 영화는 삶을 두 번 살게 만든다. 오랫만에 읽은 '더 로드'라는 소설. 잔잔하지만 임팩트있고, 적막하지만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