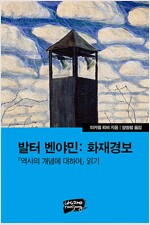벤야민 이어서 쓰기 3
벤야민은 기억의 대상으로서 역사를 사유한다. 회상하는 사람이 기억한 내용은 벤야민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기억 작업이 곧 이미지를 만든다. 그래서 역사 이미지는 무한하다. 이 무한성이 역사와 기억을 다루는 벤야민에게 특이한 점이다. 물론 그렇다. 인간이라는 삶은 하나일수도 없고, 직선적으로 살아낸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을 때는 많지만 말이다. "기억이라는 페넬로페적 작업"을 성좌 구조로 연결하는 벤야민은 역사를 신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벤야민은 진화론적 경향도, 실증적 사고도, 목적론적 진보도 거부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맑스는 혁명이란 세계사의 증기기관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상황은 완전히 다를지도 모른다. 아마도 혁명은 이 열차에서 여행 중인 인류가 비상 브레이크를 잡는 일일 것이다."(199쪽)
벤야민이 '정지상태로서의 혁명'을 말할 때 언급하는 여행객을 떠올려 보자. 맑스의 역사 유물론은 최종 목적을 향해 증기 기관차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사실 여기에 혼란이 있다. 세계사의 증기기관차는 벤야민의 표현처럼 자동 장치일텐데 어떻게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을까. 여행 중인 인류는 누구일까. 우선 혁명가나 투사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유랑하는 민족? 혹은 귀족? 상인? 신학자? 예술가? 무엇보다 만약 기억 작업이 페넬로페적이라면 여행 중인 인류는 페넬로페일까 아니면 남편인가. 따질 것도 없이 아도르노가 신화를 재해석하면서 페넬로페를 자연-여성이라는 종속적 위치에서 해방시켰듯이 페넬로페일 것이다.
벤야민은 연대기적 서술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건들이 짜임새 있게 연쇄된, 역사기록을 의심한다. 벤야민은 직조된 페넬로페의 베틀작업보다 그걸 다시 풀어내는 작업을 더 중요시 할 것이다. 진정한 역사의 이미지를 변증법적 이라고 말하는 까닭도 그럴 것이다. "건설적이면서 동시에 해체적인" 것을 통해 현재를 재구성하려한다.
"뢰비의 결론에 따르면, 벤야민의 역사철학은 한마디로 해방을 위한 혁명적 비관론이다. 이것은 “역사는 원래 그렇게 진행될 것이[었]다”(즉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었]다”)라는 ‘멜랑콜리한 숙명론’=‘역사주의’에도, “진보는 불가피하게 승리할 것이다”(혹은 “대중의 지지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좌파의 ‘낙관론적 숙명론’=‘진보주의’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역사는 어떤 의미로든 미리 정해져 있기보다는 무한히 열려 있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이 열림 속에서 역사의 다른 가능성들, 즉 해방적이고/이거나 유토피아적인 가능성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벤야민의 역사철학은 이를 위한 일종의 참조점이다."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 소개말 중에서)
이상하다. 나만 그래? 그렇다면 그렇고.
건설도 해체도 페넬로페가 해낸다면 이는 자동장치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페넬로페가 유예시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페넬로페의 비상 브레이크는 작동한 게 맞나.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은 몰랐을까. 할 말은 더 많으나 내일 이어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