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식가의 수첩 - 맛 평론의 원류 언론인 홍승면의 백미백상
홍승면 지음 / 대부등 / 2023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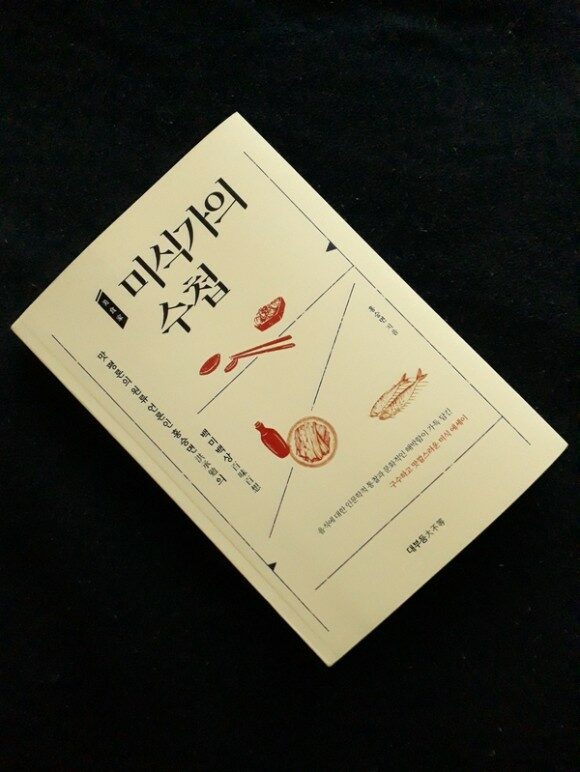
저자는 원조 맛 칼럼니스트인 故 홍승면 씨라고 한다. 故라고 쓴 것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생소한 이름이라 누군가하고 봤더니 저자는 27년 생으로 83년에 이미 고인이 되었고, 원조 맛 칼럼니스트로 7~80년대에 여성지에 음식칼럼을 연재했는데 사후에 그 글들을 모아 '백미백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서 출판했고 그 책을 이번에 다시 [미식가의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한 것이라고 한다.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면 음식이야기보다 정치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황교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자는 벌써 5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라니 공히 원조 맛 칼럼니스트라고 부를만 하다. 물론 꼭 오래전에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원조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찐 맛 칼럼니스트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저자가 7~80년대에 연재했던 음식 칼럼을 다시 출간한 것인데 그 글들을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 많다. 내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드러나는 문장도 있지만 과거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모른채 읽는다면 상당수는 바로 지금 쓰여진 글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식문화는 50여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꼬리곰탕 이야기를 하면서 꼬리곰탕에도 인스턴트 시대가 오기는 왔다라고 말하는 문구가 나온다. 이런 곰탕류의 인스턴트화는 최근 비비고 같은 제품을 통해 형성된 식문화라고 생각했는데 50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재미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인스턴트 꼬리곰탕은 지금의 비비고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오히려 지금 배달전문식당에서 만드는 가짜 싸구려 곰탕과 닮아있다. 어쨌건 50년 전이라고 하면 식문화는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바 없다는 점이 신기하다.
더불어 당시 저자와 같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식문화와 당시의 젊은이층에 대한 평가도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그것과 비슷해서 좀 재미있다. '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농촌에서 태어났고 국민학교까지 농촌에서 다녔는데 마를 모르는 젊은 후배가 있다며 놀라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엔 이게 예전 글인줄 모르고 읽어서 MZ세대는 마를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반백년 전에도 젊은 사람들은 마를 모르고 있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를 모를 수도 있지만 50년 전의 사람들은 농촌 도시인 상관없이 그 정도는 다 알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에도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고, 기성 세대는 그것을 놀라워한다는 게 재미있다. 또 한국은 봄이 짧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봄이 짧아졌다고들 말하는데 7~80년대에도 이미 봄은 짧았던 것이다. 음식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간간히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오래전의 한국과 지금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꽤나 쏠쏠하다.
반대로 시간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짜장면에 대한 글을 들 수 있겠다. 당시 기준으로 중국 요리가 한국에 들어온지 1백년도 안 지났지만 짜장면은 전국을 휩쓸었고 방방곡곡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짜장면이 보급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우선 값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당시에는 짜장면에 싸고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였고 그래서 반드시 설렁탕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짜장면 값은 정체되고 설렁탕 값은 마구 뛰어서 당시 시점으로 결국 설렁탕 한그릇 값이면 짜장면을 두그릇 먹을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은 짜장면이 결코 싼 음식은 아니게 되었다. 물가, 외식값 상승에 대한 뉴스에는 항상 서민 음식인 짜장면 값이 마구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은 짜장면과 설렁탕 값이 어떤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20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두배 이상씩 뛰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설렁탕 한그릇이 얼추 짜장면 두 그릇값이라는 비율은 나름 유지되고 있었다.
책은 크게 세파트로 구분되는데 처음은 자연을 담은 소채의 맛으로 산채 두릅, 쑥, 마, 더덕과 송이, 미역과 김, 수박, 화채, 고추와 후추 등 야채와 과일 및 야채를 활용한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 사계의 음식 편에서는 계절 음식이라는 테마로 여러 음식들을 소개하는것 같은데 그중 몇몇은 계절음식이라는 인식이 약한 것도 있다. 예컨데 나같은 국밥충에겐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건 계절음식이 아니라 사시사철 먹는 것이고 돼지고기도 계절을 타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계절 음식이 아니라 신정이나 부활절 등 특정한 날과 기간에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다. 세번째 파트는 생선 이야기로 다양한 생선이 소개되는데 실제로 지금도 널리 먹고 있는 익숙한 생선들이다. 반백년의 시간이 흘렀고 세대도 바뀌었지만 한국인의 입맛은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지금으로부터 반백년이나 전에 쓰여진 글이라 아무래도 지금의 감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나도 사람 자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정서적으로 너무 동떨어지거나 오래된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잊혀지거나 희미해져가는 식문화를 건드려줘서 추억도 돋고 지금과의 비교에서 오는 재미도 있다. 저자의 경험 같은 신변잡기나 당시 사회상 등의 썰을 푸는 것으로 시작하여 과거의 문헌 속 기록, 역사적 맥락, 다른 나라에서의 유사 음식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저자가 건드리는 분야랄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음식과 관련된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에 탄복하게 된다. 특히 해외 여행도 쉽지 않았을 그 시절에 직접 외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디서 줏어들은 잡지식을 읊어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공이 상당하다.
보다보면 일본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싫건 좋건 한국의 식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황교익이 뭐든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도 하겠다. 사람들은 만물 일본 유래설을 말하는 황교익을 상당히 비판했지만 이 책을 통해 그중 일부는 실제 일본의 영향으로 먹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데 우리는 장어는 먹지 않았지만 일본인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는 황교익의 주장인데 저자의 말로는 오래전 문헌에도 장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선이었다는데 지금은 비싸게 먹고 있다고 말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먹었다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먹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장어를 비싸고 귀하게 취급하는 일본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자는 이를 민족의 식생활에서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