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순간의 공간들 - 소란하지만 행복했던, 다정한 그곳에 대한 단상
이주희 지음 / 청림출판 / 2024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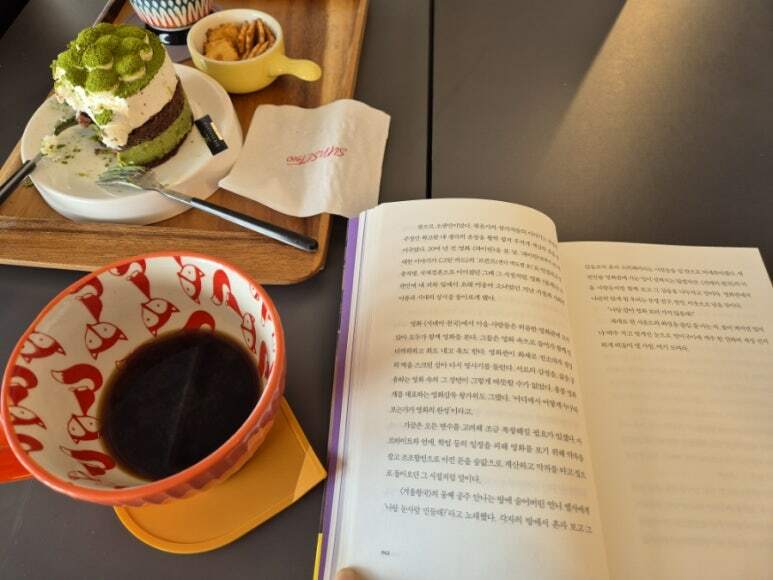
모든 순간의 공간들, 이주희 지음, 청림출판
"인생의 서사는 자신이 머무른 곳에서 부터 시작된다. 소란하지만 행복했던 다정한 그곳에서의 단상들" 책 앞뒷면에 있는 이 카피문구가 딱 이 책을 잘 정의하고 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겨울은 뭔가 허전해지고 비워지는 그래서 더 허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50을 맞이한 내 인생도 더이상 아등바등 소란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 가볍게 편하게 카페 읽을 만한 책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고 중간중간 자꾸 멈추며 생각하다 보니 며칠 동안 읽었던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이주희님은 54년 동안 세상을 경험했고, 워킹맘으로 멋지게 살았고, 현재는 일하며 살아오며 느낀 소소한 깨달음을 글과 강연으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이토록 멋진 오십이라면>,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오십이 되었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주희님의 책이 나에게 더 감동적인 이유는 아마도 나와 비슷한 연배, 내 언니 또래의 나이였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수많은 장면들과 공간들에서 나도 문득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아빠,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것이 40대였고, 50대가 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 왔다. 목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몸을 맡길 때 힘을 빼야 세신사가 덜 힘들게 때를 밀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나는 너무 많은 힘을 주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 같다.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기대, 가족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참고, 희생하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지 않았을까?
결혼식 봉투에 쓰는 축 화혼(의 '화'자가 자작나무 '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사전을 찾아보니 남자 결혼에는 축결혼을 쓰지만, 여자한테는 축화혼을 쓴다고 한다. 자작나무에 불이 붙듯이 부부의 인연이 더 깊어 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가 말한 것처럼, 결혼생활이란 상대에 대한 마음을 활활 태워 자작나무처럼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얼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서로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우리는 너무 안맞다고 그려려니 하니 포기하는 경지에 이르기 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제 한 발짝 떨어져서 차갑게 얼리면 상대방을 조금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갈 때는 한 번,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니, 고등학교 동기 단톡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고가 올라온다. 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올해 2월과 10월 소천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의사는 이런 나를 '적응장애'라고 했다. 언니는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며 미안해했다. 이 세상에 왔으니 돌아가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내 부모님은 평생 나와 같이 있을 것만 같았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할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게 적응이 안되었다. 불과 한 시간 전에도 통화를 했던 엄마의 부고를 동생에게 들었을 때에는 '거짓말'이라는 말부터 나왔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엄마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다가 천국가시기를 원했는데, 진짜 그렇게 소천하였다.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나를 위해 참 많이 희생하고 배려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오죽하면 장례식이 끝난 후 친정집에서 언니와 둘이 자는데 언니의 코 코는 소리에 안정감을 느꼈을까? 가끔씩 맛있는 점심을 사주는 친구, 선배가 있고, '함밥'을 해 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저자의 말처럼 상실의 슬픔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바래본다.
소설가 채만식이 1939년에 잡지 <조광>에 기고한 글에는 커피를 '힝기레 밍기레한 게 맹물 쇰직한 맛'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처음 커피를 마실 때에만 해도 설탕이나 프림이 꼭 있어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설탕, 프림없은 원두 그대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톨 사이즈 카페라떼를 먹으며 양이 왜 이렇게 많냐며 남편과 나눠 먹곤 했었는데, 이제는 각자 그란데 사이즈를 마신다. 아이를 낳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몸살감기가 올 때면 따뜻한 카페라때 한잔 마셔주면 거뜬해졌었다. 드롱기 반자동 머신을 사서 아침마다 커피를 만들어 먹는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핸드드립의 매력에 빠져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재배된 원두와 가공방법, 로스팅 방식을 달리 할 때 달라지는 커피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남이 만들어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 커피가 주는 위로가 참 좋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일고 있는 지금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함을 주는 이 책과 함께여서 참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