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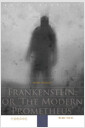
-
프랑켄슈타인 ㅣ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1
메리 셸리 지음, 박아람 옮김 / 휴머니스트 / 2022년 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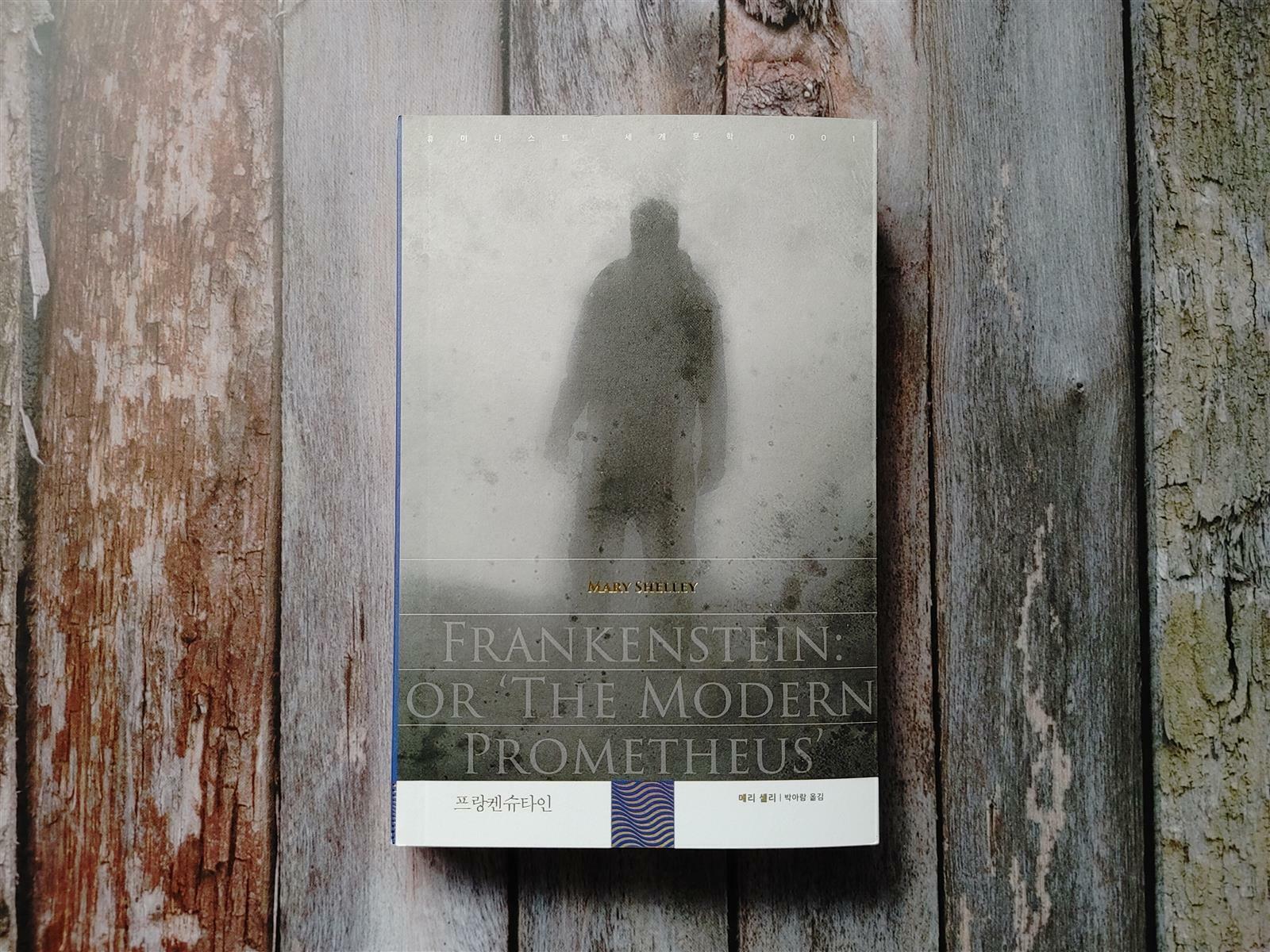
북극을 항해하던 선원들은 어느 날 한 사내를 구조하게 되었고, 그 사내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으로, 제네바에 살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거의 없는 평범하다 할 수 있는 삶을 살던 젊은이였다. 그는 대학에서 자연과학에 몰두하여 생명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였다.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빅토르는 자신이 만들어낸 인조적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실험을 하게 되었고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기쁨도 잠시, 빅토르는 금세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에 대한 공포심에 주체를 하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생명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버려졌다. 빅토르는 도망쳐 나오고도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고향에서 들려온 자신의 막내 동생 윌리암의 피살 소식에 황급히 제네바로 돌아가게 된다.
윌리암이 살해된 곳에 간 빅토르는 인근에서 보이는 적나라한 사람의 형체를 보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괴이하고 거대한 형상에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가 악마라고 생각했던 빅토르는 사람이라면 윌리암같은 예쁜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분명 그 악마 같은 생명체가 저지른 일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생명체에 대한 빅토르의 증오는 커져만 갔고, 무고한 사람이 윌리암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자 빅토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증오로 가득 찬 빅토르의 앞에 생명체는 모습을 드러냈고, 예상치도 못한 대화를 시도해왔다.
그 생명체는 빅토르가 자신을 차가운 실험실에 버리고 간 뒤 자신이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해왔으며,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버려두었던 빅토르를 원망하지만 자신의 창조주이기에 예를 갖출 것이며, 만일 자신과 같은 처지인,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준다면 기꺼이 그 존재와 함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인적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빅토르는 증오와 더불어 혐오에 휩싸여 이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생명체는 이 부탁이 요청임과 동시에 협박이라고 하였고, 이에 빅토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아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해 보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었던 생명 부여에는 성공하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한심하고 나약한 인간인 것 같다.
그리고 빅토르가 마치 생명을 얻기 전 자신이 만들었던 육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명을 얻자마자 갑자기 끔찍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한 듯, 자신의 책임은 일절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체를 혐오하기만 하는 모습이며, 그런 생명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모습 등에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싶은 생각만 들었다.
툭 터놓고 말해서 그 생명체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생기게 된 게 아니다.
게다가 그 생명체가 저지른 잘못들도 사실 빅토르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빅토르가 그 과정에 끼친 영향만 봐도 ① 호기심에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 → ② 그전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정작 생명을 부여하고 나니까, '맙소사, 정말 끔찍하게 생겼군'이라는 생각을 하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 ③ '이런 안 되겠군, 하는 수없이 이 생명체는 연구실에 버려두고 나 혼자 도망쳐야겠다.'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다. → ④ 덕분에 그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뜬금없이 '나 홀로 집에 : 19세기 어느 연구실에서'를 찍게 되었다. → ⑤ '나 홀로 집에'도 주인공이 귀여워야 가능하지, 이건 뭐 주인공 디자이너인 빅토르의 발보다도 못한 손재주와 미적감각 덕분에 '워킹 데드'로 제목 바꾸고 장르도 호러물이 되어 버렸다. → ⑥ 그래도 뭣도 모르고 그 생명체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지만, 언어든 말이든 알아야 소통이라도 하지. 생긴 건 거의 헐크와 미라의 사촌 정도이고 입을 열면 좀비 소리만 내니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을 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덕분에 덩치는 컸지만 속은 어린아이와 다름없었을 생명체의 마음에 큰 스크래치를 부욱 남기게 된다.
그러다 진정한 괴물이 되어 버린 '괴물'이라고 불리던 생명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소재의 소설이 200여 년 전에 창작되었으며, 그것도 스물도 안된 어린 여성작가 메리 셸리에 의해 씌여진 소설이라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구해야 하고 그런 과학자의 지적 호기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대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도덕적 윤리와 책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와 속도감 있고 흥미진진한 전개는 『프랑켄슈타인』이 고전소설임을 잊게 하고 현대의 그 어느 공상과학소설보다 더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게 다가왔다.
괴기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상상력의 향연을 보여주며 독자들을 유혹하는 『프랑켄슈타인』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