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데 대충 일곱 시간 못 되게 걸린다. 화려한 크루즈 여행은 좀 더 걸리겠지만,
책은 대충 1, 2 부와 여담의 3부로 되어 있고, 비행기 좌석에 앉기 전 대기시간까지 줄창 읽어대면, 쉬엄쉬엄 "뚝딱"
다 읽어내릴 분량이다. 내용은 1차대전 후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횡단한 참전 파일럿, 미국내전 전, 노예해방론자 프레드릭 더글라스 아일랜드 여행 (감자 기근이 기승을 부리던 때), 두 대륙을 오가며 북아일랜드 테러 근절 평화 협상을 거든 미국 정치인의 단상이,
이들과 인연이 스치는 어느 아일랜드 이민-귀국인 모계 혈통의 영고성쇠로 풀어내고,
블랙베리처럼 망해버린 노인네의 현재로 얼추 마무리를 한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뉴욕을 잇는 지하 터널의 이야기로 어두컴컴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책이나, 날아다니나 의심스럽게 긴 체공시간을 자랑하는 전문댄서의 비상을 그린, "댄서"


그리고 "거대한 지구를 돌려라"는 건설현장의 쌍동이 빌딩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줄광대 이야기를 필두로
저 아래 발발, 왈왈거리고 사는 뉴욕 사람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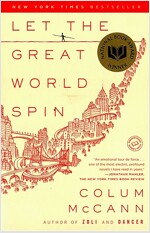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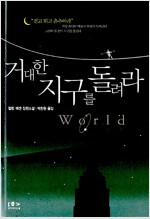
작가가 어지간히도 눈부신 '창공'을 동경하지 않나 의심이 된다.
장편이라 그렇겠지만 다들 한 가지 연결점을 통해 스치는 인연을 통해 구슬 서말을 꿰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목소리로 풀어낸다. 단 연결점은 그 배경이 될 뿐 여차저차 구구한 사연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다.
화자의 발현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도 다양하게 넘나들어, 마치 단편집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복잡한 서술 구조가 없이, 남다르지 않는 사연, 억지가 지나치다 싶은 역사적 접점들이, 너무 앞으로 나와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고 그 뒤의 인물들 부분 역시 무미건조하고 평이한 서체로 갈무리를 한다. 그냥 한자리 앉아 하릴없이 뒤적거리며 생각 없이 읽어내릴 수 있는 무난한 책이긴 하나, 왜 이렇게 멀찍이 서서,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는지. 좋은 작가의 평작은 졸작도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하긴, 비행기에서는 동요를 막으려고 차창을 내리고 술을 먹여서라도 재우려고 용을 쓰고
불을 켜면 옆자리 사람에게 민폐라 어지간한 용기가 없이는 읽고 앉았을 수도 없으니,
굳이 이런 책은 끝까지 성심을 다해 읽지 않고 "대충" 읽고 접어도, 읽다가가 내쳐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비추천서를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두 가지,
-나머지 책들은 나름 다들,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