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 - 자유에 관한 가장 명료한 통찰
안넬리엔 드 다인 지음, 한혜림 옮김 / 북스힐 / 2024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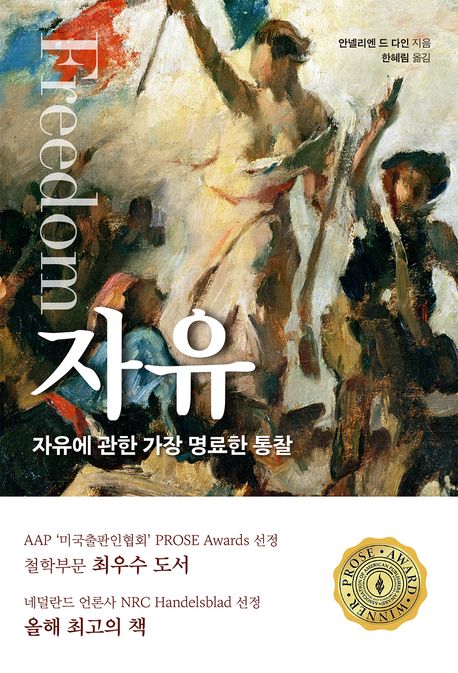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 내가 아는 자유와 다른 사람이 아는 자유가 같다고 생각했다. 도덕과 윤리를 배우던 우리에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자유는 이상하리만큼 자신들만의 자유였고, 자유로운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을 얘기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자유. 어떤 문장으로 표기되지 못할 만큼 다양한 논쟁이 있다. 그런 자유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이 책은 북스힐 출판사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자유'.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기 합리화에 대단함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내가 그들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가 이렇게 동상이몽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유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재의 그늘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생각났다.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로웠다.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인지 '리바이어던'의 압제에 굴복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는 사회적 정의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대 사회에는 (시민이라고 정의되던) 사람들 전체의 자유가 있었다. 그들은 시민적으로도 자유로웠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웠다. 하지만 꼭 다수의 정치가 옳을 순 없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겪은 플라톤은 현인에 의한 정치, '철인 정치'를 주장했다.
고대의 자유는 실패였을까? 결국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많은 왕들의 독재에 삼켜졌다. 하지만 많은 부르주아들은 '자유'를 외쳤다. 왕의 독재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자유가 대중에까지 확산하려고 하자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친다. 모순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다. 사람을 너무 자유롭게 두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성악설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고 민중은 개돼지라는 생각도 말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혁명은 확산되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랄까. 소외되었던 여성이나 노예들은 참정권을 획득했다.
기득권들은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모양이다. 자유는 법 아래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주의의 폐단도 무시할 수 없다. 애초부터 훌륭하다는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대중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법이 대중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도 문제다. 먹고 자고 즐기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만이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같은 맥락으로 보질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그들에게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위한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이런 이해는 히틀러나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적색경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개인적으로는 기득권 보호로 이해되지만). 더 과거로 가면 프랑스혁명을 겪었던 귀족들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참정권을 외치던 사람들도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몰려들자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외치게 된다. 자유는 보편적인 단어가 아닌 느낌마저 든다.
산업혁명 이후로 사유 재산의 폭발적인 증가는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는 것이 자유라고 여겨졌다. 기업가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재산에 의한 구속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노동자의 유토피아인 '사회주의'를 폭발시키기도 했다. 둘 다 지켜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를 외쳤고 반대쪽은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자유주의자들은 큰 정부가 결국 독재라고 정의했고 다른 편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의미는 그것에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가난한 다수의 폭력에 다칠 부유한 소수를 위한 것인 게 아닐까 싶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대중은 어리석어서 적절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민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 자체가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대적인 해석이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본다. 물론 중우정치로 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를 한다는 사람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다. 시민 그대로 어리석지도 않아야 하지만 어리석은 대리인을 뽑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는 결국 더 간절한 쪽의 것이었던 것 같다. 우리의 자유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있길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