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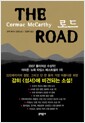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미국 현지에서 감히 성서에 비견되었다는 소설, 오프라 윈프리와 스티븐 킹이 올해의 소설로 선정을 하고 극찬을 했다는 나름의 어마어마한 문구는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코맥 매카시의 전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먼저 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책에 대한 호평과 혹평의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은 읽기도 전에 타오르기 시작한 관심의 불꽃이 되었다.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휴우 하고 한숨을 내 쉬게 된다. 우울하다. 세상에 끝에서 희망을 찾아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 책 전반에 깔려있는 암울함과 침묵 그리고 숨 죽인채 그들의 여행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두려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다.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한다. 먹는 것을 위해 잠자리를 위해 황폐해진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조그만 카트 하나에 그들의 생필품을 담고 한자루의 총과 서로를 의지하며 움직인다. 매일 굶는 것이 다반사인 그들에게 식량을 찾아야 하고 인육까지 먹어치우는 사람들을 피해야 하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로 인간이 이렇듯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될까 싶었던 그 장면들 속에 나는 몸이 오싹해 짐을 느낀다.
희망. 작가는 왜 희망을 밝게 그리지 않았을까. 목적지도, 찾고자 하는 대상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길에서의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서로의 입을 통한 대화가 아니라 머리속에서 생각을 읽는 듯하게 서술되어진 건조한 문체를 사용한 이유가 무얼지, 단지 인류에게 어떤 강력한 메세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던 건지 알고 싶어진다.
성서속에도 대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영화화가 많이 된 요한 묵시록의 계시들이 그랬다. 하지만 계율을 지켜야 하고 때론 어겨 벌을 받기도 하며 고통과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성서 전반에 깔려 있는 분위기는 사랑과 희망과 행복이다.
성서와 로드의 공통점으로 발견한 것은 재로 덮힌 암울한 공간과 시간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부성애를 보이고 아들은 어둠으로 덮힌 세상에 불을 운반하며 따뜻함으로 관심과 사랑을 내 보인다는 것이었다. 마치 하느님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때 산의 냇물에 송어가 있었다. 송어가 호박빛 물 속에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지느러미의 하얀 가장자리가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잔물결을 일으켰다. 손에 잡으면 이끼 냄새가 났다. 근육질에 윤기가 흘렀고 비트는 힘이 엄청났다. 등에는 벌레 먹은 자국 같은 문양이 있었다. 생성되어가는 세계의 지도였다. 지도와 미로. 되돌릴 수 없는 것,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을 그린 지도. 송어가 사는 깊은 골짜기에는 모든 것이 인간보다 오래 되었으며, 그들은 콧노래로 신비를 흥얼거렸다. p323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희망찬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작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해하려 노력해 본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책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몸 안에 남아있는 절박한 희망이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