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미안 ㅣ 열린책들 세계문학 227
헤르만 헤세 지음, 김인순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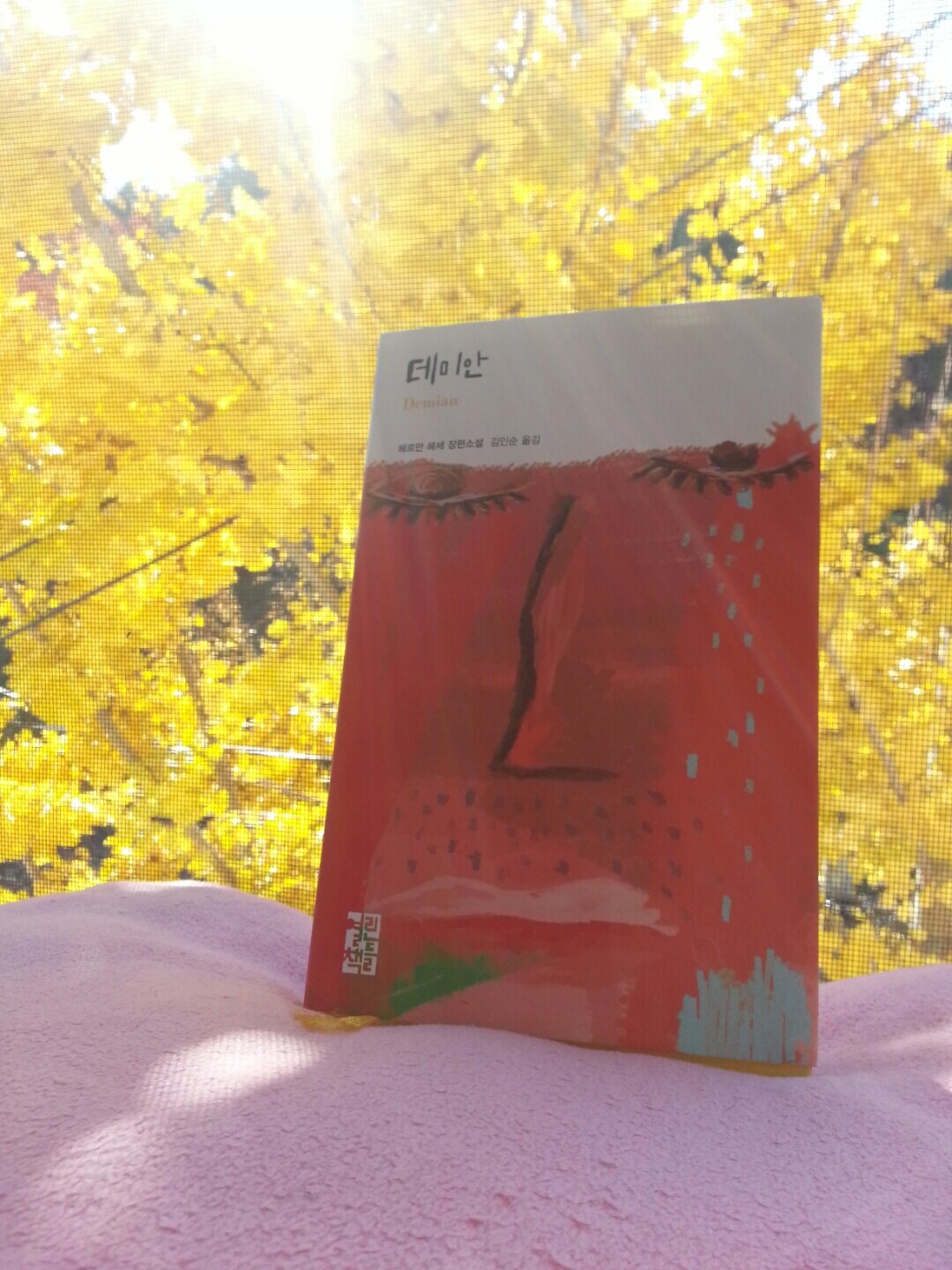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겠지만,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스스로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가에 대한 확신을 -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 갖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삶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나름의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였으며, 옳지 않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끌림과 그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죄책감이 우리 앞을 항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이 같은 고민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어쩌면 삶의 모든 과정은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외롭고 고단한 기나긴 여정에 위로와 도움을 주는 친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이 책의 주인공 - 싱클레어는 크로머와의 일화를 기점으로 자신이 속한 밝은 세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 사랑이 충만한 정의의 세계인 밝은 세계에 안정을 느끼면서도 악이라 불리우는 것들의 집합인 어두운 세계에 이끌리는 그였지만, 밝은 세계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현실은 그에겐 큰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런 그 앞에 데미안이 나타나고, 그는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흔히 ‘데미안’하면 그 유명한 문구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가 떠오르겠지만, 카인의 표식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 못지 않은 상징성을 가진다. 우리가 ‘진실’이라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브락사스와 카인의 표식 이야기는, 세계는 선(밝은 세계)과 악(어두운 세계)의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닌 둘의 조화로 구성돼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가 찾아내야만 한다는 걸 알려준다. 이는 결국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후에 싱클레어가 상급학교 진학 후 고민하는 내용들 역시 그런 과정의 하나이다. 데미안은 자아가 완전히 확립된, 카인의 표식이 있는 자이며 그는 싱클레어에게도 카인의 표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쟁을 겪은 후, 마침내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하나가 되었다. 데미안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붕대를 감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그 후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따금 열쇠를 찾아서 나 자신 안으로 침잠하면, 검은 거울 위로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나의 친구이면서 인도자인 그와 똑같은 모습이. (226p)'
이따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나를 둘러싼 안정된 세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하는 물음이 내면에서 들려올 때면 더욱 그렇다.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 다른 이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세상을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그 답은 오로지 나만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아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면 좋을 책, 데미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