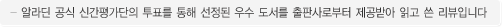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여울물 소리
황석영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19세기 말의 백과사전식 소설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소설이었다. 이 소설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임오군란 등의 시대적 배경 속을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세태와 풍속을 그리고 있다. 시대 연구를 위한 작가의 자료 수집이 끈질기게 드러나는 소설이다. 옛것을 이만큼 잘 살려낼 수 있는 작가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대에 천착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건, 인물보다 시대가 더 부각됐다는 점이다. 인물이 이끌어가는 다음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에 닿아 있어 예측 가능했으며, 이신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는 형식의 구성은 판이했다. 이신의 여정을 쫓는 연옥의 시점은 너무 과도하게 1인칭과 3인칭을 넘나들었다. 듣는 형식이 아니라 ‘고하는’ 형식이 되어버린 형국이었다. 차라리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1인칭으로 서술하는 자신과 이신의 삶 이야기가 더 다채롭지 않았을까. 화자를 고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려니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이신의 삶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귀기가 서려 있다. 어디 그 하나뿐이겠는가.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쫓은 연옥과 또다른 여인 백화, 그의 정신적 스승 격인 서일도, 박도희 형제, 김만복의 삶도 그랬다. 오히려 철저하게 구획된 중세의 질서 속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덜 고통받았으리라. 서양에서 이미 혼란스러운 근대를 겪던 시대, 우리는 아직도 구체제 속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다. 유교적 질서란 체제를 뒤엎기엔 너무 견고했고, 탐관오리 몇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알았다. 왕으로 대변되는 질서 앞에서 평민들은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다. 일본이 개입하기 전에 봉기한 농민들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한양으로 향했다면, 시대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미 외세의 압박과 탐관오리의 폭정으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왕을 여전히 믿은 죄. 그것이 그들이 시대에게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이신은 작가인 황석영을 떠올리게 한다. 황석영 자신도 이야기꾼이면서 시대의 증인으로 전 세계를 떠돌고, 수감되기도 하지 않았던가. 이야기꾼이면서 동시에 혁명가, 활동가이자 지식인이었던 이신은 황석영의 분신처럼도 보인다. 그들의 삶은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다. 숱한 독립운동가 뒤에는 그들의 가족이 고통스럽게 도사리고 있다. 혁명과 이상의 조화는 불가능하니까. 연옥이 한 아이를 잃고, 또 한 아이를 아비에게 보이지조차 못했다는 그 사실은 혁명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증언한다. 지아비의 뜻을 따르면서 자기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생활이란 짐을 고스란히 떠맡는 그 여인들은 혁명의 어두운 단면이다.
격랑의 역사를 사는 개인의 존재 가치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포화 속에 목숨이 마구 뜯어내는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구질서에 완전히 몸담지도 못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은 목숨을 건 과업이다. 이신은 애초에 서자 아버지의 서자 아들로 태어나 출셋길에 대한 꿈을 접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형 이준과 대비되는 이신의 성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에게는 미움을 샀다. 이 비극적 갈등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이준은 구체제를 엄혹하게 지키는 관료로, 이신은 그걸 깨트리려는 혁명세력으로 갈리는 것이다. 이신이 동학(소설 내에서는 천지도)에 빠지는 건 엉망진창인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그 ‘욕망’은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던가. 이전 시대에는 차마 존재조차 발설하지 못했던 생각이었다. 주어진 세계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타락했는지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그 ‘앎’이란 모든 근대인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많은 체제가 그렇듯 조선도 타락보다 무능이 더 문제였다. 청와 왜에 낀 조선왕실은 외교를 할 능력도, 국권을 지킬 의지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온 농민들을 일본군을 끌여들어 잔인하게 몰살한다. 전략도,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혁명군은 우금치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 걸음이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을, 4.19와 5.18을 이끌지 않았던가. 그 와중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 보다 평등한 역사는 피의 제물 없이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꾼으로 시작해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가 되었다가 결국 죽게 된 이신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물상이다. 작가 황석영의 초상이 그렇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그렇듯 큰 이야기가 꼭 작은 이야기보다 의미있는 건 아니다. 역사 그 자체도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의 결이 더 세심해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