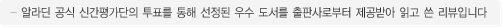[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여울물 소리
황석영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여울물 소리 / 황석영 / 자음과 모음 (2012)
전주, 한옥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 리뷰를 쓰기 위해 온 것은 물론 아니구요. 일보러 왔다가 잠시 짬이 나 오랜만에 경기전, 풍납문, 향교 등 전주 시내 곳곳을 돌아보다 이름모를 찻집에 앉아 잠시 다리를 쉬는 중이지요. 전주가 <여울물 소리>의 주무대는 아니지만 여주인공이자 화자인 연옥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곳이지요. 그리고 진짜 주무대인 강경은 물론 여러 차례 언급되는 삼례나 고부와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곳이기도 하구요. 그렇다보니 소설 속의 실제 공간이 남아있을 리 만무이건만, 이곳에 와 있으려니 벌써 읽은 지 제법 되었지만 차일피일 리뷰를 미루던 <여울물 소리>가 자연스레 떠오르네요.
연옥은 재취 자리로 시집을 갔다가 이곳 전주성 내 어딘가로 다시 나와 색주가를 차린 어미 구례댁을 돕다가 평생의 운명인 이신통을 바로 이곳 전주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물론 자신도 어미와 같은 팔자로 재취 자리로 팔려가듯 시집을 가 잠시 그 인연의 끈은 끊기게 되긴 합니다만, 전주에서의 인연으로 이 두 사람은 장차 부부의 연을 맺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 터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강경나루, 지금은 충남 논산에 속한 그곳에 가서 그곳 또 어딘가에 있었을...구례댁과 연옥이 전주의 색주가를 정리하고 차린 객주집을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이곳 전주에서 넉넉히 한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이곳으로 내려오다가 강경을 스치듯 지나온 터라 그러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연옥이 신통을 찾으러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저 역시 그 두사람의 자취를 따라 마음껏 돌아다녀 보고 싶지만...아쉽게도 이쯤에서 그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구수한 전북 사투리를 듣고 있으려니 굳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아도 이야기 속 그들을 만난 듯 하니까요. 이곳 특유의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각시'라는 명칭이 어찌나 살가운지...연옥은 그렇게나 그리고 그리는 신통에게 단 한번도 그렇게 살갑게 불리어지지 못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애잔한 마음이 밀려듭니다.
<여울물 소리>는 이처럼 연옥이 운명처럼 맺어진 자신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집을 나선 신통의 자취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로 치면 변사였고, 요즘으로 치면 배우이자 MC였던 이야기꾼인 신통이 단순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백성들과 울고 웃는데서 그치지 않고,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위무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초들이 주인공이 되는 '천지개벽된 세상'이라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또다른 이야기꾼인, 연옥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한편으로는 한 여인의 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록되지 못한 역사의 현현입니다.
벽같은 세상에서 도망쳐 이야기 뒤로 숨은 전기수, 신통이 하찮은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일생일대의 질문에 맞닥뜨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결국 우리네 힘없는 모든 민초들,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소중한 이야기이며, 그들 모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서는 이야기. 그런 신통의 자취를 쫓으며 비로소 그런 신통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따르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지키며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네의 사랑을 보여주는 연옥이 신통이 못다 이룬 꿈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여울물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울물 소리>는 그 구성이며 문체며 리듬이 참으로 구성지고, 참으로 절창입니다. 그러니 작가는 바로 <여울물 소리> 자체만으로 우리네 이야기의 역사를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집니다. 즉, 이렇게 우리네 바로 곁에 쭈그려 앉아, 우리의 눈을 지긋이 응시하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때론 어깨춤이 절로 날 정도로 신명나게 그리고 때론 가슴이 미어지도록 절절하게...그리고 시종일관 참으로 맛깔나게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이었고 그 전통이 수많은 억압과 왜곡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아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현재에 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은 몫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이 살아숨쉬는 이야기가 죽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기억해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구성짐과 현재의 맛깔남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렇게 이야기꾼의 숙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의 역사는 유구한 것이라고, 작가는, 연옥은, 신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살아서. 이야기로 살아서.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