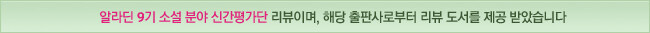[스틸라이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스틸라이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스틸 라이프 ㅣ 아르망 가마슈 경감 시리즈
루이즈 페니 지음, 박웅희 옮김 / 피니스아프리카에 / 201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스틸 라이프 / 소설 / 루이즈 페니 / 피니스 아프리카에 (2011)
저는 추리소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게 정확하겠네요. 접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을 때우는 장르소설이라는 편견이 조금은 작용했고, 대부분의 추리소설들이 시리즈로 이어져서 그 많은 연작을 읽을 엄두를 쉽사리 내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렇기에 이 '스틸 라이프'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제법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가장 큰 이유이자 재미는 추리소설이라는 이름처럼 범인이 과연 누구일까를 짐작해보는 것일 터입니다. 읽는 나와 작가의 게임이자 작품 속 탐정 혹은 형사와의 게임인 것이지요. 어디 한 번 맞춰보라며 작가는 자꾸만 이야기를 꼬으며 스리슬쩍 단서들을 흘립니다. 주인공인 형사 또한 조금씩 조금씩 범인에게 접근해가며 애간장을 녹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끄는대로 적당히 따르면서, 감히 날 시험해? 내가 모를 줄 알구? 하는 심정으로 제 나름대로의 단서들을 부지런히 주으며 범인을 추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스틸 라이프'는 아주 충실하게 추리소설의 법칙을 따르는 소설입니다. 추리소설의 고전들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아주 클래식한...일종의 우아함과 품위 같은 게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시대를 조금 앞으로 당기기만 한다면 100년 전쯤 쓰여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문체가 꼭 그러했습니다.
살인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캐나다의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 그리고 역시 살인 같은 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교양있고 우아한 마을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우아한 마을사람들 중 범인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가마슈 경감과 수사팀이 마을에 상주한다.
추리소설에 문외한인 저조차도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이러한 설정들은 분명 추리소설의 고전들에서 많이 보아왔던 그것일 터입니다. 주인공인 가마슈 경감의 캐릭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지긋한 신사이며 아주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평상시에는 옆집 할아버지 처럼 푸근하고 자상하지만,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날카롭고 냉철한 직관력과 판단력을 가진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 그리고 그를 방해하는 니콜이라는 사고뭉치 신참 형사 캐릭터와 그의 충실하고 든든한 조력자인 보부아르 형사까지.
이들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과 우아하고 교양있어 보이는 마을사람들의 실체와 속내가 하나씩 밝혀지는 수순은 너무나 담담하고 차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아주 천천히 사건의 본질로 파고 들어가는 그 신중함에 절로 감탄사가 나올 지경입니다. 가마슈 경감도 이 소설을 쓴 작가도 그 인내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들의 느릿한 게임에 어느 순간부터 몰입해서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1/4 지점 정도부터 범인을 제 마음대로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클라라를 의심했다가, 다음에는 벤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피터로 확신합니다. 매튜와 욜랑드가 진범일리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눈치챘습니다.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결국 피터로 범인을 확신함으로써 작가와 가마슈가 놓은 덫에 보기좋게 걸리고 말지요. 초보 추리소설 독자 티를 팍팍내고 말지요. 저는 작가와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이 바로 작가가 원하던 것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래서 제가 추리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니까. 그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는 사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졌을 때, 저의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을 때...아 정말 탁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싶어지는 추리소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이 '스틸 라이프'라는 소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범이 밝혀지고, 그가 왜 진범일 수 밖에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이는데...솔직히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반전을 위한 반전 이상의 감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인생의 가치에 대해 논하지 못한 채 그저 정말 게임에 불과했다는 허무함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역시나 추리소설은 읽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꼬는 것은 쉽지만 푸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아니, 풀었을 때 꼬였을 때의 주름을 말끔하게 펴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인가 봅니다. 인생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