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스러운 건축>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자연스러운 건축>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

-
자연스러운 건축
쿠마 켄고 지음, 임태희 옮김 / 안그라픽스 / 2010년 7월
평점 :



"20세기는 콘크리트의 시대였습니다"
서문 중 작가
그리고 20세기는 쓸쓸한 시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 건축=콘크리트+화장 이라고 덧붙인다. 아마도 20세기는 건축 이외의 부분에도 비슷한 이해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범 시대적인 조류의 일관된 모습이 바로 쓸쓸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서는 쓸쓸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 내고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건축가들에게는 건축학적인 관점에서의 나름의 해결책을 그리고 그 외의 방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의 한 가지 단서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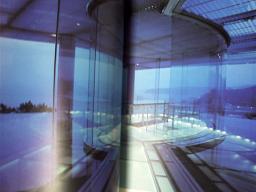
"자연관은 가장 작은 장소에, 개인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 귀속한다." 자연은 일반론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체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한다. 특정한 장소와 장소 사이의 교류를 통해 건축은 앞으로 전진해 간다.
뒤에 나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자연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일반론적인 접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은 필요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최전선의 논의들은 모두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실 자연에 대해서 어떤 논의는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실험의 정도이다. 자연을 마주 하고 있을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장에서 조차 이런 이야기를 망각할 때도 있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이런 면에서 좀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지나치게 자연과 마주 대하고 궁구할 때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상 그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이처럼 자연에 대해 다시 상기한다면 어떤 실증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태양과 입자와 수용자, 이 세 가지가 ’관계성’에 의해 무지개로 출현한다.
자연이란 것은 정적이지만 그 안에 동적이며 항구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靜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한 두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파동은 변화무쌍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축이 안겨다 주는 하나의 이야기 거리이다. 공간 안에서 새로운 파동 하나하나가 수용자만의 이야기화 한다.
사회의 Operating system 으로서의 건축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건축 방식이 곧 그들의 본질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OS로서의 건축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 진부하다고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설명이 흥미롭다.
투시도법 자체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그 지역의 특수성과 시간을 압축해 놓은 상징적 기념물인 건축물을 요구하게 된다.
투시도법 자체는 2차원인 그림에 3차원적인 공간을 그려내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과 그림에 대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2차원적인 공간에 3차원적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넣기 위해 오히려 자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건축이 만들어 진다.

히로시게의 미술에서는 비는 자주 직선으로 표현된다. 거기에는 자연과 인공과의 경계에 대한 양자를 연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자연에서의 비는 직선으로 내리는 법이 없다. 장대비가 쭉쭉 내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람에 따라 그 방향은 자기마음이다. 그렇다면, 회화속의 비는 어떨까?, 건축은 어떠해야 할까? 건축이든 미술이든 그것 자체가 자연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의문이 동시에 떠오르게 만든다.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연적인 것은 자연을 모사하는 것에 넘어서 어떤 한 지점에서 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도... ... 이처럼 한꺼풀씩 고정관념을 벗고 사물을 볼 수 있을까?

진화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는 것이 나의 제안이었다.
땅 속으로 집어 넣은 전망대, 기로잔 에서
과거의 건축은 지형에 알맞게 건축된 것이었다. 여기서 ’알맞게’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다. 예를 들어 동굴집 같은 경우에, 자연 동굴을 이용한 경우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앞에서 나오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 문제와도 한 축을 잇는다. 제방시설을 하면서 자연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수십년내 혹은 수백년 내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예측은 기록도 없지만 예측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기술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해낸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인공이 자연을 침범한 경우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기술의 진화를 역으로 돌리고 싶다는 것은 다시 되짚어 보면 건축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는 이미 그리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새롭게 풀어 내고, 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다.
자연스러운 건축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보통 건축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밌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건축이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뉴욕에 워터블록을 이용한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석유제품을 이용한 소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움찔하곤 한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건축도 이와 같은 것 같다, 100% 확신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 때문에 이와 같은 건축을 허락한 의뢰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같다.
자연이란 인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도 그 일부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도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때론 슬프기도 하고, 때론 웃음을 주기도 한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