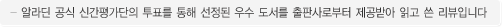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정호승.안도현.장석남.하응백 지음 / 공감의기쁨 / 2012년 8월
평점 :

품절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여행한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세계. 그 속에서는 '나'가 아닌 '우리'의 말들이 살아나고, 그 말들은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을 실어 나른다. 다시 돌아오는 무엇을 기다리거나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그 모두 사랑에 빠졌을 때 겪어내야 할 몫이다. 덧없는 사랑의 찌꺼기 같은, 온갖 그리움과 절망과 슬픔은.. 감추어 둘 만한 삶의 보석이 된다.
시인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눈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것- 시인들의 언어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일-은, 피상적인 것만을 좇는 철 모르는 나에게는 어렵기만 하다. 그들은 희망을 위해 절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위해 과거를 짚어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책에는 정호승, 안도현, 장석남 시인, 그리고 하응백 문학평론가가 삶의 어떤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각자 열 편 남짓한 짧은 글을 실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시인들이기에 시인이 사랑하는 시는 어떨까, 호기심의 눈이 뜨였다. 잔잔하면서도 쉼 없이 파장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호수처럼, 그들이 써 내려간 이야기 위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퍼져나와 가을날 빛처럼 주위를 환하게 만들었다.
책은 가볍고 작은 판형이지만, 읽는 속도가 더디다. 그들이 너무 많은 감상을 실은 탓에, 문장에 비친 온도로 나의 모습을 나의 요즘을 투영해 보느라 책장 넘어가는 진전이 쉽지만은 않다. 네 사람 각자가 써 내려간 에세이에, 품고 있는 시를 세어 보면 스무 편 남짓이다. 이 중에서 김수영의 '거미'나 기형도의 '포도밭 묘지 I', 정호승의 '밤 지하철을 타고' 같은 시들은 새롭게 다가왔다. 아, 이런 시가 있었나.... 싶게 곱씹게 된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 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렸다
-김수영, '거미'
주인은 떠나 없고 여름이 가기도 전에 황폐해버린 그해 가을, 포도밭 등성이로 저녁마다 한 사내의 그림자가 거대한 조명속에서 잠깐씩 떠오르다 사라지는 풍경속에서 내 弱視의 산책은 비롯되었네. 친구여, 그해 가을 내내 나는 적막과 함께 살았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헛된 믿음들과 그 뒤에서 부르던 작은 충격들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네. 나는 그때 왜 그것을 몰랐을까. 희망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였어야 할 그 어둡고 가벼웠던 종교들을 나는 왜 그토록 무서워했을까. 목마른 내 발자국마다 검은 포도알들은 목적도 없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고개를 들면 어느 틈엔가 낯선 풀잎의 자손들이 날아와 벌판 가득 흰 연기를 피워올리는 것을 나는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네. 어둠은 언제든지 살아 있는 것들의 그림자만 골라 디디며 포도밭 목책으로 걸어왔고 나는 내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마치 용서와도 같아 언제나 육체를 지치게 하는 법. 하는 수 없이 내 지친 밭을 타일러 몇 개의 움직임을 만들다보면 버릇처럼 이상한 무질서도 만나곤 했지만 친구여, 그때 이미 나에게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 정든 포도밭에서 어느 하루 한 알 새파란 소스라침으로 떨어져 촛농처럼 누운 밤이면 어둠도, 숨죽인 희망도 내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웠네. 기억한다. 그해 가을 주인은 떠나 없고 그리움이 몇 개 그릇처럼 아무렇게나 사용될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촛불들을 태우곤 했다. 그렇게 가을도 가고 몇 잎 남은 추억들마저 천천히 힘을 잃어갈 때 친구여, 나는 그때 수천의 마른 포도 이파리가 떠내려가는 놀라운 空中을 만났다. 때가 되면 태양도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나 또한 내 지친 정신을 가을 속에서 동그랗게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끝끝내 포도밭을 떠나지 못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척없이 새끼줄을 들치고 들어선 한 사내의 두려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주인이라 부를 때마다 아, 나는 황망히 고개 돌려 캄캄한 눈을 감았네. 여름이 가기도 전에 모든 이파리 땅으로 돌아간 포도밭, 참담했던 그해 가을, 그 빈 기쁨들을 지금 쓴다 친구여.
-기형도 '포도밭 묘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시인들이지만, 시를 통해 살아 있는 그들의 심장, 그 결을 따라 읽게 된다. 사라지지 말아야 할 이름들, 흔히 지나치기 쉬운 삶의 부스러기들이야 말로, 진정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불쌍한가, 시를 잃은 사람이 불쌍한가.
책을 다 덮고 보니, 표지 아래 켠에 써 있는 문장이 낯설게 다가온다.
'시인은 청춘에 만들어진다'
시로 맺어진 사람들의 열정이 가을밤을 태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