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면을 끓이며
김훈 지음 / 문학동네 / 2015년 9월
평점 : 


몇 년전, 나는 이 작가의 꽁무니를 며칠씩 따라다닌 적이 있었다.
그의 소설 '칼의 노래'가 비수처럼 내 몸에 와서 박히고 그 적막함 때문에 한참이나 몸살을 앓았던 난 글로써만이 아닌 인간 '김 훈'을
느끼고 싶어서 였는지 모르겠다.
모 출판사에서 그의 책이 출간되고 한창 마케팅이 진행되던 때 '독자기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뒤쫓았던 것이다.
도무지 멋을 낼줄도 모르고 사실 출판사나 독자의 요청으로 어딘가를 불려다닌다는 것을 몹시도 싫어한다는 그가 문경새재를 오를 때는 참으로
신이 난 모습이었다.
어느 강연에서는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한참이었던 때라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독자의 질문에 그는 아무 댓가없는 밥은 아이를
나약하게 할 뿐이다..라고 답했던것 같다.
이 책에서도 나왔듯 그의 아버지는 시대를 앓느라 가족은 늘 뒷전이었고 그럭저럭 대학을 나온 작가는 가난한 조국의 국민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고 싶어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었다.
밥을 벌기 위해 밥을 먹고 다시 일터로 향하여만 하는 가장의 무거움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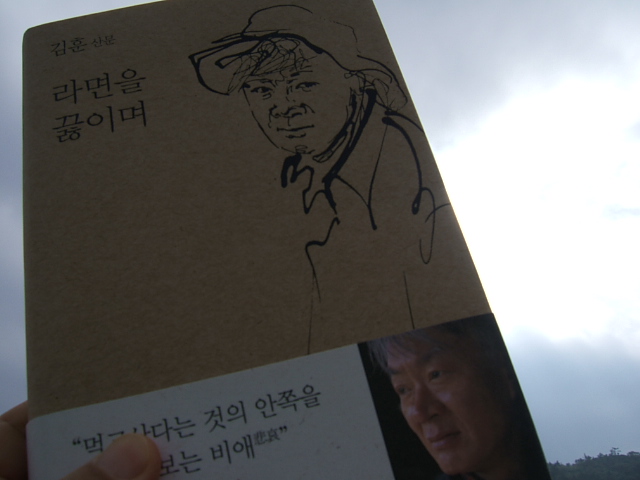
하필 그가 태어난 시대는 한국전쟁과 가난과 이념의 충돌들이 난무하는 시간들이었다.
서울 토박이 모친의 말투는 늘 점잖았고 작았다고 하더니 그 역시 목소리는 낮고 군말이 없는 편이다.
그런 그의 진면목은 결국 글에서 발휘되곤 한다. 오래전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언젠가 이순신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그렇게
나온 '칼의 노래'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망루에 오르던 장군의 고독이 뚝뚝 묻어 나왔었다.
기자출신 작가답게 시대의 아픔을 녹아낸 작품들이 속속 나왔고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왠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차가움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인지 바람둥이 친구가 '여자란 골방에 들어가 살을 부비는 존재'라는 말에 '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웃음이 절로 난다. 아직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제법 유머러스한 구석이 많은 작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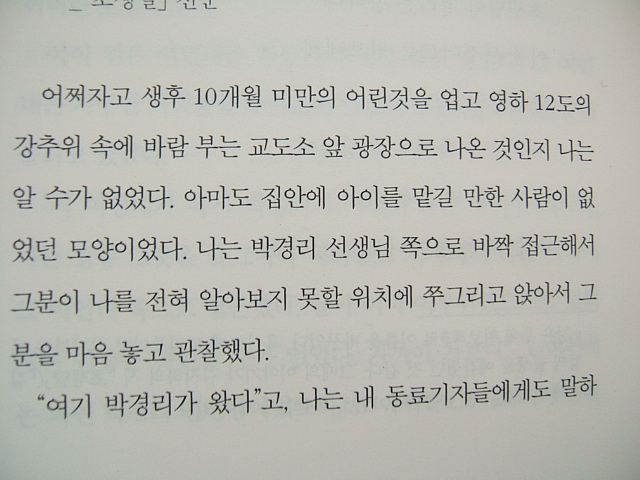
기자 시절 서대문형무소에서 마주친 박경리작가와의 일화는 가슴이 저릿해진다.
이제 겨우 돌도 안된 손주를 포대기에 업고 형무소 맞은편에 시린 바람을 맞고 서서 사위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모습.
그런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전해져오는 것같아 자꾸 가슴이 시려온다.
박경리는 알았을까. 먼발치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낯선 사내가 후일 글을 써서 밥을 먹는 후배작가가 되리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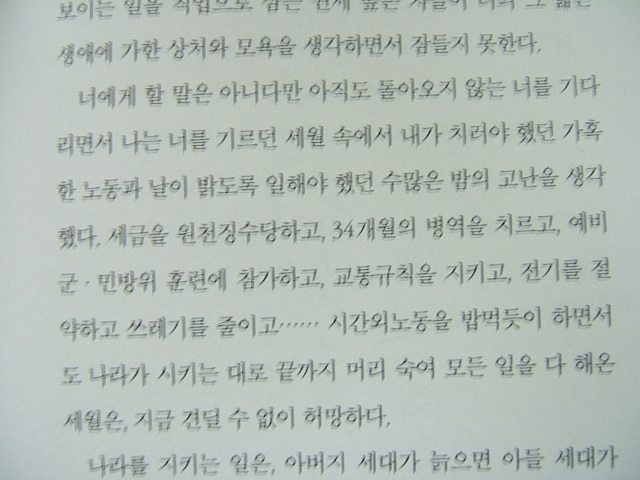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무수한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혹한 노동과 날이 밝도록 일해야 했던 수많은 밤의 고난을
지나왔을 것이다. 나라가 시키는 대로 끝까지 머리 숙여 모든 일을 다 해온 세월들...
라면도 밥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의 라면 끓이기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지단한 노동으로 밥을 벌어야 했던 고단함을 잠시 접어두고 마치 별식처럼 끓여먹던 라면의 존재는 밥벌이의 지겨움을 잠시라도 잊게 해준 고마운
별식이었을 것이다.
물은 약간 넉넉하게 스프는 3분의 2만 넣고 센불에서 끓여낸 그의 라면맛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서울 토박이 입맛을 가진 그의 싱거운 습성은 라면 끓이기에서도 나타나는지.
자신만의 라면 끓이기에서 그의 고집과 다부짐과 소신같은 것들이 드러난다. 천 원도 안되는 라면 한봉지를 꺼내 끓이는 단순한 작업에서도 그의
결기가 뚝뚝 묻어난다.
그래서 나는 그가 좋고 한편으로 무섭다.
불광동, 연신내를 지나 일산에 터를 잡은 그의 삶이 더 이상 밥벌이의 지겨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스럽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