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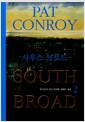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2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사우스 브로드』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찰스턴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인종차별 폐지에 반대하는 남부연합의 격전지이기도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보다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멋진 남자 레트 버틀러의 고향으로 더 강하게 기억되어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남북전쟁 시대가 시간적인 배경이니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레트 버틀러가 스칼렛 오하라에게 찰스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세부적인 묘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문장을 기억하는 재능을 타고난 듯한 정혜윤이라면 근사하게 인용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정말 안타깝게도 책도 없어서 다시 뒤적여볼 수도 없다), 레트는 그곳의 모든 것을 사랑했으며 찰스턴 출신이라는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드러냈다.
팻 콘로이는 그 찰스턴을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애슐리 강과 쿠퍼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어귀에 자리 잡은 찰스턴을 『사우스 브로드』는 (이 소설의 주인공 레오 아버지 재스퍼의 말을 빌어) “강가의 대저택”이라고 묘사한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옹기종기 매혹적인 대저택을 이루는 찰스턴의 풍경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다. 찰스턴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팻 콘로이가 그토록 찬사를 늘어놓는 아름다운 찰스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레오폴드 블룸 킹과 그의 친구들이다.
레오의 이름은 그의 풀네임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을 기념한 이름으로 제임스 조이스와 『율리시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흔적이다. 이것은 『사우스 브로드』를 더 폭넓게 지배한다. 훗날 어른으로 성장한 레오가 회상하는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1969년 블룸스데이부터 1990년 블룸스데이까지 이어진다. 서로 별세계에 사는 것같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좀처럼 만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찰스턴에서 한 운명으로 묶이게 된 날은, 제임스 조이스와 『율리시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는 특별한 날인 블룸스데이(Bloom’s Day)다.
바로 그날, 문제아들과 떨거지들이 죄다 모여드는 유배지 같은 공립 고등학교인 페닌슐라의 냉엄한 교장선생님인 레오의 어머니 린지가 레오에게 그들을 찾아가 마음은 주지 말고 페닌슐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특명을 내린다. 성폭행을 일삼는 정신이상자 아버지를 피해 레오네 맞은편으로 이사 온 쌍둥이 남매 시바와 트레버, 엄마와 할머니를 찾으려고 고아원에서 늘 탈출을 감행하다가 찰스턴에까지 흘러든 남매 나일즈와 스탈라, 찰스턴 최상류층 집안에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마약소지죄로 퇴학당한 채드와 몰리,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어이없이 죽은 삼촌의 일로 백인을 두려워하는 흑인 풋볼 코치의 아들 아이크, 여기에 채드의 여동생 프레이저와 뒤늦게 찰스턴 고아원에 합류한 베티까지 너무나 이질적인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레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평생의 우정을 쌓는 친구가 된다.
『사우스 브로드』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은 모두 불행한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도 지속되는 비극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소위 부유한 명문가에서 성장한 채드와 몰리, 프레이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른들에게 교육받은 대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누구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한다. 불쌍하게도). 그것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빛나던 형의 자살을 목격하고 황폐해진 레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레오와 친구들의 미래는 자신들의 비극을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어 절망적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고단한 현재를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물론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는 못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때론 미소가 절로 지어질 만큼 기쁘고, 때론 눈물방울이 뚝뚝 흐를 만큼 슬프고, 때론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올 만큼 안타깝다.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짓궂은 말들이 좋았다. 치명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은 대개 혀끝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대의 가슴팍에 꽂히게 마련인데, 그들이 서로에게 툭툭 던지는 말들은 부드럽고 뭉툭하고 정다워 상처로 벌어진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치유의 마법이다.
『사우스 브로드』는 (찰스턴과 레오의 비극을 설명하는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문장에서 시작하여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로 끝난다. 열여덟 살의 가시 돋인 청춘들이 각자의 아픈 삶에서 뚜벅뚜벅 걸어와 인생을 공유하고 서른여덟 살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물론 그중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았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는 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테지. 레오폴드 블룸이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 하루는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길고(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완독하는 일은 꿈이기까지 하다!) 모든 일이 일어난다. 단 하루일 뿐인데도. 어쩌면 인생은 그 하루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사이를 배회하는 것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