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한 파묵의 책에 나오는 짧은 글을 하나 읽다가 미소짓는다. <책 표지에 관한 노트>라는 글이다. 인터넷으로 책 주문하기를 꺼리고, 직접 서점에 가서 제목이나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을 집어 들어 살피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시 이리저리 서성이는 나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말들이다. 몇 개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위대한 독서 경험과 희열은 이후 추억 속에서 그 책의 표지와 뒤섞인다.
● 표지를 보면서 책을 사는 독자들 그리고 그런 독자들을 위해 쓰인 책들을 경멸하지 않는 비평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 집필하는 책의 표지를 상상하지 않는 소설가는 감정 교육을 마친, 성숙하지만 자신을 작가로 만든 순수함을 잃어버린 작가라는 뜻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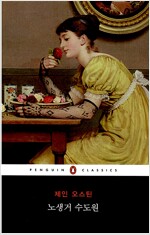
제인 오스틴의 <노생거 수도원>을 읽고 반해버린 날, 서점에 가서 제인 오스틴의 책을 몇 권 더 사기로 했었다. 민음사, 문학동네 등 제인 오스틴을 번역한 출판사 책들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웅진씽크빅에서 출간한 펭귄클래식이었다.
펭귄클래식의 고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주석이 충실하다. 둘째, 해설이 마음에 든다. 셋째, 표지가 매력적이다.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건, 적어도 내 경우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국내 번역출판사인 웅진씽크빅에 불만이 없진 않다.

이번에 구매한 제인 오스틴의 작품 세 권 중 <이성과 감성>에는 해설도 없고 주석도 없다.알라딘에 올라온 펭귄클래식 원서의 목차와 비교했더니, 원서에는 각주와 해설이 버젓이 있는데, 번역판에는 아예 단 한 줄도 없는 것이다.
펭퀸클래식의 번역판을 구매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몇년 전에도 어떤 작품에서 (지금은 정확히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원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명쾌한 주석과 명품 해설이 번역판에는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때는 참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 또다시 속았다는 느낌에 솔직히 배신감과 짜증이 난다. 물론 구매하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사야 했는데, 급한 걸음이기도 하고 해서 표지만 보고 사놓곤, 인제 와서 물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성과 감성>의 표지 하나만큼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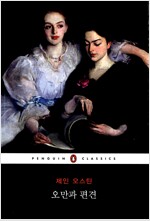
한편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인 <오만과 편견>은, 번역자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어체로 번역이 되었다. 단편 소설도 아닌 장편 소설을 경어체로 읽어야 한다는 건 상당히 피곤할 것 같다. 책을 구매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출판사의 번역판을 골랐을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표지는 여전히 펭귄클래식이 무척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 표지들은 원서의 표지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만약 우리나라 출판사가 원서의 표지마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다면, 단호하게 맹세하건대, 다시는 국내 펭귄클래식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게 분명하다.
그래도 표지가 마음에 든다는 점이 그럭저럭 위로 아닌 위로가 된다.

<에마>의 경우, 해설도 주석도 모두 온전하다. 위의 두 권은 그날 방문한 서점에서 책을 찾을 수 없어서 알라딘 중고서적으로 가서 구입하였고, <에마>만 유일하게 대형서점에서 구매했다.
어쨌든, 오르한 파묵의 짧은 글 <책 표지에 관한 노트>는 모두 옳은 말이다.
다만, 책의 다른 면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을 때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