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랑켄슈타인 ㅣ 윌북 클래식 호러 컬렉션
메리 셸리 지음, 이경아 옮김 / 윌북 / 2022년 12월
평점 :




나는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조물주가 된 프랑켄슈타인.
그러나 조물주가 가져야 할 자애를 갖지 못한 프랑켄슈타인.
자신의 창조물이 끔찍한 모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팽개치고 달아난 못난이.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버려졌던 괴물의 고독과 슬픔과 절망은 누구의 몫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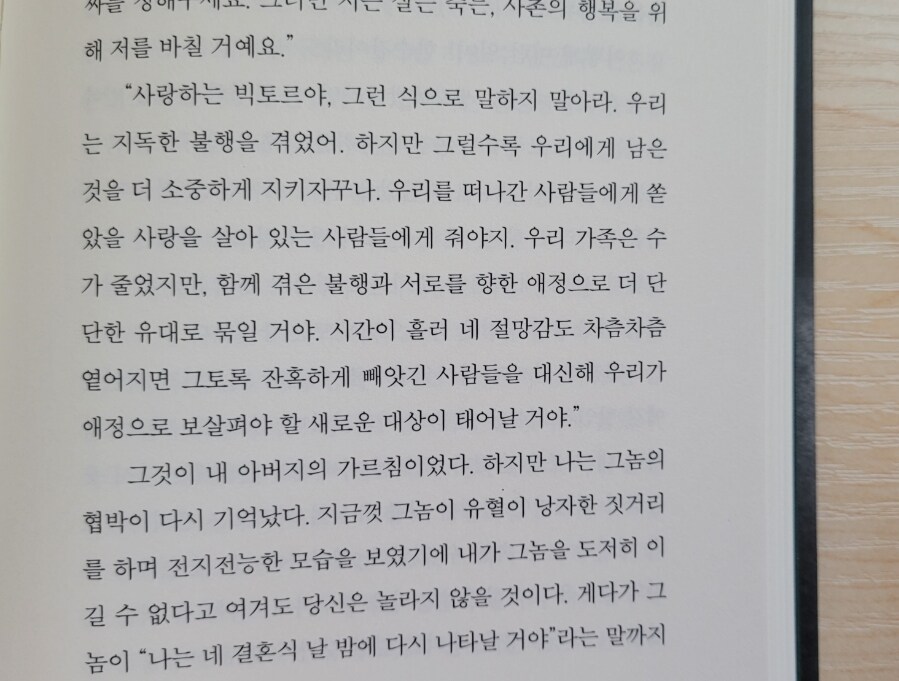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듬었다면 괴물의 탄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도망친 '부모'는 세상에 괴물을 풀어놨다.
사실.
모습만 괴물처럼 보였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그'는 혼자서 학습했다.
마치 인공지능처럼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흉내 내며 혼자서 인간으로서의 학습을 했던 괴물이라 불린 피조물.
그는 단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니.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만
사람들에겐 그럴 마음이 없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실험해놓고, 그 잘못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허무하게 사라졌는지 <프랑켄슈타인>은 잘 보여주고 있다.
"나를 위해 여자를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그 여자와 함께 내 존재에 꼭 필요한 공감을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공감할 수 있는 존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
인간 속에 섞이지 못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한 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프랑켄슈타인>에겐 자신의 피조물이 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자괴감만 가득했을 뿐.
생긴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나를 보고
소통할 수 없고, 공감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피조물의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외면했을 사람들이 보인다.
우리가 어느 틈에 그어 버린 어떤 선 긋기가 한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빅터부터 시작해서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을 보고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의 모습은 곧 우리 자신이니까..
더 웃기는 건
우리가 괴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던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자의 이름이었을 뿐 피조물에겐 이름조차 없었다...
<프랑켄슈타인> 원작을 읽는 건 처음이다.
아류작들과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봤지만 원작의 진실은 알지 못했다.
21세기에 읽는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일지도 모른다.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인간을 학습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되지만 인간의 두려움 앞에서 버림받아 천덕꾸러기가 된 인공지능이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인간처럼 살고 싶어서 갈구하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다.
200년 전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피조물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
100년 전 카렐 차페크는 '로봇'을 창조하면서 그로 인해 인간의 멸종을 얘기했다.
<프랑켄슈타인>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감정과 생각과 뻗어나간 연상작용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 같다.
빅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을 가르쳤다면?
빅터가 도망치지 않고 피조물을 보살폈다면?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 하나의 생명을 보살피는 건 태어남 이후의 돌봄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돌봄의 부재가 200년 전의 호러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담겨있다.
그저 괴물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프랑켄슈타인>의 진상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Damien Rice의 Elephant를 들으며 이름 없는 자가 내지르는 외로움의 절규를 듣는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