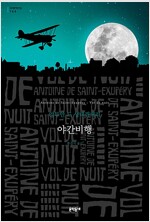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이상한 세계,
달빛을 받은 흰 구름들과 별들의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담임 선생님에 의해 불려나와
어린왕자의 줄거리를 신나게 구술하던
6학년 때의 학급친구가 생각난다.
어른이 되어, 어린왕자를 몇번 뒤적거려 보았지만,
그 친구가 느꼈던만큼의 감흥이랄게 없었다.
그 이후로
생텍쥐페리의 작품중 읽어낸 첫 작품인데,
간결하고 시적인 문장사이로
한 회의 야간비행을 떠나온 기분이다.
그리고 당연하고도 다행히도
불시착이나, 행방불명 될리도 없는
안전한 착륙.
비행조종사 파비앵이 있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영업부장인 리비에르나 다름없다.
리비에르에 대한 생텍쥐페리의 헌사처럼도 보이는 이 작품에서
이런 꼬투리는 잡고 싶다.
요즘같은 시대에 저런 중간관리자라니,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겠군.
‘리비에르의 행복 논리는 단순명료하다. ˝저들은 행복해. 내가 혹독하게 군 덕분에 저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된 거지.˝(작품해설 p.130)‘
워라밸 시대에 최악의 관리자 아닌가? ㅎㅎ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최근에 읽었던
제임스 설터의 ≪사냥꾼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두 작가 모두 조종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반영했고,
하늘에 대한 동경과 땅(집)에의 귀환이라는
파일럿만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냈다는 것.
어쨌든,
1944년 7월 31일 임무수행도중 자신의 비행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 작가, 생테쥐페리를 추모하며
야간비행의 마지막 장을 덮는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몰았던 록히드 P-38기가
2000년에야 마르세유 앞바다에서
잔해나마 발견되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