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 번째 문
폴 알테르 지음, 이상해 옮김 / 시공사 / 2009년 10월
평점 :

절판

추리 소설을 읽고 나서는 서평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항상 고민된다. 제대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을 하기에는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겠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니 많이 허전하고.. 아직 글 솜씨가 많은 부족한 나에게 있어 그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끄적여 본다 ㅡ.

『네 번째 문』은 ‘프랑스의 존 딕슨 카’라 불리는 「폴 알테르」의 1987년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장 우수한 추리소설에 주어진다는 ‘코냑 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 워낙 많은 상이 있고, 내가 모르는 상들도 세상에는 널려있으니까 ㅡ. (코냑 상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숙하다고 느껴지면서도 나름 검증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2003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에서 1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에서는 그 기대감도 달라질 것이다 ㅡ.
「폴 알테르」는 ‘밀실에서 벌어진 불가능 범죄’를 주로 다룬다고 한다. 『네 번째 문』에서도 역시 밀실에서 벌어진,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다룬다. 고전적인 추리 소설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밀실 살인에 귀신이 결합된, 그래서 더 불가능해 보이는 살인을 던져주고 풀어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고전적이라고 하면 살짝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네 번째 문』은 달랐다. 정통 추리소설을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늦출 수 없는 긴장감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ㅡ.
소설의 구성은 조금 독특하다. 액자식 구성인데.. 그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액자는 아니고.. 그렇다. 300페이지 가량 하는 책은 전체 5부로 나누어져 있다. 2부까지는 궁금함을 간직한 채-심지어 ‘저렇게 불가능한 상황들만 나열해놓고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도 했었다-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간다. 그러다가 3부 ‘막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3부에서 말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소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없었던지.. 어쩐지 그냥 막 이야기만 시켜나가더니.. 다시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들은 나름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간다 ㅡ. 물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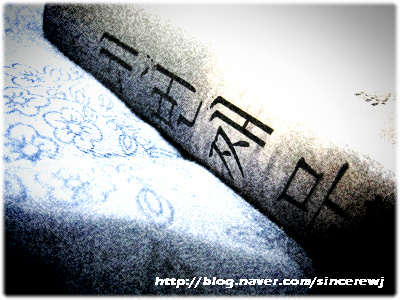
책을 다 읽고 돌아보니 정말 많은 흔적들이 보인다. 물론 난, 책을 읽는 동안에는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힘들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또 다른 이야기-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얼핏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너무 흔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나고 보면 그렇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이야기에 흠뻑 빠져 다른 생각을 못했기에-끝까지 책에서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많지 않은 분량이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결말이 그렇게 흔하게 생각되지도 식상해 보이지도 않았다. 오래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지금에 와서 만나도 그 재미는 여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ㅡ.
자,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사건들을 직접 풀어보는 재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혹시.. 직접 풀지 못해도,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맛볼 수 있으니 걱정은 마시고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