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오스터의 책
읽은 책 9권 / 기다리는 책 7권
 폴 오스터를 처음 읽은 건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11년 전이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책이었다. 단편 소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이 소설을 쓰기까지의 스토리, 영화 "스모크" 제작 과정, "블루 인 더 페이스"(스모크의 속편격이다) 비망록 등을 엮은 것이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진하게 다가온 아주 멋진 책이다.
폴 오스터를 처음 읽은 건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11년 전이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책이었다. 단편 소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이 소설을 쓰기까지의 스토리, 영화 "스모크" 제작 과정, "블루 인 더 페이스"(스모크의 속편격이다) 비망록 등을 엮은 것이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진하게 다가온 아주 멋진 책이다.

몇 년 후 "타자기를 치켜세움"이라는 책도 읽었다. 그림이 많은 책이었다. 이건 특별히 좋은 책도 아니었는데, 폴 오스터를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몇 년 후, 갑자기 폴 오스터를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고른 소설이 몇 권 있었는데, 읽다가 말았다. 도서관에서 빌린 거라 반납 시기가 다가왔고, 그냥 반납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빌리고, 또 다 못읽고 반납하고...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이 책이다.

"브루클린 풍자극". 이 소설은 은퇴한 전직보험회사 직원 네이선(50대 후반, 이혼남)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조용히 죽을 만한 장소’로 추천 받은 브루클린에서 뜰이 딸린 방 두 개짜리 저층 아파트를 세내고 ‘서글프고도 우스꽝스러운’ 삶을 조용하게 마감하고 싶었던 네이선 앞에 펼쳐지는 번잡한 상황과 사연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던 네이선은 해결해야 할 일들과 돌봐야 할 사람들로 분주해졌는데, 그건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된거라 할 수 있겠고,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한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구도 삶에 대해 ‘뻔한’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읽는 내내 지루한 줄 몰랐다. 그리고 드디어 폴 오스터 편식이 시작된다.

그 다음은 "신탁의 밤"이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마트료시카 같은 소설이다. 대실 해밋의 "몰타의 매"를 읽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안에 나오는 플릿크래프트 에피소드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어느날 우연히 공사장에서 튄 파편을 맞고나서 충격을 받은 후 일상을 버리고 새 삶을 찾아간 남자의 이야기인데, "신탁의 밤"에서의 주요 모티브가 이 에피소드다. 주인공 시드니 오언이 쓰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닉 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플릿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선다. "달과 6펜스"의 스트릭랜드처럼.

지금까지 읽은 폴 오스터 중 딱 두 권을 꼽으라면 "달의 궁전"이 그 안에 속한다. 스스로의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간 세 남자의 이야기. 흥미롭고, 환상적이다.
"누구든 자기가 속수무책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끼면 고함을 지르고 싶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가슴에 응어리가 지면 그것을 몰아내지 않고는,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숨에 숨이 막힐 것이고, 대기 그 자체가 그를 질식시킬 것이다." ("달의 궁전"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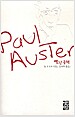 그 다음은 쌍둥이같은 책 두 권이다. "왜 쓰는가"와 "빨간 공책"이다. 우선 표지 디자인이 똑같다. 두께가 비슷하고,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짧은 글의 모음이라는 것도 같다. "빨간 공책"쪽이 조금 더 재밌다.
그 다음은 쌍둥이같은 책 두 권이다. "왜 쓰는가"와 "빨간 공책"이다. 우선 표지 디자인이 똑같다. 두께가 비슷하고,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짧은 글의 모음이라는 것도 같다. "빨간 공책"쪽이 조금 더 재밌다.
우연과 인연에 관한 짧은 에세이, 폴 오스터가 왜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아주 뜬금없고 우연한 계기다) 등이 있다. 두 권 모두 품절상태이고 다시 출간될 것 같지도 않아 중고서점을 뒤졌다. 운 좋게 지방서점에서 새 책을 갖고 있었고 (하나는 새 책, 하나는 거의 새 책), 싼 가격에 샀다.

"우연의 음악"은 뜻밖의 유산 상속으로 20만 달러 가까이의 엄청난 돈을 갖게 된 남자의 이야기다. 20만 달러... 2억 남짓 되는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큰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아닐 수도 있다. 소방수 나쉬에겐 큰 돈이었다. 3만 달러가 넘는 빚을 한 번에 갚고, 차를 사고,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휴가를 내서 2주간 자동차로 서브를 여행하고, 딸을 위해 신탁 자금으로 얼만간의 돈을 맡긴 후 그에게 6만 달러가 남았다.
그 이후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일 년을 여행하다가 도박의 명수 포시라는 젊은이를 만나 남은 돈을 올인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독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나라면 안그랬을텐데...

"보이지 않는"은 가장 최근에 나온 폴 오스터의 책이다. 역시 재미있다. 대학생인 애덤 워커는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프랑스인 커플을 만난다. 프랑스 남자는 애덤에게 돈을 줄테니 잡지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하고, 애덤은 잡지 창간을 준비하게 된다. 그 와중에 우연치 않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애덤은 잡지 창간이고 뭐고 다 접고, 남자와 결별한다.
이후 40년의 세월이 흐른다. 애덤은 늙고 병들어 언제 죽게 될지 몰라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다. 대학시절의 이야기인 '봄', 누나와의 근친을 다룬 '여름'(상상인지 실제인지 모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가을' 이야기가 이어진다.
1, 2, 3인칭으로의 시점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의 전개, 우연의 연속,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국과 68세대 프랑스 젊은이들의 등장, 루돌프라는 악마적 인물,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거움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소설이다.
아직 읽지 않은 것들

사실 폴 오스터의 최고 인기작은 "뉴욕 3부작"이다. 이걸 읽어야 폴 오스터를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사 놓은 건 오래 전인데 아직 못 읽고 있다. 조만간 읽어야겠다.

"폴 오스터의 뉴욕 통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 역시 품절이다. 검색해보니 이 책은 "굶기의 예술"이라는 책의 개정판이다. 나중에 나온 책의 제목이 훨씬 감각적이지 않은가.
소설이 아니라서 좀 덜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또 이런 책들도 있다. "고독의 발명" 빼고는 모두 장편소설이다. "거대한 괴물"은 "리바이어던"의 개정판이다. "공중곡예사"도 "뉴욕 3부작"과 마찬가지로 폴 오스터의 대표작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계속 써낼 수 있는걸까?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설가다. 대부분 열린책들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다. 대부분이 하드 커버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소장 가치는 분명히 있다.
굳이 고르자면, "브루클린 풍자극"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폴 오스터를 여러 권 읽은 후 이 책을 으뜸으로 꼽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 개인적 취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