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 파는 가게 있나요? - 어디를 가야 엄마를 살 수 있나요?
이영란 지음, 김장원 그림 / 시선 / 2014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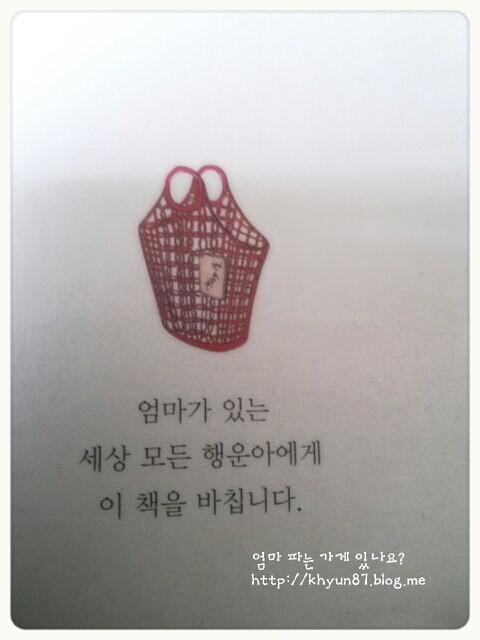
나이를 먹어도 엄마가 안 계시다는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맙니다.
겨우 "엄마"란 단어에 불과할 뿐인데 말입니다.
사춘기 시절엔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짜증을 낼 때도 많이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믿어?'
라는 생각에 야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자는 엄마가 되어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4형제를 거뜬히 키우셨던 엄마를 생각하면 겨우 남매만 키우면서 허덕이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번갈아가며 아픈 바람에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누가 애 둘 낳는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거야."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나는 네 명을 키우면서도 그리 안 힘들었는데 도대체 넌 왜 그러냐?"
하시곤 했지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형제들 또한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곤 했는데
말입니다.
전 딸이 7살때 쓰러져 병원에 8개월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이야기네요.
주변 사람들은 늘 제게 그러곤 했지요.
"네가 안 죽고 살았으니 망정이지, 네가 그 때 죽었더라면 너희 애들은 어떻게 살았겠냐? 엄마 없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우리 딸은 제가 쓰러진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절 처음 보더니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군요.
아들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퇴원 후 그 때 일을 물어봤더니 "아빠가 엄마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이상한 아줌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오잖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엄마 얼굴도 아니었어. 오빠가 울길래 왜 우는지 몰라서 그냥 쳐다봤지."
칠순이 넘은 엄마를 바라보는 나와 내 딸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 많이 다릅니다.
나이를 먹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그저 엄마가 안 계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마음이 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딸은 어려서 그랬던 걸까요?
지금도 옛날 일들을 물어보면 별 거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고모에게 가끔씩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던데, 만약 그 때 내가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딸은 저의 존재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구요.
작가가 여섯 살 때 갑자기 엄마가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한참 후에 여윈 몸으로 집으로 돌아
오십니다. 어른들은 걱정하셨지만 작가는 엄마의 시장 바구니를 들고 언젠가는 엄마가 꼭 돌아 오실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등에 업혔던 네 살 때의 기억만을 남긴 채 엄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살, 열 일곱 살, 스물 일곱, 서른 일곱, 그리고 마흔 일곱, 작가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살가운 딸,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라고 당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책이었지만 읽으면서 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내 딸이 생각이 나서 펑펑 울면서 읽은
책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