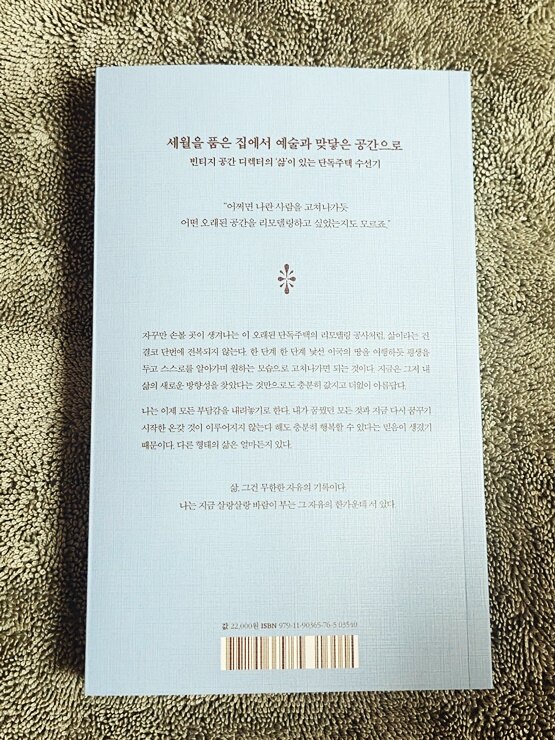-

-
오래된 집의 탐미
김서윤 지음 / 책과이음 / 2025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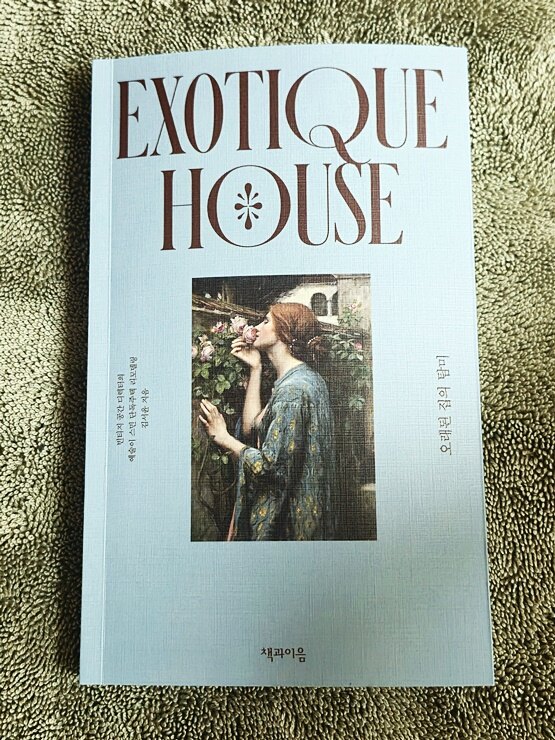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내가 편안히 살 ‘집’에 대한 생각들은 다양하지만 한 뜻이 아닐까 싶다.
내가 오래전부터 소망하는 ‘편안한 집’.
나는 ‘편안한 집’을 꿈꾼다.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흙과 나무와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잠드는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시골길을 가다가 눈이 가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이런 곳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미래의 ‘나의 편안한 집’을 그리곤 한다.
그래서였는지 『오래된 집의 탐미』를 기다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다.
흔히 집의 ‘리모델링’의 이야기라면 ‘헌 집’에서 ‘새집’이 되는 과정이 건축이나 자재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선입견을 나름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
『오래된 집의 탐미』의 리모델링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술 그 자체다.
프롤로그부터 3개의 PART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유명한 에세이나 소설보다도 더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이끌어준다.
철거에서부터 이러저러한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의 집’을 만들어가며 모든 것에 애정을 쏟고 있음이 오롯이 모두 느껴졌다.
벽이며 바닥이며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예술과 만난다는 것이 내게는 소위 ‘컬쳐쇼크’ 일정도로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과정을 겪은 이야기들이나, 예술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작가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나도 언젠가 ‘작품’으로 남겨질 나만의 ‘편안한 집’을 갖을 수 있겠지...라는 꿈도 다시 꾸게 된다.
P11 [프롤로그 중...]
‘집은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나 유행하는 인테리어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향으로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는 없는 걸까?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 대신 각자가 행복한대로 선택하고 남과 비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집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들은 도식적인 매너리즘에 갇혀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내 미래의 집을 되살려준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다.
P117
유난히 ‘집’이라는 공간에 집착하던 아이였다. 몽상하기를 좋아했던 나는 언제나 집을 만들며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다. 레고 블록으로도, 시골 할머니 대 뒷산 흙으로도, 잠들기 전 머릿속 상상에서도 줄기차게 미래의 집을 그렸다. 하지만 그 집들은 단순히 살고 싶은 물질적인 집이라기보다 부족한 현실을 벗어나 닿고 싶었던 미지의 유토피아에 가까웠다. 어려서부터 막연히 집의 외피에 쏠려 있는 허영이 아닌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집을 꿈꿨다.
P212
내겐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푸젤리의 작품처럼 무너지는 밤들이었다. 지붕 방수까지 마치고도 한동안 악몽은 계속됐다. 지난 시간의 피로와 불안했던 기억들이 잠든 나를 지배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다. 잠을 잔다는 행위는 어느덧 낮 동안 벌어진 일상의 연장이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집을 고치고 있었고 때로는 더 먼 과거로 날아가기도 했다. 나르시시스트와 재회하기도, 인연이 끝난 옛 우정과 함께 예전처럼 방랑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가끔은 팡팡이와 볕 좋은 가로수길을 산책했다. 그 꿈들은 과거 나를 행복하게 했던 보통의 날들, 오랜 세월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껏 가슴 한편에 상흔을 새겨놓은 날들의 이야기였다. 그 날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기라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그렇게 꿈으로나마 치유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