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기록 방랑자가 되어 버렸다. 노션도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귀찮아서 간편 독서앱으로 갈아타 버렸다. 그래도 쓰기 플랫폼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뭉그적대다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다. 태초부터 쓴 이곳에도 흔적을 남겨볼까. 2025년 상반기 무차별, 간략한, 임의의 기록. 기억 휘발 주의.




📖 트러스트
직전에 읽은 ⟨하우스메이드⟩에 '빌헬미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윌헬미나'가 등장한다. 그리고 문제의 '앤드루'도. 별것 아닌 우연인데 괜시리 ㅇ_ㅇ 이런 표정이 된다.
월가의 거물 앤드루 베벨과 그의 아내 밀드레드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화자의, 다른 시점에서 펼쳐진다. 빌드업을 차곡차곡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며 3부 자서전 대필작가의 시점으로 들어선 참이다. 이목을 사로잡는 대목에 이르러 요즘의 책 광고는 다 믿을 게 못 되지만, 2023년 화제작인 만큼 뒷심을 믿고 책장을 넘긴다.
믿음은 깨졌다. 예상 대로의 이야기에 맥이 빠진다. '2023년 올해의 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가 곡해한 걸까. 소설가-남편-대필작가-부인의 다중 시점에서 진실을 조정하는 것이 독자의 몫이라면 그 어떤 이야기도 진실이 아니면서 거짓도 아닌, 미스터리를 '재조정'하는 자유를 즐길 수도 있겠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어느 노랫말을 살짝 바꿔 말하고 싶다 —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고 싶겠냐.
냉철한 괴짜 천재 우즈키 레이치와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다키 렌지. 고교 2학년인 두 친구는 학교에 '연실 연구회'(일본은 동아리 활동이 정말 '활발'하군) 간판을 걸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비밀리에 사건을 의뢰받고 있다. 학원물 답게 두 고교생 탐정의 티키타카가 훈훈하지만 학원물 답지 않은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간다. 일상, 청춘, 본격, 사회파가 조금씩 섞여 이야미스가 된?
📖 스트로베리 나이트
살인마 정체에 관한 트릭이 한니발급이다. 게다가 범인에게 공감과 연민이라니. 사패 범죄자 잡는 사패 형사인가. 이 둘 만으로도 지치는데 가쓰마타 형사는 츤데레의 식상함을 아득히 넘어선다. 지금은 악바리 사패(?) 형사지만 과거 범죄 피해자이기도 한 레이코에게 상처에 소금 뿌리기, 성차별, 성희롱을 난사한다. 다크 히어로를 그리려는 것도 적당히 해야 매력이지. 아, 이쪽은 소패인가. 굿 캅 배드 캅의 변주, 사패 형사 vs 소패 형사? 정형화되지 않은 캐릭터가 넘쳐나는 건 개성인데 이건 너무 강하다. 레이코팀이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궁금하지만, 다음 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이유. 경찰이 뽑은 최고의 경찰소설이고 드라마도 엄청나게 히트했다는데 무엇이 경찰들의 마음을 산 걸까(드라마를 봐야 하나).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형사물이라는 데 별 반 개 더 주긴 한다.
다음 시리즈를 안 읽을 것처럼 썼는데 감상을 막 적던 시점이라... 이 토막글을 올리는 지금 감정이 많이 휘발되어서 2편 ⟨소울 케이지⟩를 펼친 참이다. 독서 기록을 확인하니 ⟨스트로베리⟩를 2월에 읽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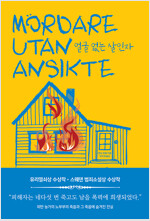

📖 얼굴 없는 살인자
얼굴이 없는 살인자를 쫓는 데도 정신없는데 온갖 대중문화의 향연에 어질어질.
"벽장에 뼈 몇 개쯤" 원문이 skeletons in the closet 같은데(아, 영어가 아니라 스웨던어겠구나) 심히 정직한 번역 아닌지
한때 동군연합을 이뤘고 이제는 다리로 연결되는 옆 나라 덴마크와 심심찮게 엮인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마침 읽은 ⟨늑대의 왕⟩ 배경이 스웨덴과 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 전쟁인데 지금의 노르딕 복지 국가 역시 피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공유할 수 없는 국민 정서가 존재한다는 게 새삼 와 닿는다.
# 비호감 형사들, 자유로운 개인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일본 경찰은 피해자에 감정이입이 지나치고 유럽 경찰은 한 인간으로서 '나'가 우선인 그야말로 마이웨이 성향이 짙다. 내 감상 기준이라 신빙성은 희박하지만.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강간+장기 적출이라는 끔찍한 범죄에서 살아남아 입원 치료 중인, 극도의 PTSD를 겪는 피해자에게 형사가 당시 상황을 묻는다. 단서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로봇처럼 무감하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협조하라는 명분이 당장 눈앞의 피해자의 고통에 절대적으로 앞서는가. 피해자의 과거가 사건의 단서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접근하든가, 피해자가 좀 안정이라도 되면 물어보든가. 냅다 피해자한테 사건 당시를 말해 보라,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라 닦달하는 건..... 이게 병실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 그렇다.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캐묻는다. 결국 패닉에 빠진 피해자는 병원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데 이 형사, 왜 그러냐며 '이유'를 말하면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한다. 아오.... 풋내기 열혈 형사도 아닌 무려 반장이 이러고 있다. 피해자는 끝내 자살하고 마는데. 어찌 됐든 피해자에게서 단서를 얻어낸 투철한 직업 정신의 투베손 반장. 아, 이쯤 되면 경찰도 형사도 AI가 하라고 해.........
그런데 투베손 반장님, 근신(을 빙자한 휴가) 중임에도 수사(무단이탈)하다 다친 파비안은 또 그렇게 걱정한다. 다쳤으니 쉬라고, 휴가를 즐기라고 한다..... 우리의 주인공 파비안 형사가 얼굴 없는 범인의 정체에 바짝 다가갔다잖아. 쉬긴 뭘 쉬어. 실은 파비안의 뻘짓을 투베손 반장이 더는 커버하기 힘들어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이유지만. 형사 역시 사람의 직업이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실수하고 헛발질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북유럽이어서 그런가, 경찰도 그 가족도 일단 마이웨이. 파비안은 수사에서 빠지라는 데도 어찌나 범인 찾기에 열중인지 아들 얼굴을 3일이나 못 봤는데 문자에 답이 오니 잘 있구먼, 이러고 있다........ 같은 집구석에 있으면서. 부인과 딸은 타지역으로 떠났고 파비안은 입원했던 터라 집에는 미성년자 아들 혼자 있었는데도 집에 와서 몇 날 며칠 아들 방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다. 사춘기 자녀 사생활 존중의 달인.
수사팀의 다양한 개성, 불안전한 인간 군상을 그리려는 작가의 의도는 십분 알겠다. 근데 답답해. 스웨덴팀 투베손 반장과 더불어 나를 안타깝게 하는 덴마크팀 두냐 형사. 어차피 때려 치는 거 생각만 하지 말고 꼴 보기 싫은 반장 놈한테 멱살잡이라도 할 것이지. 형사라는 직업관에 철저하고 능력도 있는데 "늙고 까다로운 개복치" 같은 인간인 나는 그 우직함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제일 속 터지는 건 역시 파비안이다. 끝까지 뻘짓만 한다(단순 무식한 표현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얼굴 없는 살인자⟩는 파비안 리스크 형사 시리즈의 첫 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두냐 형사의 서사가 더 강렬한데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파비안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고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되겠거니, 헤아려 본다. 두나 형사와 콤비가 될지도? (동군연합?)
# 약속된 헤비메탈의 땅
우체부도 마릴린 맨슨의 노래를 척 알아듣는 건 헤비메탈의 성지 북유럽, 스웨덴이기 때문인가. 인물들이 죄다 덕후인지 (록)음악 얘기가 텍스트마다 BGM처럼 들어 찼다. 영화 얘기도 툭하면 나온다. 찬호께이, 이사카 코타로가 그러하듯. 소설에 현실 취향이 양념처럼 반영되면 생동감이 깃든다. 그런데 자주 방대하게 나오니까 이 작가, 자신의 취향(덕후력)을 주체 못 하고 캐릭터와 상황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
# 스웨덴의 얼굴 없는 살인자들
재밌는 게 헨닝 망켈의 소설과 제목이 같다. 둘 다 ⟨얼굴 없는 살인자⟩고 둘 다 스웨덴 범죄소설이다. 스테판 안햄의 소설 원제는 얼굴 없는 '피해자'인데 번역하면서 살인자로 바뀌었다. 안햄은 "여러 편의 대본을 집필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인기 각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 스릴러의 거장 헤닝 만켈의 쿠르트 발란데르 형사 시리즈의 각색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러면 더더욱 두 책의 제목을 같은 이유가 궁금한걸.
종장마저 어째 고구마를 삼키는 기분이지만 꾸역꾸역 완독한 걸 보면 이력대로 필력이 없는 작가는 아닌가 보다. 다음 작 ⟨편지의 심판⟩에 쉬이 손이 안 가지만.
성반전 ⟨엘리멘트리⟩라고 하기엔 탐정의 활약이 전무하다. 고전 추리물을 현대로 옮겨 왔다는 데 활짝 열렸던 마음이 책장과 함께 닫혀버렸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율리아라는 인물이 흥미롭긴 한데 이후 시리즈에서 탐정의 역량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캐릭터 생명력의 관건이 될 듯. 읽다 보니 이성과 증거에 입각해 사건을 냉철하게 풀어가는 여자 탐정/형사가 간절해진다. 그런 캐릭터 누가 있었더라?
아, 하무라 아키라가 있었지. 이성의 날을 벼르는 인물은 아니지만 온몸으로 열일하는 하무라. 다음 시리즈 언제 나오나. 일흔일곱 살 탐정을 소망하는 만큼 그 활약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수사 로봇이라고 불평을 늘어놓더니만 또 인간적인 감정에 심취한 탐정을 못마땅해하는 줏대 없는 나. 인간적인 건 좋은데 역시 마이웨이 아닌지. 그러니까 양극단 말고 중간 지점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를 보고 싶은 건데 내가 까다롭게 구는 것에다 그만큼 읽은 작품이 없다는 얘기도 될 것 같다. 에놀라 홈즈도 안 읽었고, 미스 마플이나 제인 마블도 한 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없는 집⟩도 스웨덴 소설이다. 이럴 수가. 자유로운 개인 율리아. 수사야 어찌 되든 전남편을 쟁취해야만. 그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 부메랑에 부디 맞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