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의 독서, 이희인>
어떤 책은 제목만으로도 독자를 끌어당긴다. 이 책 <여행자의 독서>처럼 말이다.
이 책은 독서와 여행의 멋들어진 조합으로, 독자로 하여금 꿈을 그리게 한다. 나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읽었던 책을 떠올렸으면, 혹은 감동받은 책을 그리며 그곳을 여행했으면 하고 말이다.
이 책을 읽었을 당시 인상깊었던 문구는 린위탕이 <생활의 발견>에서 말한
"10년을 독서에 바치고, 10년을 여행에 바치고, 10년을 그 보존과 정리에 바친다" 와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 였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말하련다.
평생을 독서와 여행에 바치고, 평생을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후손에게 좋은 세상을 전해주
는데 바친다고.
그리고 <인도방랑>을 읽은 후, 독서와 여행이 완전한 동격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 삶은 어찌보면
여행이기에 머리로 떠나는 독서까지 겸비한다면 더할나위 없겠다는 생각...말이다.
저자가 각국에서 떠올린 책을 소개하자면, 러시아 <백야> <죄와 벌>, 네팔 히말라야 <인듀어런스>,
미얀마 <박사가 사랑한 수식>, 라오스 <월든>, 호주 <파이 이야기>, 모로코 <연금술사>, 요르단 외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연을 쫓는 아이> 등이다.
나만 눈치챘다. 위에 열거된 책들은 내가 읽었거나, 읽었을거라 추정되는 책임을.
저자의 여행 이야기 중 인상깊었던 것은 인도와 쿠바다.
인도는 사흘을 못 버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일 버티게 된다면 3년은 더 머물고 싶어
지는 곳이라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척 실감났고, 쿠바에 대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가봤으면서 오직 쿠바에 가보질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내 여행 편
력을 윗길로 쳐주는 친구가 있다. 쿠바를 못 가봤다면 진정한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그
의 해괴한 편견 내지는 선입견이다. 그 친구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여행담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쿠바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 쿠바의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
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레게 하는 것일까? 혁명가 체 게바라의 삶과 전설? 쿠바에 머물며 작품을
썼던 헤밍웨이와 그 작품 <노인과 바다>? 세계 정상급 수준의 야구라든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쿠바 재즈? 혹은 살사 댄스와 라틴 댄스? 사실 이 나라의 매력과 낭만을 표현하는 단어
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쿠바는 북한 등 몇몇 나라와 함께 외견상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듯 보인다. 반
제국주의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가 생존해 반세기 가깝게 쿠바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독재 국가와 달리 완강한 폐쇄성이나 폭력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인상은 드물다. 이웃 나라
미국의 집요한 봉쇄와 압력에도 굳건히 맞서고 있다는 인상이다. 세계 각지에 의료지원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고, 소련 붕괴로 식량 지원이 끊기면서 자구책으로
택한 이 나라의 유기농업은 지구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에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
지원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이 나라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개성을 지닌 나라다."
쿠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나라다. 쿠바와 관련된 책이라도 읽어봐야겠다.
쿠바...외에 옆구리에 책을 끼고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떠올려본다. '애독자의 여행'이라고 할까?
그 동안 읽었던 책을 훑어보니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다.
먼저 피렌체 두오모 광장에서 <냉정과 열정사이>의 아오이를 느끼고 싶다. 아오이 마음으로 떠
올릴 수 있는 추억이 있다면 더 좋을테고...
아오이를 가득 느끼고 난 후 이탈리아의 음식문화를 즐기리라.
고대 로마의 미식가는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와 상류에서 잡은 물고기를 맛으로 구별할 줄 아는
완벽한 수준의 민감한 재능이 있었고, 나뭇가지 위에서 조는 자고새 다리의 특별한 맛까지 안다
하니, 그 재능의 현현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배가 채워지면 볼로냐에 가서 8,000 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
그 다음 가고 싶은 나라는 첼리스트 카잘스의 조국, 카탈루냐다. 일찍이 중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지배자)과 동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합치면 당신보다 위대합니다' 라는
헌법을 만든 나라, 11세기 때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애기 위한 의회를 소집한 높은 수준의 문명을
느껴보고 싶다.
독일에서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이미륵을 만나고 싶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체 게바라
라 불리는 토마 상카라의 정신을 만나고 싶다.
<행복의 지도>에서 반한 아이슬란드는 어떤가. 죽음의 가능성을 포함하면서도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 유대감이 있는 나라, 정말 멋지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는 땅, 터키에서 <생사불명 야사르>의 기상천외함은 또 어떤가.
빼놓을 수 없는 나라는 그리스, 인도, 영국이다.
두 말하면 잔소리인 그리스는 <기호와 공식이 없는 수학카페> 덕에 더 가고 싶어졌고, 읽은 책이
쌓이면서 느끼게 되는 불교정신의 발현지 인도에서는, 붓다의 보리수 아래만이라도 서 보고 싶다.
러셀과 다윈이 태어난 영국도 가 보고 싶고.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 <파이 이야기>의 저자 얀 마텔이다.
만나서 무엇을 물어볼까?
'이제 곧 당신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TV에서나 볼 법한 지리
멸렬한 질문을 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 다음 가기가 염려되는 곳, 일본이 있다. (두어차례 관광은 다녀왔지만)
일본은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에서 서경식 선생이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옅어지는 나라라
말하고 있어서이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 열렬하다든지,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폼 잡는다 든
지 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몇 십 년이나 계속되고 있고,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저하고 몸을 움츠려야 하는 분위기라 하니, 가기가 두려운 곳이다.
쓰고 보니 생각보다 많다.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 <채링크로스 84번지>의 뉴욕, <연애소설 읽
는 노인>의 칠레, <잠수복과 나비>의 프랑스도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국내도 많지 않은가. <토지>의 경남 평사리, 하다못해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의 서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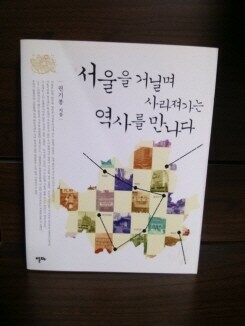
읽은 날 2010. 11. 10 by 책과의 일상
http://blog.naver.com/cji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