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음, 정영목 옮김 / 지호 / 2002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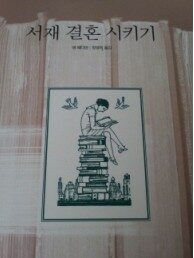
<서재 결혼시키기, 앤 페디먼>
내가 아는 한 페디먼 가족만큼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 없다.
저자소개 중 일부를 보면,
"책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저자 역시 책 속에 파묻혀 자랐다.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의 편집자로 평생을 일해온 아버지와 기자인 어머니는 여러 권의 책을 펴냈고, 산악 안내인이자 자연사 교사인 오빠 역시 엄청난 독서광이다. 아버지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도 틀린 곳을 찾아 교정을 본다. 이렇게 독서에 일가견이 있는 가족들 틈에서 자라서인지 그녀의 남편 역시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녀의 남편인 조지 하우콜트는 시인으로, 그의 책에 대한 열정 역시 결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네들 독서의 순수한 이유는 오직 '책이 좋아서' 이다. 목적, 목표같은 거창한 혹은 소소한 이유, 없다. 그냥 책이 좋댄다.
그녀의 책사랑을 보자.
"친구의 친구가 몇 달 동안 실내 장식업자한테 집을 빌려 주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책이 색깔과 크기를 기준으로 재정리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 직후 실내 장식업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 때 식탁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고가 인과응보라고 입을 모았다."
시인과 결혼한 그녀가 둘의 서재를 합치면서, (책에 대한 각자의 방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에)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한다.
"나는 밀리지 않고 몰아부쳤다.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풍>보다 먼저 썼다는 것은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바래.'
조지는 나와 결혼해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 때만은 달랐다고 한다."
이 책 <서재 결혼시키기>를 읽을 당시, 재미있게 읽었는데 요즘도 새록새록 생각난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 가 매일 와닿기 때문이다.
"나는 알렉산더 린디의 <표절과 독창성>에서 도벽이라는 단어와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그가 나의 발상을 훔쳤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는 내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그 책을 썼다."
그녀의 친절한 주석을 통해 좀 더 음미해 보자면,
"전도서 1: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음을 참조하라. 장드 라 브뤼에르, <특징들>(1688):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 이미 다 한 이야기다." 라 브뤼에르는 아마 이 구절을 로버트 버턴의 <우울증의 해부>(1621)에서 훔쳐왔을 것이다. "이미 누군가 한 이야기말고는 아무 할 이야기가 없다." 버턴은 이 구절을 테렌티우스의 <환관>(기원전 161)에서 훔쳐왔을 것이다. "전에 누군가 한 이야기말고는 아무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네 구절을 비교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바틀릿 유명 인용구>의 주석에서 훔쳐왔다."
앤 페디먼은 표절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 어머니 글이 '존 허시 지음' 으로 책이 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허시는 죽었지만, 그녀 집안 사람들 특히 어머니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나는 '표절'에 관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로는 인용없이 그의 생각과 같다는 이유로 그냥 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글은 사막의 모래처럼 흩어지고 '수애'마냥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티끌 한점의 내 글이 '표절' 당한다면?
겉으로는 쿨한척 할 것이다. 그리고 앤 페디먼 어머니처럼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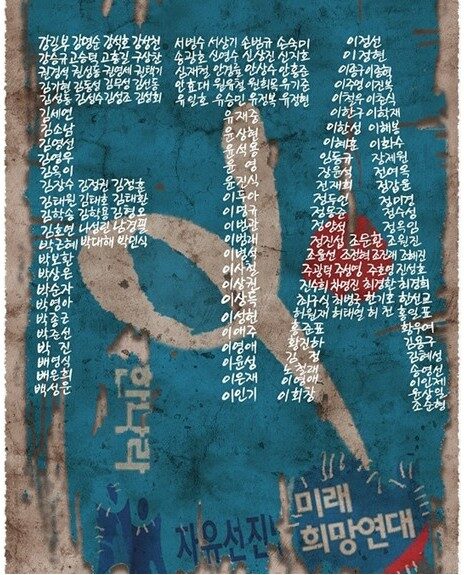
읽은 날 2011. 9. 29 by 책과의 일상
http://blog.naver.com/cji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