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라져 가는 남태평양의 보물섬 - 오세아니아 편 ㅣ 세계 속 지리 쏙
강로사 지음, 토리 그림 / 하루놀 / 2018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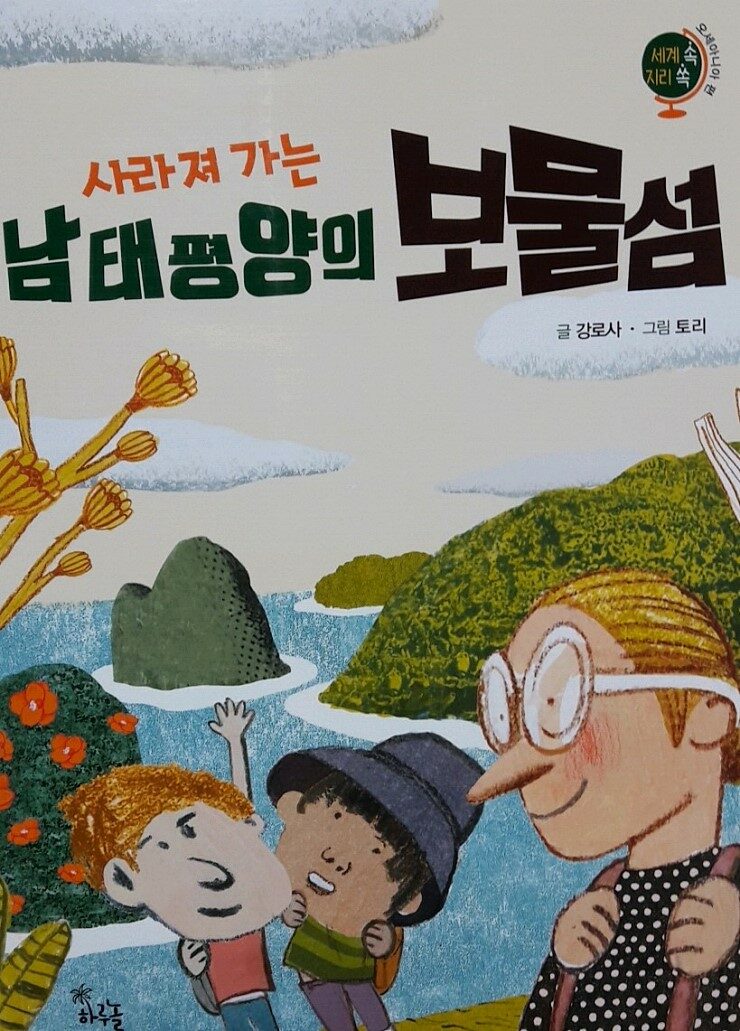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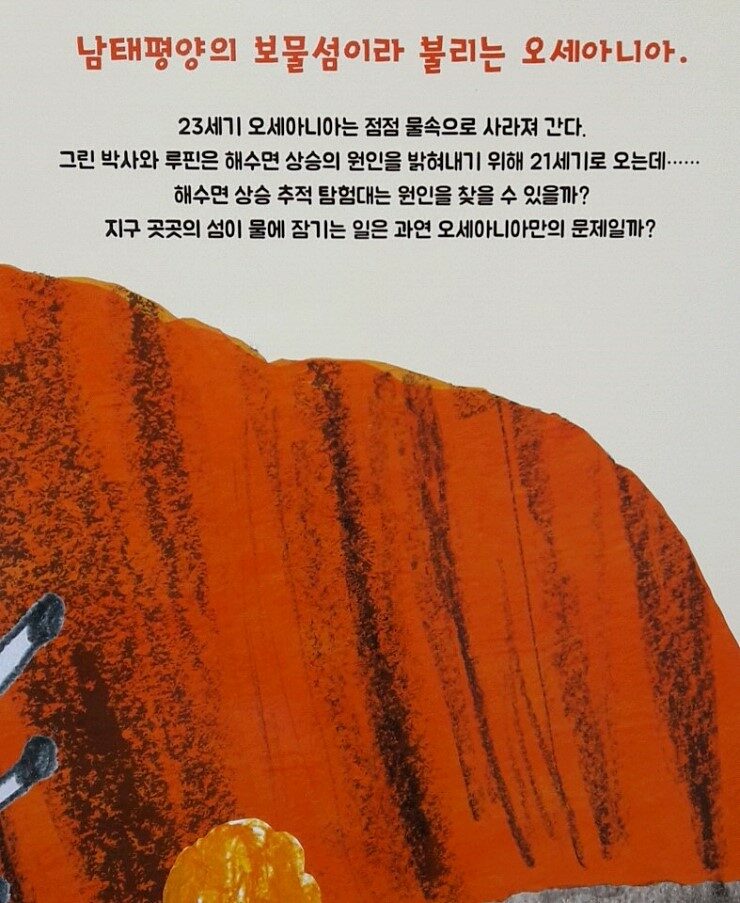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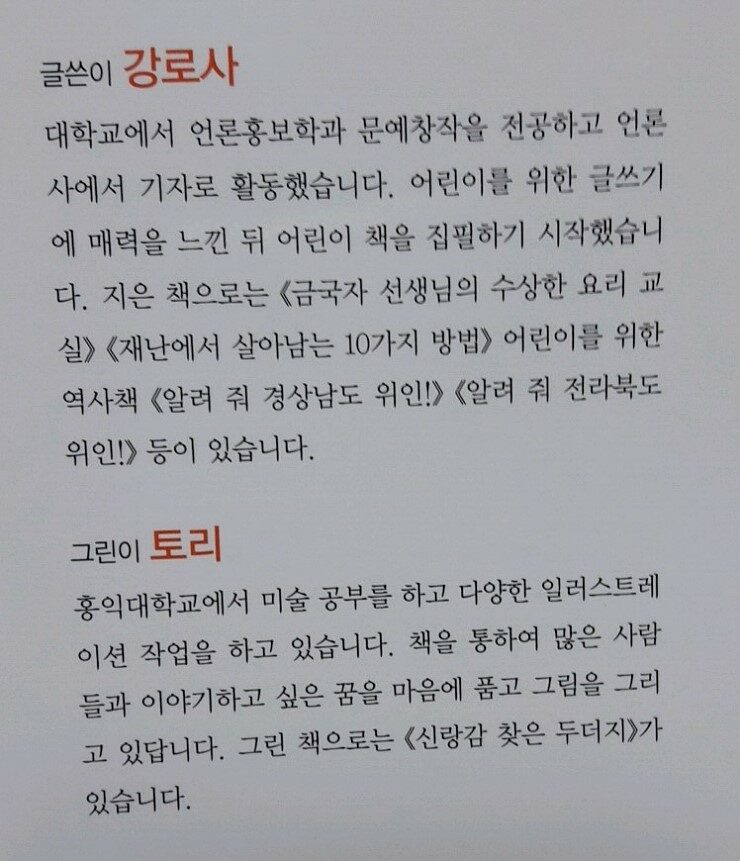
<세계 속 지리 쏙> 시리즈
오세아니아 편
이 책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오세아니아의 현재와 역사를 이야기 한다. 지구 온난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점차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이 빈번해지고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로 인해 다시금 자연 보호와 개발 이라는 주제가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 박사와 그녀의 조카 루핀은 23세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가이드로 한국인 승호를 발탁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루핀은 21세기의 오세아니아 지역의 기후, 환경, 경치 등에 감탄을 연발하고 어찌 200년 후에 잠기게 되고 더러운 물로 바뀌는지 의아해 한다. 책은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일단 오세아니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대표적인 나라 몇 군데를 보여준다.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일컫는 말로, 넓게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이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의 삼을 뜻한다. 오세아니아
중 오스트레일리아만 대륙이고, 대부분의 섬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겼거나 산호초가 쌓여 만들어졌다. 계절은 한국과 반대이다. 그러므로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Summer Christmas를 보낸다.
호주라고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2500만명 정도 살고 있고 오세아니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오랜 기간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 현재까지 영국 연방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의 동물들은 기후와 지형으로 인해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다. 호주는
한국보다 77배나 크기에 기후도 다양하다. 중앙 내륙에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해안가에 몰려 산다.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두 개의
큰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이 나라 역시 영국 연방에 속해 있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산다. 한국보다 약간 크지만 인구는 500만명 정도에 불과 하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가 유명하고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표 과일인 키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만 사는 새 키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국민을 지칭하는 말 키위가 있다. 뉴질랜드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계절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오세아니아에서 유명한 나라는 아마도 한국의 신혼 부부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인 피지의 정확한 명칭인 '피지 공화국'이다. 두
개의 큰 섬과 약 33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2050년 해수면이 30Cm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오세아니아 나라들의 존폐위기와 맞물려 있다. 투발루와 같은 산호섬들은 해발 고도가 낮은 편이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사막 투어를 하면서 생수통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 문화유산인 곳에
원주민이 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등반을 요구 하는 사람, 빙하가 녹고 있는 현실을 마치 관광 상품처럼
자랑하는 여행 블로거의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나 하나 쯤이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장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름 휴가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계곡으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난 여행길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 행위일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몰래 버린 쓰레기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은 점차 파괴가 되어 가고 있다. 여름에
너무 세게 튼 에어컨으로 냉방병에 걸리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태평양에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수심 몇 천 미터 아래에도 쓰레기가 존재하고 바다 거북이가 비닐을 삼켜
죽어가는 모습은 그저 안타깝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은 다시금 자연 보호와 지구 온난화로
어떻게 지구가 바뀌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책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