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느 영국인 아편쟁이의 고백 ㅣ 세계문학의 숲 3
토머스 드 퀸시 지음, 김석희 옮김 / 시공사 / 2010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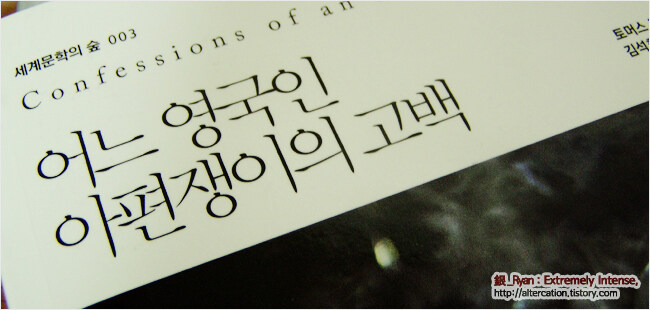
역시 시공사 '세계 문학의 숲' 초반 라인업은 지극히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글들인 것 같다. 전 권인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은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좀처럼 따라잡기 힘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진 글이어서 읽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번의 '어느 영국인 아편쟁이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짧은 글ㅡ해설을 제외하고 185쪽 가량ㅡ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를 관통하여, '17년 동안이나 아편을 복용하고 8년 동안이나 아편의 힘을 남용한' 저자, 토마스 드 퀸시의 적나라한 치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 드는 바람에 꽤나 고생하며 읽어야 했다. (p. 166)
실제로 이 글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수기(手記)로서 쓰여져 '런던 매거진'에, 그것도 익명으로ㅡ하지만 아마도 쉽게 그 저자를 예측할 수 있을법한 내용으로 실렸던 글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글이 발표되었던 당시, 아편은 어린아이들도 평범하게 복용을 할 정도로 일상적인 약재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재'로서가 아니라 '쾌락'만을 위한 아편 복용은 백안시되었고, '아편'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논쟁도 꽤나 활발했었던 모양이다. 그렇기에 토마스 드 퀸시가 동 시대를 살아가던 실제 인물들의 실명이나 실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을만한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수기가 얼마만큼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지 쉽게 상상이 간다. 실제로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경우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니 말이다.

짤막한 감상을 언급하기 전에 나로선 드물게도 표지가 인상적이었기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얼핏 담배 연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저자인 토마스 드 퀸시가 주로 액체 상태인 아편을 복용했으리라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생소하지만 '사진'으로 구성된 이 표지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작자 자신의 체험담'을 담아낸 이 글의 특징을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표지 디자인 등을 통해 책의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 잘 어울리는 표지는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표지와 제목에서부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잡은 채로 책을 읽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꽤 괜찮은 경험인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하기도 버겁다. 그만큼 '이야기의 문장 효과까지도 망쳐버리는' 불필요한 내용이 그다지 없는, 그야말로 아편쟁이인 토마스 드 퀸시가 그대로 담긴 글이기 때문이다. (p. 164) 일 단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1부는 아편의 부작용을 겪기 전 어째서 아편을 복용하게끔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저자의 학생 시절, 굶주렸던 런던 생활 시절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2부는 매일 같이 아편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겪었던 환상, 고통, 아픔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이 있는데 이는 본래 3부작으로 이 수기를 계획했던 토마스 드 퀸시가 아편과의 마지막 싸움으로 인해 3부를 써내지 못한 일종의 '변명'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줄곧 앞서 언급했던 불편함을 느끼며 읽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토마스 드 퀸시가 이 글을 쓸 때 혹은 구술할 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한 독자들에게의 부탁이다.
선량한 독자여, 내가 자명한 사실로 제시하는 것을 나 자신의 공로로 삼게 해달라. 내가 당신의 인내와 내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사실로 입증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해달라.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세한 설명을 자제한 것 때문에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옹졸함은 보이지 말아달라. 아니, 내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믿어달라. 즉, 나는 더 이상 저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어달라. 즉,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어달라. 관대하고 자비롭게 믿어달라. 아니면 단순히 타산적으로 믿어달라.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고백>의 개정증보판에서 당신의 믿음을 얻고 당신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지루한 나머지', 내가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할까 두려워, 내가 자명한 사실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두 번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2부, p. 113)
이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차마 말할 수 없거나 말할 시간이 없는 것에 독자들은 공감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양의 형상과 신화적 고통으로 가득 찬 꿈이 나에게 심어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할 수 있다. (제2부, p. 155)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드 퀸시는 자신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달라', '공감해달라', '알아달라' 등의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을 그러한 부분들에서, 되려 드 퀸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의 공포가 생생하게 전해졌던 것은 어째서일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는 의미인지 글을 만들어낼 당시의 드 퀸시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 설명할 기력이 없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 2백여페이지 남짓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토마스 드 퀸시의 수기를 통해 나는 아편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안 듯한 느낌이 든다. 정말로 이 책의 주인공은 '아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