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죽음을 다시 쓴다
샘 파르니아 & 조쉬 영 지음, 박수철 옮김 / 페퍼민트(숨비소리) / 2013년 8월
평점 :

절판

삶과 죽음,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화두가 아닐까?
누구나 태어나서 반드시 겪게 되는 '죽음', 그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저자 '파르니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죽음에서 다시 소생시키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입신'을 경험하게되는 '임사체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파르니아는 죽음에 대해 심장박동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일어나는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세포들의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심장박동이 멈춘것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현대의학의 소생술로 다시금 삶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소생술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예들이 나와있다.
그러한 사건들을 파르니아의 경험담을 통하여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그와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과 그러한 충분한 장비들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겼다.
역시 파르니아는 그러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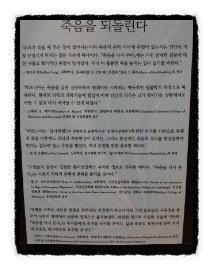
파르니아는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도 자신의 수술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실제 체험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사망의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그래서 죽음을 순간의 의미가 아닌 지속성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다.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죽음의 문턱에서 '파르니아'의 소생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니 어서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의학이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심정지를 되살린다 하더라도 이미 암과 같은 우리 내부에 진행되어버린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소생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저자가 밝히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뇌졸중이나 심장정지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생술로 살릴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책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이러한 책을 꼭 읽고 한 사람의 목숨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 책은 소생의학을 많이 연구하여 파르니아처럼 많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생명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