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숙한 길의 왼쪽 - 황선미 산문집
황선미 지음 / 창비 / 2019년 3월
평점 :



겨울이었다. TV에 황선미 작가가 나온다길래 방송을 챙겨봤다. 실망하면 어쩌나 생각했던 우려와 달리 TV엔 '작가로서의 소명 의식'이 투철한 멋진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엑시트> 등 그가 쓴 작품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바가 또렷하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려 고군분투하는데 자신의 재주(글, 작품)를 도구로 쓰는 사람을 나는 흠모한다. 상상력이 부족한 나로는 흠모하는 작가의 일상을 그려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텃밭을 가꾸고 교외에 2층 집에 살고 차를 즐겨 마시고 폭신한 니트를 즐겨 입을 것 같은 정도?(수준 참.. ㅎ) 풉. 세계를 누비며 존경받는 작가에게도 사소한 순간이 있을까?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순간도 글이 되면 특별해진다. 반대로 특별한 줄 알고 기록해뒀던 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게 아닌 게 될 때도 있다. 이 책은 이 둘의 중간 어디 즈음에 있다.
누군가에겐 그저 어느 유명한 작사의 일상을 담은 수많은 산문집 중 하나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작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처럼)?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황선미 산문집 《익숙한 길의 왼쪽》은 평범한 일상과 유명한 작가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적절히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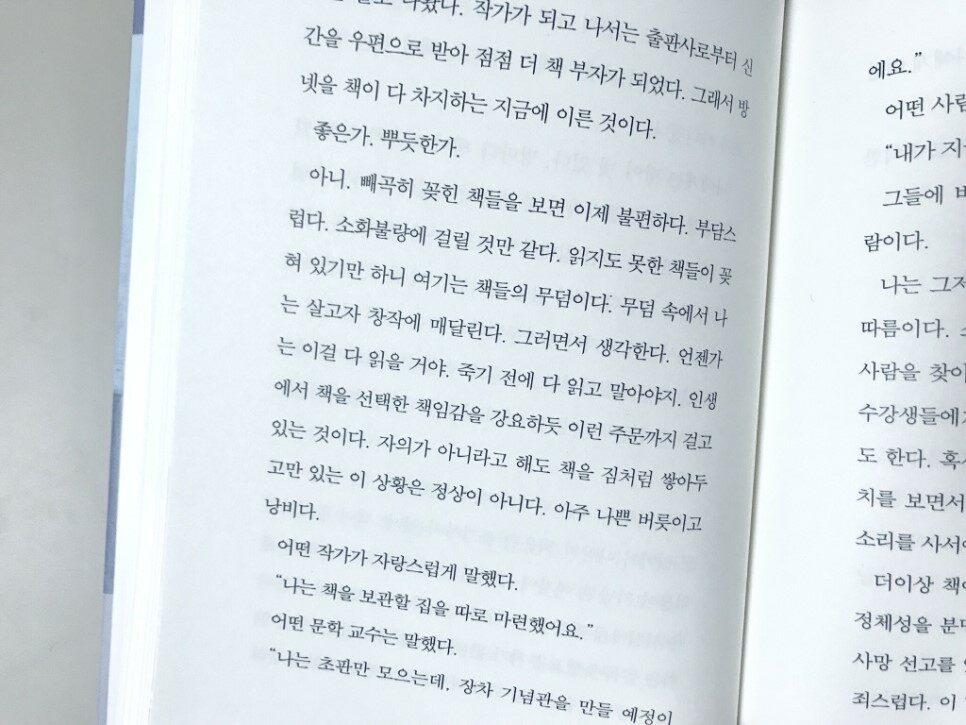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다. 작가라면 책을 특별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녀는 그렇지 않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은 산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을 하든, 일상이든 특별한 순간이든 그녀는 항상 차분했다.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 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처럼 느낄 수 있을까?

써 낸 작품만큼 앞으로 써야 할 글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어쩌면 그에겐 채찍질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처음 산문집이 나왔단 소식을 듣고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쉬어가는 걸까?'생각했다. 산문집을 보고 느낀 바, 그는 쉬는 중에도 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뱉어내지 않는다. 대중이 소화할 수 있는 당근으로 만들어 내는데 이 능력은 '비범함'보단 '의식' 속에 답이 있다. 재능과 노력으로만 가르기엔 실력도 능력도 모두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도 채찍질을 소화해내고 있을 그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