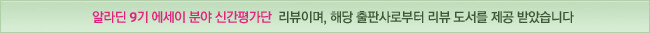[다방기행문]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다방기행문]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다방기행문 - 세상 끝에서 마주친 아주 사적인 기억들
유성용 지음 / 책읽는수요일 / 2011년 6월
평점 :

품절

'다방'이라는 곳은 이제 갓 서른이 된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어렸을 때 종종 보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점점 반짝반짝하는 서울거리에서 다방을 찾기는 쉽지 않고 카페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 다방을 발견한다 해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다. 선뜻 들어가기엔 어색함과 반겨주지 않을 손님이 될 것만 같은 무안함.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사실 적잖이 당황했다. 다방기행문이라니. 그것도 28개월이라는 요즘 세상에서 세계일주를 하고도 남을 긴 시간동안, 스쿠터에 배낭하나만 달랑 멘 다방으로의 무전여행은 정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다. 책을 한장 한장 읽으면서도 작가의 지극히 염세적인 시각, 자신의 과거에 대한(다방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특정한 행위, 특정한 생각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 다소 유쾌하지만은 않은 기억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깨진 믿음,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피상적인 만남.. 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읽으며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 여행이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고,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여행일지라도 여행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낯선 장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는 일이고,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행함(doing)'으로써 얻는 것이 많은 여행이야말로 가치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참 편협한 시각이지만) 그런데 도대체 이 다방기행문은 새로운 장소에서 보고 듣는 얻음도 없고 단편적인 생각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 다방에서 만난 김양, 박양과의 만남은 단순히 만남일 뿐, 비슷비슷한 다방에서의 여행일지는 다소 지루하고 긴 여행이었고 우울한 생각들은 결코 '여행에세이 독자'가 기분좋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글이 아니었던 거다.
책을 꼼꼼히 읽는 내 성격에 어긋나며 점차 대강대강 책장을 넘기며 결국 끝을 맺지 못하고.. 이 책을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소 긴 호흡으로, 심호흡을 하고 읽어야 하는 책.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가진 여행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책.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야 하지 않을까. 작가의 다음 글을 읽고 나면 이 책을 읽기가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다.
 |
|
|
| |
월화수목금 열심히 자본에 종사하고 주말에 가끔씩 모든 걸 훌훌 털고 여행한다는 것은 자유라는 낭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궁핍한 허영이다. 하지만 이 여행은 어쩌면 그만도 못한 일이었는지 모를 일.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면 나는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오래오래 달렸다. 그러면 바람의 속도를 못 이기고 눈물이 질질질 흘렀다. 지치면 다방에 들러 값싼 커피를 마셨고, 개념(?)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곳의 아가씨들에게 그 지역 이야기를 들었다. 그 친절한 아가씨들은 사표도 당일 아침에야 사장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휙 날린다.
한마디로 다방은 배울 게 별로 없는 곳이다. 물론 커피도 맛없고. 하지만 그곳은 어쩌면 사라져가는 것들과 버려진 것들의 풍경을 따라가는 이정표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
|
| |
|
 |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은 참 쉽게도 들었다. 여행을 통해 자아와 마주한다는 것이 그저 말 뿐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이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토록 낯설고 남같을 수가 없다.
살면서 느끼는 슬픔, 허망함, 좌절과 같은 감정까지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긴 여행. 보는 이는 읽는 내내 맘 편한 적이 한순간도 없지만 작가는 여행의 끝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이런 여행을 '이루어낸' 작가가 조금은 부러워진다.
 |
|
|
| |
아무래도 인간은 '나'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나' 아닌 다른 것이기를 꿈꾸지만 끝내 '나'로 죽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다. 물론 그 와중에 이따금씩 제 마음의 황량한 서부로 내몰려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을 망연히 바라보게 되는 때가 있다. 사는 일이 애초에 허망하고 쓸쓸하다지만, 슬픔과 허무는 이 세속을 벗어나 있는 어떤 정체불명의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는 욕망 실현의 장에서 쌓여온 상처쯤일 것이다.
나로 한 평생을 살다가 나를 두고 떠나는 풍경이 진안에 있다. 길을 제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그 길이 나의 것이 되지 않듯이 제아무리 전전긍긍 살아도 인생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사라질 때처럼 그저 사라질 날이 오거나 할 것이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 올해도 제멋대로 허무하지 말고, 모른 척 열심히 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아니게 될 때까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