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당한 거리의 죽음 -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2
기세호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12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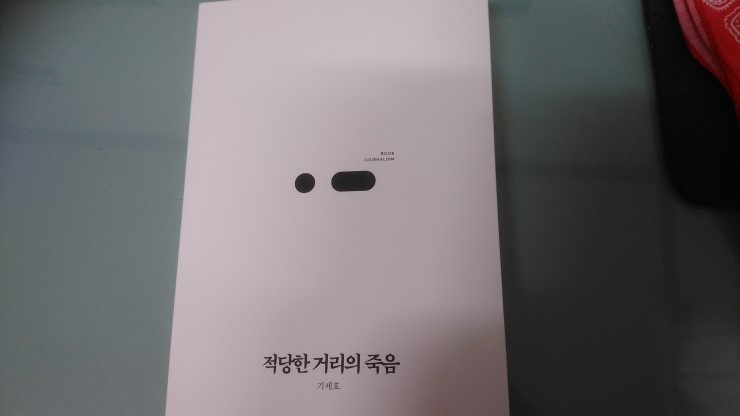
최근에 경영, 경제, 마케팅 분야의 책들만 읽다보니 인문학이 그립게 느껴져셔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보니 일상 생활에서 언급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관련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생명력을 가졌기에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살면서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일상 생활에서 꺼내기 힘든 주제를 다룬 이 책에 흥미가 생겼고 읽어보게 되었다.
사실 나도 이런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에 읽었던 남궁인 작가의 만약은 없다를 읽고 느낀바가 있었기에 거부감 없이 이 책을 고르게 된 것 같다.
이 책의 분량은 100페이지 가량으로 적은 편이고 책 자체의 크기도 보통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 사이즈에 비해 작아서(손바닥 크기정도) 처음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다.
(한편으로는 부담 없이 아무데서나 금방 읽을 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기도 한듯)
이 책의 저자는 죽음을 다루는 관점에서 파리, 뉴욕과 서울을 대조하고 있다.
가장 많은 파리 시민이 묻혀 있고, 파리시 안에 있는 묘지 중 면적이 제일 큰 페르 라셰즈는 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이다. 묘지는 주거, 상업 시설 주변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즉,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해 일상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묘지들이 대부분 도시 바깥으로 이전되었으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도 않다. 현존하는 시립 묘지는 모두 만장되어 이용이 불가능하고 도시 바깥으로 이전된 묘지들은 혐오 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혀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죽음과 묘지 문제를 더 이상 내팽개치지 말고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기에 작가의 문제 제기가 신선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것들이지만 대중적인 공감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죽음을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삶의 연장선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는 내용은 나도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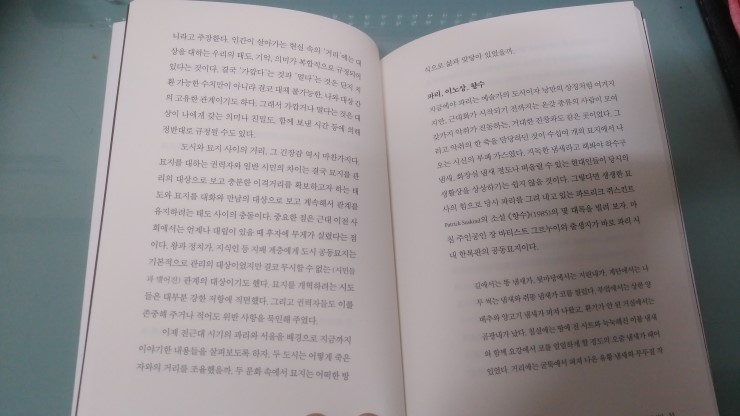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로 읽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