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틴 피스토리우스.메건 로이드 데이비스 지음, 이유진 옮김 / 푸른숲 / 2017년 3월
평점 :



마틴 피스토리우스,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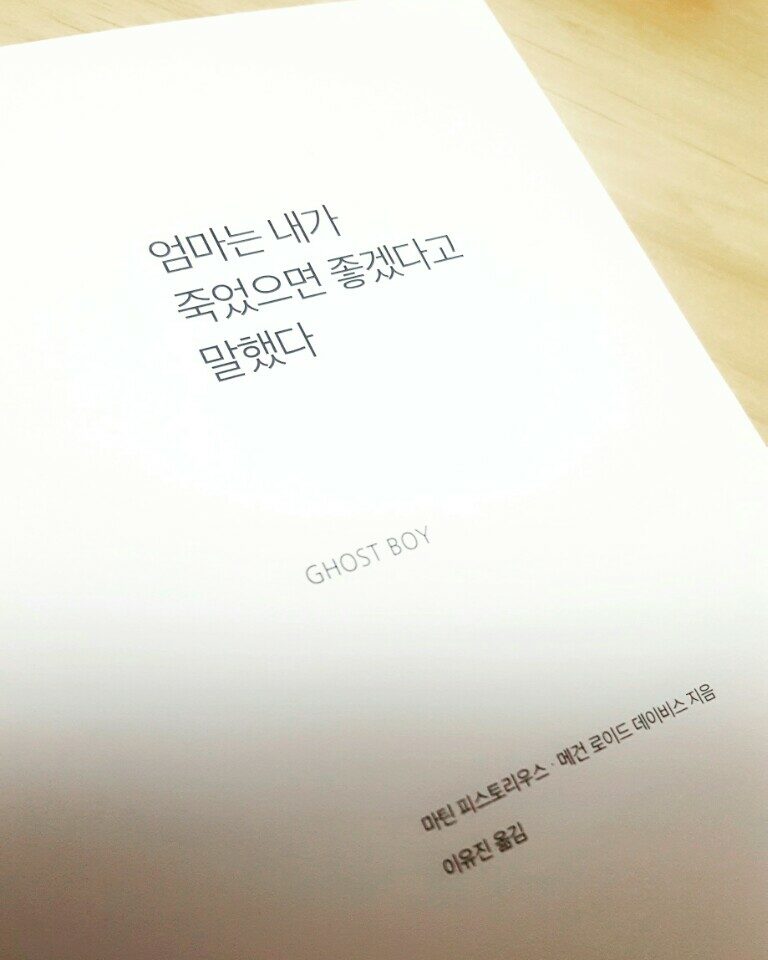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화분에 담긴 식물과 같았다.
물을 주어야 하며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나라는 존재에 모두들 익숙해진 탓에
내가 다시 실재했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 p. 30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소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이다. 처음에는 호러 소설이나 심리 스릴러 종류의 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지만, 물론 사실이 아니다. 원제는 <GHOST BOY>, '유령 소년'이다. 유령 소년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자,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인 마틴 피스토리우스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퇴행성 신경증을 앓게 된 열두 살 소년의 이야기
마틴 피스토리우스, 다시 말해 유령 소년은 열두 살 무렵까지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다. 총명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동시에, 컴퓨터에 재능을 보이는 여느 남자아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의사들도 그 원인을 밝힐 수 없이) '퇴행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을 선고받게 되며 이 이야기는 시작한다. 정신이 돌아온 후,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말을 좀처럼 듣지 않았고, 이 소년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공기 중을 떠도는 유령처럼 소외되어 배회하기 시작한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물건을 내 마음대로 집을 수도, 심지어는 미소를 마음껏 지어보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가 한창이던 아이는 유령 소년이 되어버렸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작가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다. 책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채,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전반부.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 기계음으로 대화를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후반부다. 마틴의 신체는 대부분 마비되어 있지만, 정신은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서 마틴은 곧바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주인공이 세상 밖으로 점차 발을 내딛는 과정을 후반부에서 비추고 있다.
돌봄시설에서 겪어야 했던 수난과 요양사들의 성폭력 가해까지
이 책이 놀라운 건, 마틴과 같이 신경질환으로 신체 대부분이 마비된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려진 책이 별로 없다는 씁쓸한 현실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등의 미화된 이야기는 많았지만, 책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작가 본인의 경험담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해내고 있다. 이를 테면, 비장애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듣지도 못할 거라 생각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이나 돌봄시설에서 겪어야만 했던 수난. 그리고 요양사들의 성폭력 가해까지. 이 책은 단순히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성공하는 식의 미담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회의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무심코 읽다보면, 이 책이 과연 실화인지를 두고 머리를 갸웃거리게 되기도 한다. 소설이라고 믿고 싶은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기에.
어떤 때에는 내 몸에 다시 손을 대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기도 했고 연속해서 몇 번씩 나를 찾아오기도 했다.
다시 내게로 다가오는 그녀를 잠자코 지켜볼 때만큼 무력한 순간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언제 또 나타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늘 불안에 떨었다.
나의 일상에는 공포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
나는 그녀가 원할 때 사용하는 반응 없는 물체,
그녀의 어두운 욕구를 마음껏 칠할 수 있는 빈 캔버스나 다름없었다.
- p. 215
동시에, 이 책은 마틴 피스토리우스의 자서전이기도 하다. 돌봄시설에서 수년간 지냈던 그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며 독립해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픽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다소 무겁게 시작된 이 책의 서두와는 상반되게 결말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행복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책이 여느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꿈처럼 행복하고 평범하게 마무리되기까지 마틴이라는 유령 소년이 지나왔을 삶의 굴곡은 결코 책의 몇 글자만으로는 가늠해보기조차 힘들 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틴과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살아있음에도 유령 취급을 받으며, 혹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을 거라 '단정지음'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때로는 능력이 충만함에도 '그럴 수 없다'는 사회의 인식이 이들에게는 더 큰 장애가 된다는 걸, 책장을 넘기는 순간마다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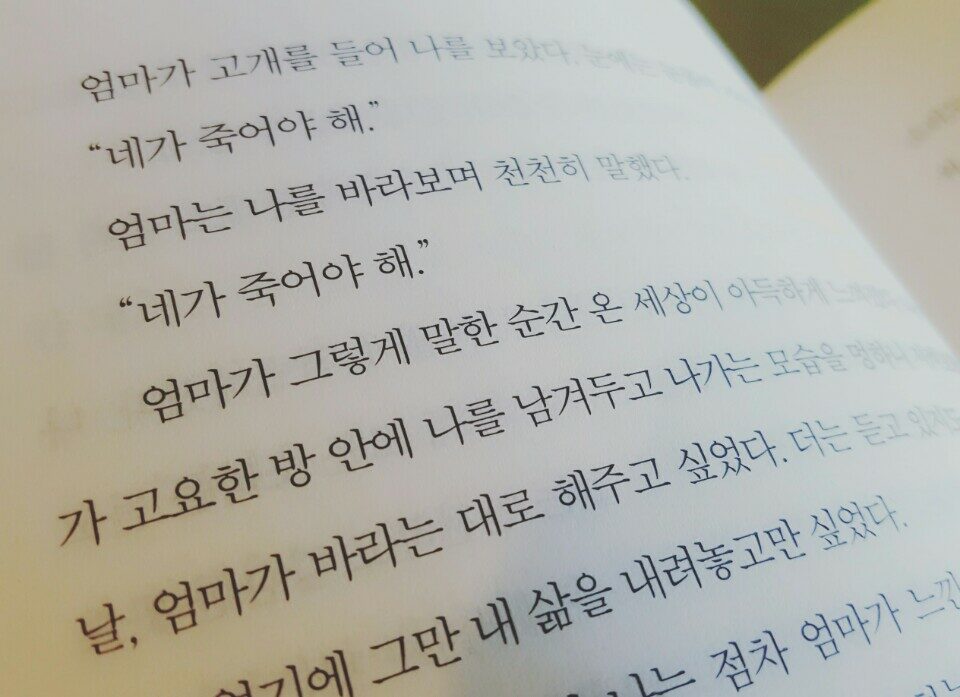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죽어야 해."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가 죽어야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한 순간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가 고요한 방 안에 나를 남겨두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날,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 p. 86
* 아쉬운점
제목이 왜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인지 의문이 든다. 많은 독자들이 이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단순히 비관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했던 말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가 되진 않는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네이밍이 아닌가 싶다. 물론 책의 내용 자체는 좋다.